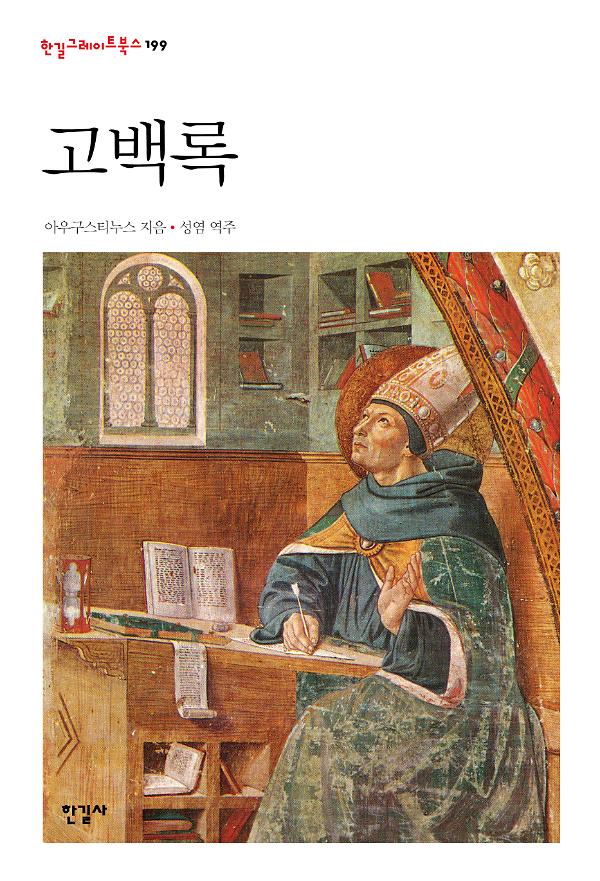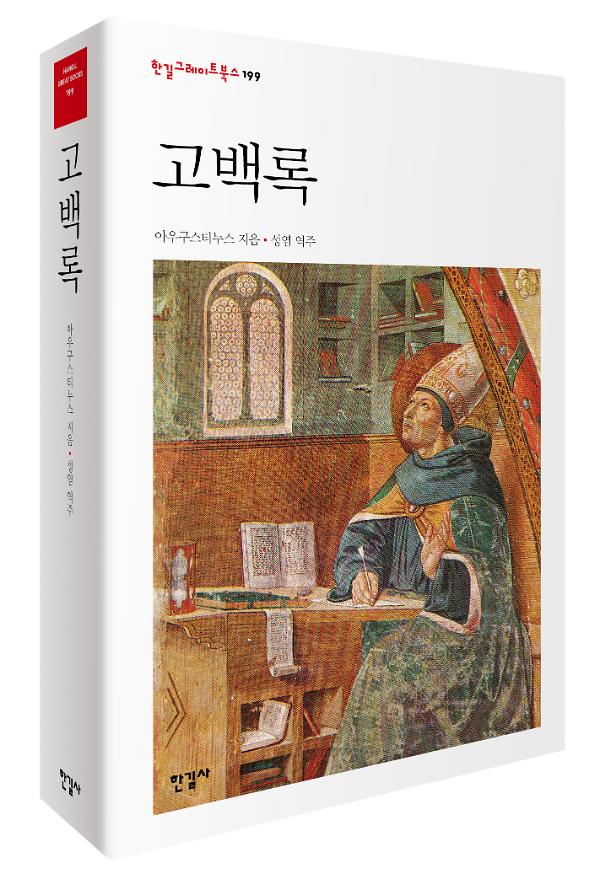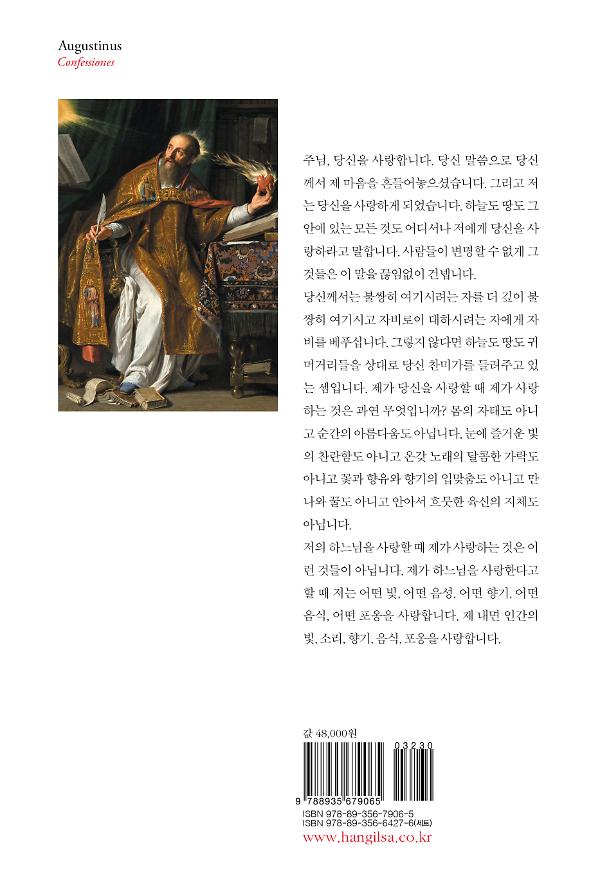방황에서 회심으로, 마침내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한 사람의 여정
아우구스티누스 개인의 삶은 그 자체로 『고백록』의 서사다. 젊은 시절 그는 진리와 행복을 찾아 각종 철학과 종교를 전전하며 방황했다. 육체적 쾌락과 야망, 학문과 명예를 좇았지만 그 무엇도 그의 해묵은 갈증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제 나이 열아홉 살부터 스물여덟 살까지 9년이라는 세월 동안 온갖 욕정에 호리고 홀리기도 하고 속고 속이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4.1.1)라고 회상할 만큼, 그는 수사학과 마니교, 신플라톤주의 등을 지나며 방황했다. 『고백록』 1-10권은 이 방황의 과정을 숨김없이 기록하면서, 신의 은총 안에서만 충족될 수 있는 인간 내면의 결핍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그 여정의 절정은 밀라노 정원에서의 회심 장면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집어라, 읽어라!”라는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를 음성을 듣고 성경을 펼쳤다.
“술상과 만취에도 말고, 잠자리와 음탕에도 말고, 다툼과 시비에도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시오. 그리고 욕망에 빠져 육신을 돌보지 마시오.”
로마서의 구절을 마주한 그는 신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체험을 넘어, 기독교 신앙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고백록』은 한 인간이 속세의 불안과 욕망 속에서 무너지고 일어서며, 마침내 은총의 부름에 응하는 영혼의 여정을 생생하게 전한다.
한 개인의 자서전을 넘어 그리스도교 신앙과 철학의 고전으로
『고백록』의 전반부 1-10권이 개인의 삶을 따라간다면, 후반부인 11-13권은 철학의 시선으로 우주와 창조, 시간의 신비를 파고든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태초에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의 내용을 붙들고, 창조와 존재, 시간과 영원이라는 주제를 철저하게 묵상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세계는 우연의 산물도, 필연적 유출도 아니다. 창조주의 자유로운 사랑에서 비롯된 피조물이다. 따라서 물질은 악하지 않고, “선한 창조주의 선한 피조물”이다. 물질은 악하지 않으며, 악은 단지 선의 결핍일 뿐이라는 그의 사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더 나아가 그는 시간 자체도 창조의 일부라고 보았다. “시간이란 무엇일까?”라는 근원적 질문 앞에, 그는 시간은 물체의 운동이 아니라 인간 의식의 확장(distentio animi)에 존재한다고 통찰했다. 독창적인 이 시간론은 현대 철학에서도 여전히 논의되는 주제다.
무엇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 후반부를 통해 신앙과 철학, 성서와 사색을 결합했다. 철학적 회의와 방황을 거쳐 신앙의 언어로 진리를 노래한 이 장들은, 단순한 자서전이 아니라 인류 철학사에 드문 “우주 찬가”라 불릴 만하다.
왜 지금, 다시 『고백록』인가
『고백록』은 서양 최초의 고백문학이자, 가장 독창적인 그리스도 문학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스스로 이 책을 “악행을 두고도 선행을 두고도 하느님이 의롭고 선하심을 찬미하는 책”이라고 정의했다. 이 책은 단지 약 1,600년 전 인물이 남긴 신앙 체험기에 그치지 않는다. 욕망과 불안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안달함’을 안고 사는 우리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기록이다. 그래서 『고백록』은 고대 신학 연구에 그치지 않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가장 보통의 인간이 위대한 성인이 되기까지, 그 내밀한 고백과 성찰이 담긴 『고백록』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
이번에 출간된 『고백록』은 수십 년간 축적한 성염 교수의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원전에 충실하게 번역되었다. 꼼꼼한 주석은 텍스트의 역사적·사상적·신학적 맥락을 밝혀 고전을 처음 접하는 독자는 물론 깊이 탐구하려는 독자 모두에게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