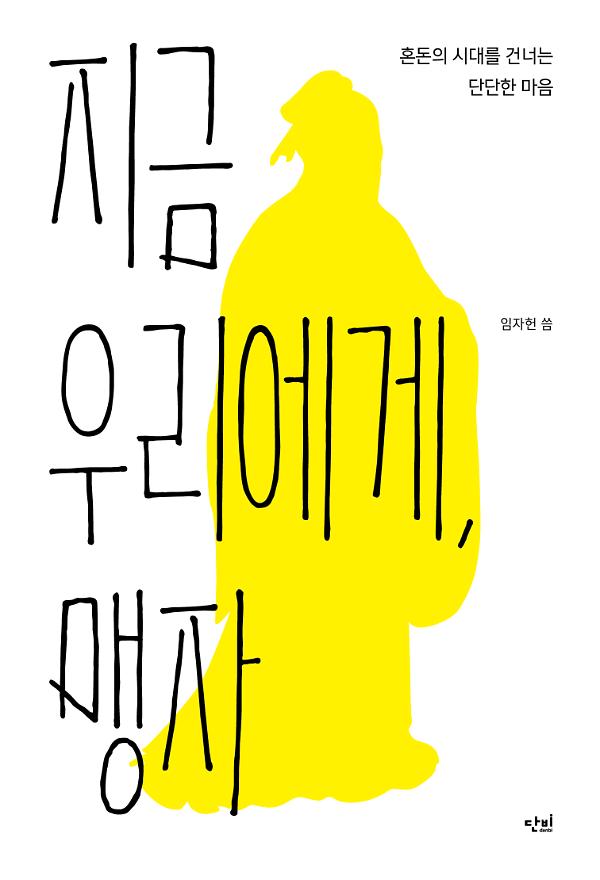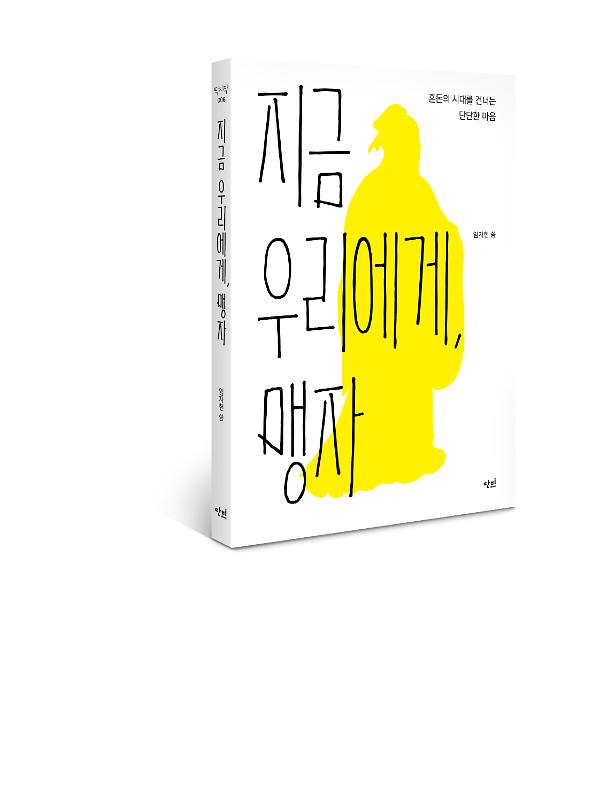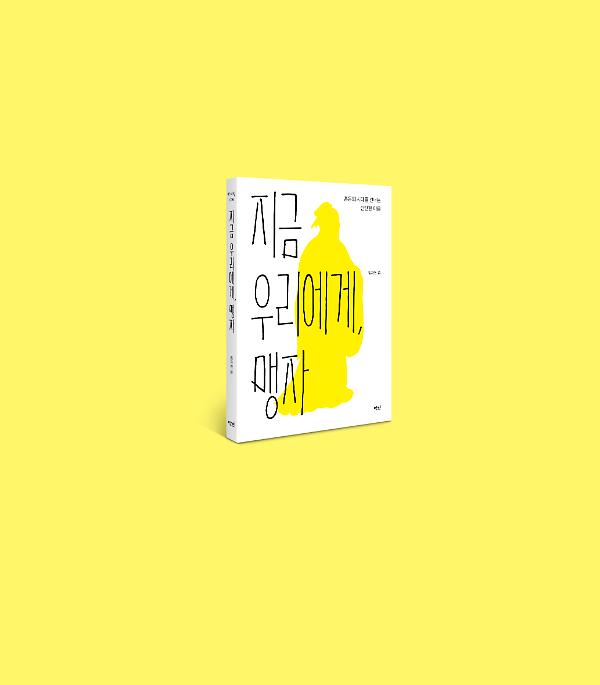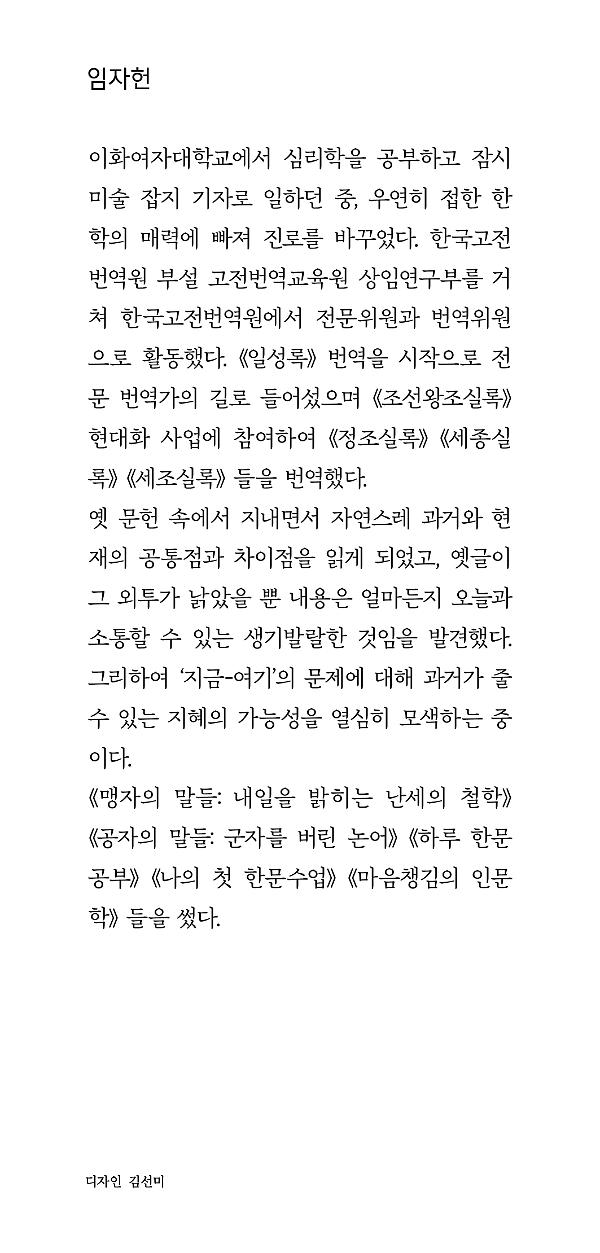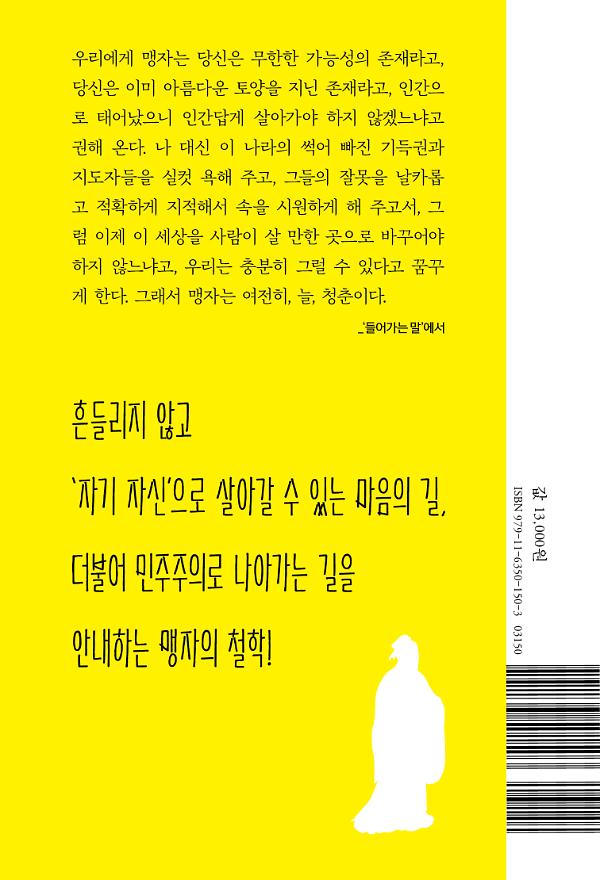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인’과 ‘의가 있을 뿐이다
누구나 한번쯤 ‘맹자’ 이름은 들어 봤을 수 있다. 하지만 맹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도대체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묻는다면 ‘글쎄요…’라고 고개를 갸웃할지도 모르겠다. 맹자는 기원전, 중국 전국시대 사람이다. 2,0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여전히 ‘지금 여기’로 소환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맹자를 사랑하는 저자를 따라 가볍게 발걸음을 떼 보자.
‘맹자 왈, 공자 왈’ 하면 꽤 고리타분한 옛 선비를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맹자 첫 장 양혜왕 상편을 펼치면 이게 실화인가, 싶다. 할 말은 한다는 MZ 세대 못지않다. 혼란의 전국시대, 궁지에 몰린 양나라 혜왕이 맹자를 보자 나라에 이익이 될 방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맹자는 “왕께서는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다만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한다. 이익을 묻는 왕에게 ‘인과 의’를 말하다니,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윗사람이 이익만 생각하면 아랫사람도 이익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하면 결국엔 이익을 좇는 아랫사람에게 군주가 시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세상을 떠도는 선비가 한 나라의 왕에게, 그것도 나이가 스무 살 정도 많은 왕에게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이뿐이 아니다. 추나라 목공은 싸움터에서 그가 아끼는 관리 서른세 명을 잃었다. 윗사람이 죽어 가는데도 도망친 백성을 어떻게 벌을 줄까 맹자에게 묻는다. 맹자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임금이 인(仁)한 정치를 하지 않았으니 백성이 그간 당한 것을 갚았을 뿐이니 원망하지 말라고 말한다. 인과 의를 지키지 않는 왕에게 백성이 어째서 인과 의를 지키겠냐는 말이다. 왕이 인과 의를 지키면 백성은 저절로 화합하여 이 난세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덧붙여 말한다. 높은 성벽과 군량이 아무리 많아도 백성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당장 눈앞의 이익과 승리만 원하는 왕들에게 맹자는 세상의 이치를, 근본을 일깨웠다.
맞는 말이다.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지금도 우리는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이익을 따지기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익을 따진다면 상대도 그렇지 않을까? 이익만 생각한다고 해서 정말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불신과 갈등이 빚어질 것이고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질지도 모른다.
백성과 함께하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정치철학
그럼 인과 의를 앞세우는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맹자는 바른 정치는 ‘항산(恒産)’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항산은 소득이 보장된 생업을 말한다. 농사짓는 때를 지켜 주어서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산이 중요한 이유는 생활이 안정돼야 인과 의를 지키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맹자는 정신만 강조한 것이 아니다.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 몸이라는 것을,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었다. 몸이, 삶이 안정되어야 바른 정신이 깃든다는 것을. 바른 정신이나 신념이 사라진 세상은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맹자가 깨달은 것이다.
맹자가 제나라 선왕을 만나 나눈 이야기를 보면 ‘인과 의’가 사람이 품는 보통의 마음임이 드러난다. 제선왕은 제물로 끌려가는 소를 측은하게 여겨 소를 풀어 주고 대신 양을 제사에 쓴 일이 있다. 이 일로 왕이 쩨쩨하다는 말을 듣고 있었는데, 이를 두고 맹자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을 보면 측은해하는 인간의 본성인 ‘측은지심’이라고 말한다. 이 측은지심이 인(仁)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며 제선왕은 충분히 천하를 품을 수 있는 군주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백성과 함께하는 ‘여민동락’의 길을 가라고 말한다. “내가 하고 싶다면 남도 하고 싶을 것이고, 내가 갖고 싶다면 남도 갖고 싶을 것이며, 내가 겪기 싫은 일이라면 남도 겪기 싫을 것이다. 왕과 백성이기 이전에 모두 인간이다. 그렇다면 좋고 싫은 것이 위치가 다르다고 하여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인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내 마음을 미루어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면 된다.”고 말이다. 인간으로 가져야 할 당연한 마음이며 지극히 단순한 진리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선명하게 보이지 않은가. 인과 의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으로 지녀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맹자와 함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걸 쏟아 내고 있고, 자본주의는 ‘자신만 위해도’ 살아남기 힘들다고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 여럿이 함께하는 것보다 혼밥, 혼술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 혼자서 즐기는 여유도 좋지만,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코로나팬데믹으로 세상이 멈췄던 기억을 떠올려 보자. 학교가 멈추었고, 거리가 텅 비었다. 그 결과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빼앗겼다. 사람 관계가 힘들다고, 고립감을 느끼며 무력해지는 청년이 늘고 있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 갈등을 겪으며 성장하고, 위로도 받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키운다.
맹자는 ‘관계의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측은지심惻隱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수오지심 羞惡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사양지심 辭讓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시비지심 是非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측은지심은 인(仁)의 단서이고, 수오지심은 의(義)의 단서이며, 사양지심은 예(禮)의 단서이고, 시비지심은 지(智)의 단서입니다.” 이는 모두 공동체에서, 관계에서 사람이 지녀야 하는 사람다운 마음이고 태도이다. 이 네 가지 마음을 가꾸고 살핀다면 어떤 관계이든 꽃피우고 뻗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맹자가 말한 ‘오륜(五倫)’도 다시 한번 살필 만한 대목이다. 흔히들 ‘삼강오륜’이라고 알고 있는데, 삼강은 한나라 시대 동중서라는 학자가 맹자가 말한 오륜에서 수직관계를 강조하여 만든 것인데, 이 때문에 맹자의 오륜이 오해를 받기도 한다. 맹자는 부모와 자녀 관계의 본질은 친함이며, 왕과 신하 관계의 본질은 의로움이며, 남편과 아내 관계의 본질은 다름이라는 차이이며, 어른과 젊은이 관계의 본질은 연상과 연하라는 순서이며, 벗이란 관계의 본질은 믿음이라고 말했다. 오륜을 살펴보면 모두 ‘〜해야 한다’가 아니라 ‘본질은 〜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친함이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 다름이라는 차이는 무엇인지, 순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고 살피자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저렇게 하시오, 하는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며 키워 나가자고 제안한다. 인간이 다른 존재와 다른 것은 스스로 사유하는 것이다. 거기에 인간 됨의 길이 있다. 남이 말한 대로 따라만 간다면 어느 순간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길을 잃을 수 있다. 생각하고 생각해 보자. 인간 됨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하여 어떻게 관계 맺으며 함께 나아가야 하는지. 2,000년 전에 살았던 맹자의 이야기에서 오늘을 살아갈 작은 실마리 하나 얻을지도 모른다. 떠밀려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아갈 길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맹자의 철학을 실마리 삼아 어지럽고 혼란한 때에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