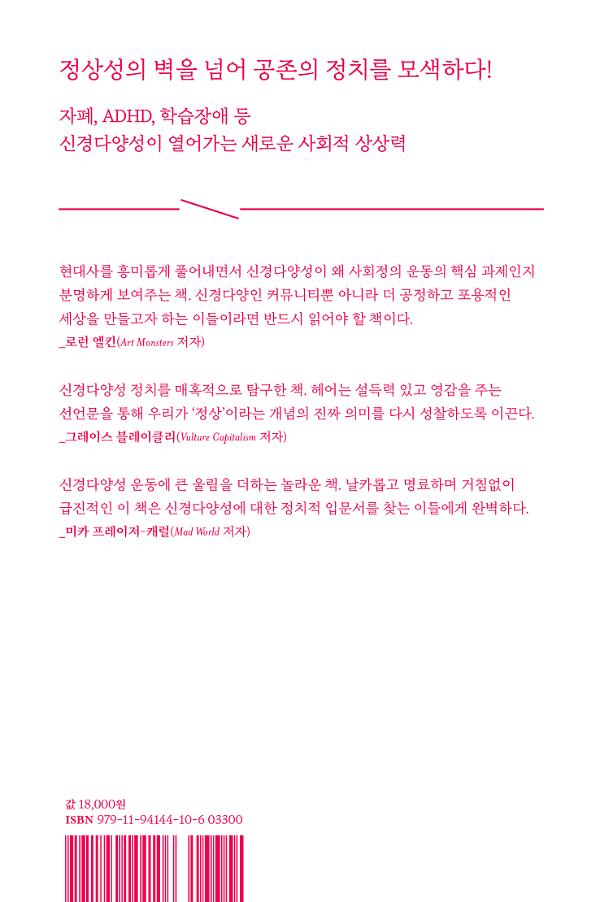역사와 정치, 선언과 비전까지
신경다양성 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안내서
신경다양성은 오늘날 가장 시급한 정치적 쟁점 가운데 하나다. 자폐스펙트럼, ADHD, 난독증, 통합운동장애 등의 진단이 늘어나면서 ‘정상 뇌’라는 개념이 허상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신경정상성을 전제로 운영되며, 자폐를 사회성 결핍의 질병으로 간주한다. 이 책 《바깥의 존재들》은 이러한 왜곡된 역사와 시선을 전복하려는 시도다.
저자 조디 헤어는 23세에 자폐 진단을 받은 당사자로서, 신경다양성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정치적 의제로 제시한다. 그는 지금까지 ‘정상’이라는 기준이 사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그 바깥의 존재들을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만들어왔는지를 비판한다. 동시에 차이를 결핍이 아닌 다양성으로 인정할 때 사회 전체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각종 수치는 현실의 심각성을 뚜렷이 드러낸다. 자폐인의 기대수명은 평균 36세에 불과하며, 자살률은 일반 인구보다 훨씬 높다.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을 확률은 30% 더 많고, 미국에서 자폐아를 둔 가구의 66%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영국의 경우 신경다양성 학생 중 단 6%만이 법적으로 보장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자폐인의 취업률은 22%에 불과하다. 긴축재정 속에서 사회적 돌봄 장치마저 불안정해 신경다양인은 일상적으로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저자는 신경다양성을 ‘비정상적 상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교육, 노동, 사회생활의 장에서 신경다양인이 어떻게 더 포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나아가 인종·계급·성별·장애 등 다른 불평등 구조와의 연결 속에서 민주주의적 사회의 비전을 그린다.
신경다양성은 더 이상 소수자의 문제가 아니다. 계급·성별·인종과 얽힌 불평등을 넘어 모두가 동등하게 살아가는 민주주의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적 비전이다. 이 책은 저항에서 정치로, 주변에서 중심으로 나아가는 신경다양성 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증언한다. 학술 논문이 아닌, 운동성과 사회적 실천에 뿌리를 둔 생생한 증언이자 선언문으로서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독자도 쉽게 읽고 공감할 수 있다. 견고한 ‘정상성’의 틀을 넘어 새로운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강력한 목소리다.
저항에서 연대로, 신경다양성 운동의 지형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신경다양성 운동의 문제의식과 전망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1장에서는 ‘정상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사회 속에서 형성되고 굳어져왔는지 설명한다. 자폐를 비롯한 신경다양성은 의학적 진단명으로만 규정되었고, 그 결과 차이를 ‘결핍’으로 낙인찍는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짚는다.
2장은 자폐 당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정상성의 기준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제약하는지 보여준다. 교육, 진단, 복지 제도의 장벽이 어떻게 ‘다름’을 문제로 만드는지 생생한 증언과 사례가 담겨 있다.
3장에서는 신경다양성 운동의 태동과 전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된 자폐 당사자의 저항이 어떻게 국제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는지, 그리고 이 운동이 단순한 자기표현을 넘어 제도와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실천으로 발전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4장은 신경다양인의 노동·복지·사회참여 현실을 다룬다. 호주와 중국의 통계 자료를 비교하고, 많은 국가들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현실을 드러내며, 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배제의 구조적 증거임을 강조한다. 한국 사회의 현실을 각주로 달아 우리 또한 비슷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앞으로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짚는다.
5장은 신경다양성 운동이 제시하는 미래의 사회상을 그린다. 저자는 ‘정상성의 경계를 허무는 상상력’이야말로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역설한다. 저항에서 정치로, 그리고 정치에서 공존의 비전으로 이어지는 운동의 힘을 강조하며, 신경다양성이 단지 소수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야 할 사회적 과제임을 분명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