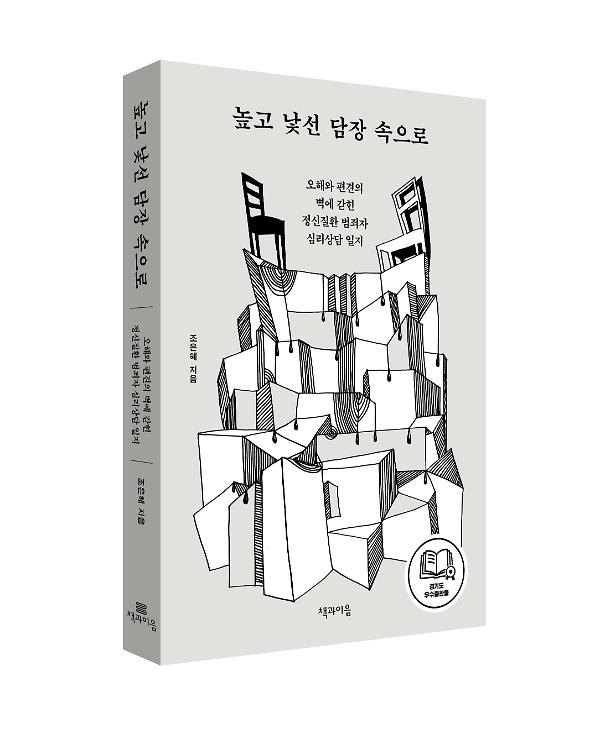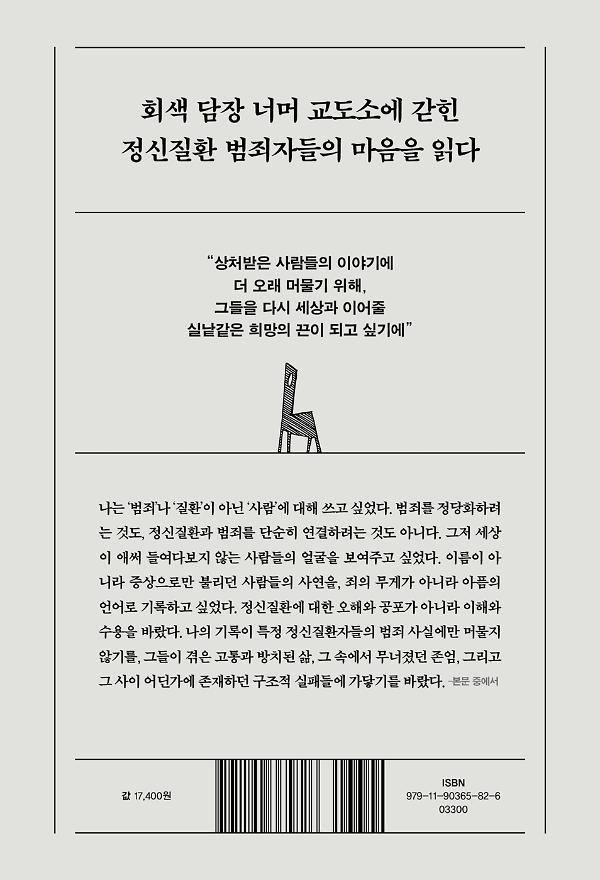누군가의 질병이 다른 이의 웃음거리가 될 수는 없는 법이다. 비록 그 행동이 내 상식선 안에 있지 않고, 그 기괴함이 내 생각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지라도. _p.18
환청이라는 것에 속수무책으로 휘둘렸던 영희는, 나 이외에도 병원에서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을 때리는 일이 곧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내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처럼 느껴졌다. ‘정신질환’과 ‘폭력’이라는 단어를 멀찌감치 떼어놓고 보는 ‘영희’라는 사람은 무척이나 맑고 아름다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영희의 상글상글한 미소는 보는 사람도 함께 웃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한없이 마음을 아리게 하는 슬픔 또한 깃들어 있었다. _p.28
고백하자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나 자신도 아주 조금 이해할 것 같을 뿐이다. 죄를 짓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정체성은 사라지고 오로지 ‘범죄자’라는 낙인만 남는다. _p.70
자신의 병을 자각할수록 자살 위험이 높아진다는 일부 연구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깜냥은 되지 않는다. 병원이 아닌 감옥인 이곳에서는 위기에 처한 환자를 도와줄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병에 대한 인식만 심어주고 대책 없이 떠난 뒷자리를 책임져야 하는 근무자들이 겪을 부담도, 부족한 의료진과 치료 장비로 응급 상황을 맞닥뜨려야 하는 환자와 가족도, 그 뒤 이어질 행정적 절차와 분쟁도 나에게는 버거운 일이다. _p.83
그녀에게 자신이 죽인 대상은 ‘아버지’가 아닌 ‘악마’여야만 했을 것이다. 그편이 위협적으로 요동치는 죄책감을 덜어내고,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것만이 스스로를 용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숨통이 되어주었을 것이다. _p.98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시도했지만, 이별 후에 찾아오는 극강의 외로움과 공허함은 최아영의 곁으로 또 다른 마약 친구들을 불러들였다. 내 앞에서 자신은 이미 개미지옥에 빠져버렸다며 씁쓸하게 웃는 최아영은 탈출구 없는 어둠 속에 갇힌 사람처럼 외로워 보였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녀만의 독특한 소녀스러움과 발랄함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_p.135
나는 오늘도 죽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범죄자에게 살아내라고 말해주었다. 자신을 쓰레기라고 자책하는 범죄자에게 죄와 자신을 분리하라고 말해주었다. 사회 복귀를 앞둔 범죄자가 여전히 ‘피해자 공감하기’에 실패하고 있지만 나는 무능력하기만 하다. _p.166
혼란이 정리된 나는 내 눈앞의 환자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의 신념을 논박하거나 설득하려는 마음은 없었다. 분노와 혐오감이 떠올랐던 자리에 초라하고 아픈 한 인간을 두었다. 그가 처한 현실, 그의 어두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위해 다시 질문을 던졌다. _p.178
마땅히 할 말을 찾지 못한 나는 ‘지나가는 행인의 얼굴을 칼로 긋는 행위는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훌륭하지 않다고 말해주어야 할까?’라고 잠시 생각했다. 말장난 같지만 나는 ‘이상동기 범죄’라는 명명부터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상한 동기의 범죄란 무엇이고, 이상하지 않은 범죄의 동기는 무엇인지 차이점을 이해할 수 없었다. _p.194
대중과 사회는 언제나 정신질환자 본인에게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고, 그 이면에 어떤 병력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환자만큼의 고통을, 어쩌면 그보다 더한 고통을 감내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쉽게 간과되고 만다. _p.209
이지영을 무너뜨린 그 남자를 향했어야 할 원망이, 정신장애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지 못하는 정신재활 시스템에 대한 원망이 오롯이 그녀에게 향했다. 그도 아니면 정상 궤도에 오른 그녀의 삶으로 증명되었을 내 성과를 앗아간 데 대한 이기적인 원망인지도 몰랐다. _p.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