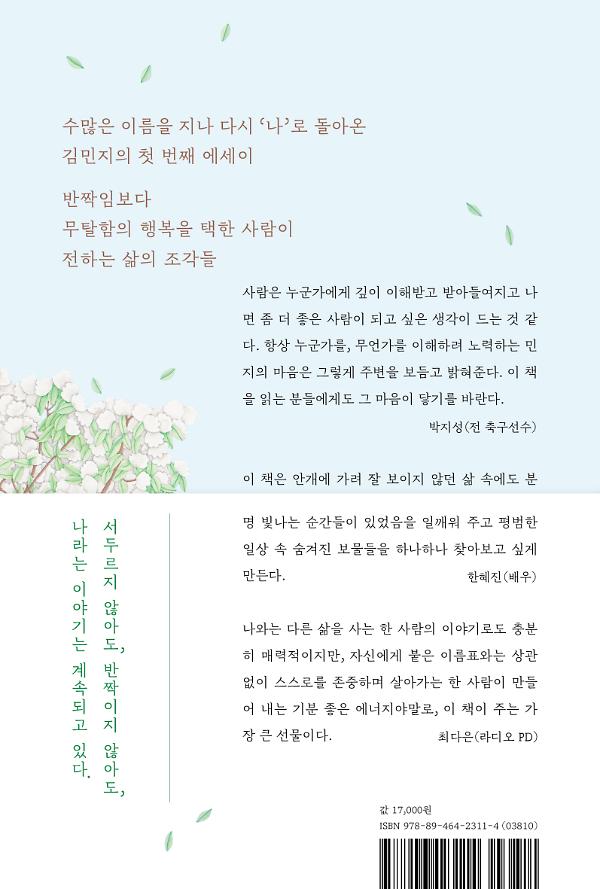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야기들을 고르고 어디서도 하지 못했던 비밀들을 모아 다듬으면서, 밤마다 이불을 차게 했던 부끄러운 일들, 너무 초라해 없었던 일로 하고 싶었던 모습들, 그 모든 실패와 굴욕의 기억들을 꺼내 하나하나 매만졌다. 분명 끔찍한 기억이었는데도 쓰다 보니 웃음이 나는 일들이 있고, 쓸 때는 웃었는데 읽다 보니 눈물이 나는 것들도 있었다. _12쪽, 들어가며
-
이상한 인간은 어디에나 있다. 하지만 대체로는 괜찮고, 더러는 아주아주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배우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 모두에게서 얻을 것이 있다. 일을 빨리 끝내면 떡볶이 먹을 짬이 생긴다는 것을 알려준 카메라 기자와 항상 밝다고 ‘자체 발광’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선배, 카메라 앞에서 쉽게 동정하거나 감정을 보이면 객관과 공정을 잃게 된다고 충고해 주었던 선배. 혼내기도 하고 고기를 사주기도 하면서 나를 웃게도 울게도 해주었던 얼굴들. 그들 덕에 나는 내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세상과 사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_26쪽, 마음속에 품은 것이 있다면
-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나에게 부족하다고 말한다. 엄마들에게 분발하라고 다그친다. ‘경제의 논리’로 우리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자아실현’에 성공한 여성이 되고 싶지 않냐며 나의 선택을 의심한다. 나 역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성과를 내고, 누군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과제가 내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던 날들이 있었다. 그동안 매달리고 매달리면서도 한없이 허덕이고 끝이 없던 날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았던 존재가 내 뱃속에 생기고 머리와 팔다리가 자라 사람으로 나온 경험. 그리하여 내가 읽는 책을 읽고 내가 한 요리를 먹으며 나에게서 말을 배우고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걸 지켜보는 경험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하루에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는데도, 하루 종일 ‘개처럼’ 일하고도 정승처럼 쓸 돈 한 푼 못 버는데도 ‘나’인 채로 괜찮은 것이다. 파워풀한 것이다. 바다가 되는 것이다. _99쪽, 엄마가 되는 것, 바다가 되는 것
-
여행이란 결국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것이라고 했던가, 반복되고 반복되어 권피한 일상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느끼고, 그것을 해소하는 일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과연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이 있을까 싶다마는 그것은 완벽한 여행, 아니, 완전한 치유였다. “자주 여행하세요. 길을 잃는 것은 당신 자신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라는 홀스티의 인기 있는 선언문처럼, 떠나고, 움직이고,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잘 모르는 풍경으로 들어가는 여행은 어떤 치료보다도 나 자신을 낫게 해준다. 그 모든 경로가, 매일의 할 일에 매몰되어 있던 나의 시선을 돌려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애써주기 때문이다. 바빠서, 힘들어서, 여유가 없어서 모른 척해오던 나 자신의 소리를 마주하게 해주는 것이다. _111쪽, 쓸수록 자라나는 마음
-
살다 보면 이런 신기한 일들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전수되고, 습인된 것이 드러나 그것을 목격하는 일 말이다. 그것이 아주 작은 일로부터 시작했더라도 살아서 여기까지 흘러온 이상, 더는 사소한 것이 아니게 된다. 그 인연은 이곳에 오는 동안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 이제는 어떤 굳센 운명이나 숙명이 되었다. 물리학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듯이 호의라는 것도 분명 일정한 양이 보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참이고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여전히 이 마음이 있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세상이 얼마나 엉망인지와는 상관없이 말이다. _147쪽, 그 마음은 내 것이 아니었다
-
남편과 밥을 먹고 나서 장을 보러 나갔다가 슬렁슬렁 산책을 하는데, 뻥 뚫린 시야에 하늘이 끝을 모르게 펼쳐져 있었다. 하늘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우아하게 빛깔을 바꾸었다. 더운 여름이었으나 커먼 주변엔 어디서 불어왔는지 딱 알맞은 바람이 불었다. 제멋대로 자라 제각각 빛을 머금은 채로 흔들리는 풀들, 엉망진창으로 뒹구는 개들, 그 모든 것이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그 어떤 편리함보다도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줄리안의 말이 맞았다. 우리는 곧 그 벌판을 사랑하게 되었다. _201쪽, 초록에서 마주한 얼굴
-
‘친절’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도 들을 수 있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보이는 언어라는 말이 있다. 친절함은 누구나 베풀 수 있고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친절은 여유 있는 사람들만의 특권이나 소수에게만 허락된 특수한 것이 아니다. 인간인 우리에게는 친절과 서로 도운 경험이 이미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특성과 고유한 흠을 가진 채로 태어나, 목숨이 다할 때까지 고군분투하며 살아간다. 우리의 특성이, 약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선 안 된다. 그 약점을 구분하여 나누고 편 가르는 대신, 모두가 딱한 존재임을 살피고, 서로서로 가엾게 여긴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피차 친절함으로써 여기까지 온 존재들이니까. 베품으로써 비로소 존속하는, 약함으로 살아남은 인간이니까. _215쪽, 누군가는 알레르기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