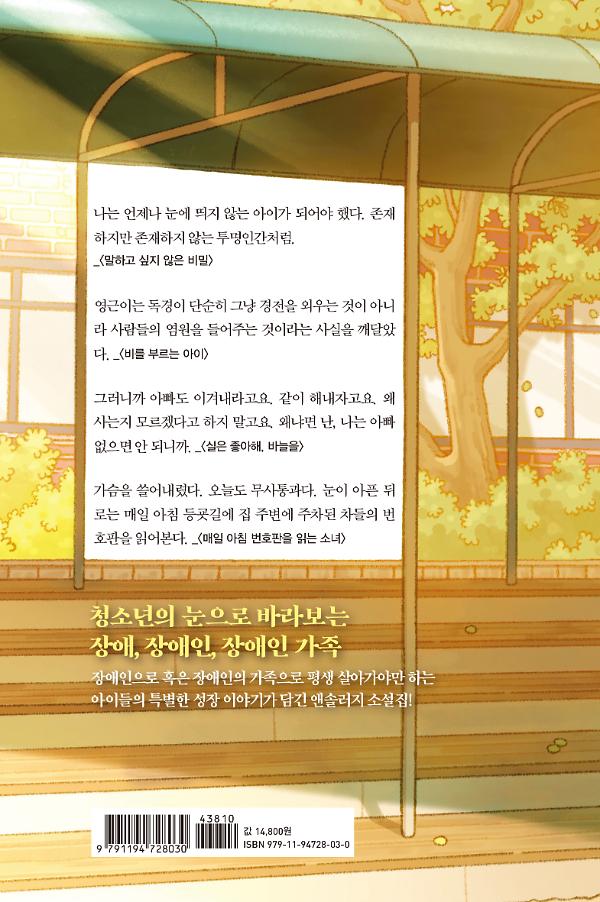이사를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설기만 했던 동네가 익숙해지듯이 한쪽 눈과 한쪽 귀로 사는 세상도 조금씩 익숙해졌다. 덕분에 나는 내 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혹 잊어버릴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내 안일함을 새삼스레 일깨워주곤 했다. 조심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내 초점 없는 눈동자 때문이었다._9쪽
“엄마, 나 진짜 장애인이에요!”
“아니라고! 너는 장애인이 아니라고!”
엄마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그런 엄마를 위로할 힘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우는 엄마를 두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가슴은 아리고 머리는 터질 것 같아 창문을 열고 묵직한 밤공기를 맡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_48쪽
“미안, 손이 빗나가는 바람에. 다친 데는 없지?”
“어, 괜찮아!”
선을 넘은 공의 주인공은 반장이었다. 반장은 진심으로 미안한 얼굴로 사과하며 공을 주우러 아이들과 우리 둘 사이에 놓여 있던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왔다. 반장은 우리를 늘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선을 넘어와 말을 거는 모습을 보니 왠지 기분이 이상했다._64쪽
“아버지! 저는 살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않다고요!”
“아이고, 나도 죽고 싶지 않다. 그런데 살 방도가 있니? 나는 늙고 병들었는데 너는 앞이 안 보이고. 말해 봐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니.”
아버지의 눈물 섞인 물음에 영근이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 말대로 살아갈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_72쪽
얼마나 걸었을까? 앞장서 걷던 두 사람이 걸음을 멈추는 게 느껴졌다. 일정하게 들리던 짚신이 땅을 밟는 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영근이는 아버지의 발을 질질 끄는 소리와 곽 씨 아저씨의 쾅쾅거리는 발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발걸음을 멈춘 걸 보면 목적지인 명통시에 도착한 모양이었다._81쪽
점점 몸이 가벼워진 영근이는 힘을 주어 축사경을 되풀이해 외우면서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 비록 보이지는 않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염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_107쪽
“앗, 따가워!”
중1 때는 방석으로, 중2 때는 마스크로, 중3인 지금은 필통이다. 가정 수행평가인 바느질하기는 어김없이 소나를 괴롭혔다. 오늘도 바늘 때문에 소나의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고 있었다.
“아오, 난 바늘이 너무 싫어!”_112쪽
어느새 투석을 시작한 지 석 달이 넘었다. 일요일 저녁이면 소나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면서 마음이 답답했다. 내일이면 아빠가 또 얼마나 힘들어할까 싶어서 소나도 힘이 들었다. 투석실에 누워 있으면 아빠가 정상인이 아니라 환자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_147쪽
“그러니까 아빠도 이겨내라고요. 같이 해내자고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요. 왜냐면 난, 나는 아빠 없으면 안 되니까.”
아빠는 말없이 팔토시를 받았다. 아빠의 두 눈도 촉촉해졌다._152쪽
“휴.”
서안이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오늘도 무사통과다. 눈이 아픈 뒤로는 매일 아침 등굣길에 집 주변에 주차된 차들의 번호판을 읽어본다. 양쪽 눈을 번갈아 가리며 번호를 읽어 내리는 가슴은 조마조마하기만 했다. 다행히 더 나빠지지는 않은 모양이다._158쪽
하지만 서안이는 명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게 더 답답했다. 미성년자인 환우들은 모두 수능을 걱정했다. 내신이야 그나마 어떻게 컨디션 조절을 하면 극복할 수 있지만 모든 학생이 같은 날에 단 한 번 보는 시험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다. 서안이는 아직 먼일이기는 해도 눈이 수능 때까지 버텨줄지 의심스럽고 두렵고 무서웠다._17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