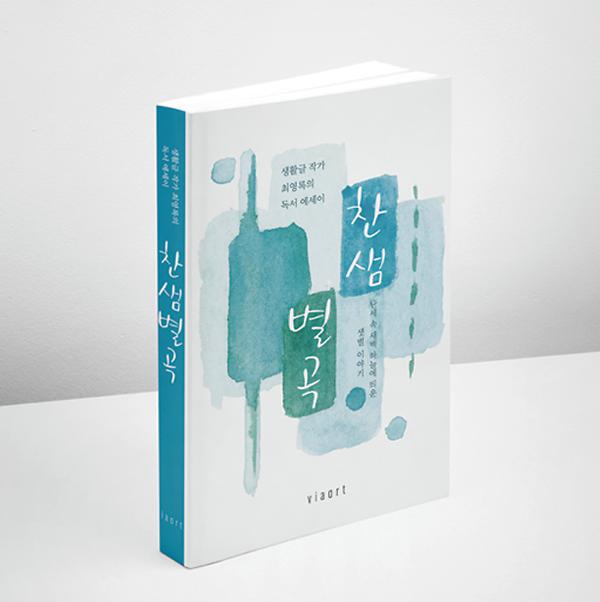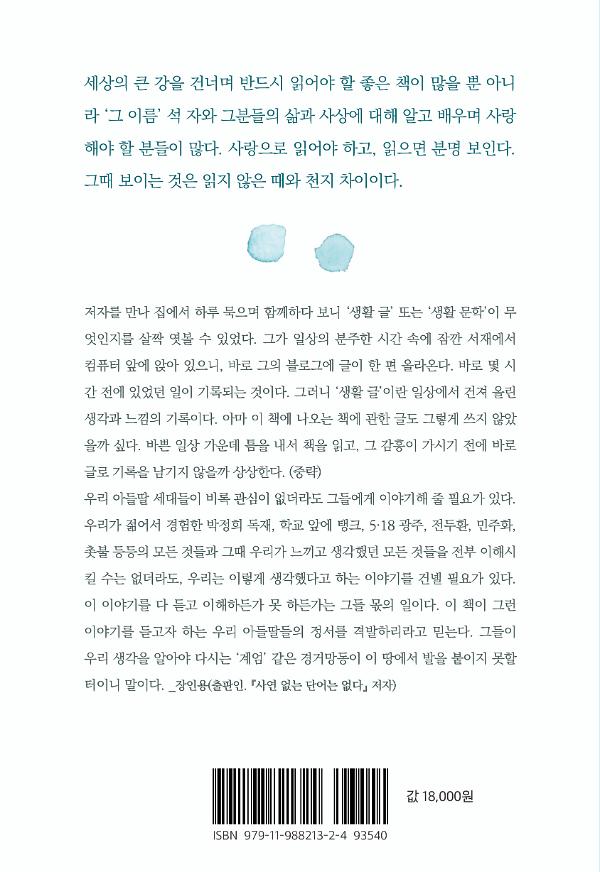‘지금, 여기, 오늘’의 시점을, 그는 ‘난세’라고 확실하게 규정했다. 우리는 전대미문의 난세에 살고 있다. 6학년인 우리야 살 만큼 살았다고 해도 우리 아들과 손자 세대는 어찌할 것인가? 통일은 요원하고 정치는 ‘개똥’이지 않은가. 이승만도, 박정희도, 전두환도, 노태우도 겪어 봤지만, 검찰 독재, 검찰 공화국은 웬 말인가? 그 끝은 과연 어디일까? 두 달 14일 치의 일기를 보라. 그가 왜 난세라고 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거의 모든 게 담겨 있다. (「지금, 들려주고 싶은 이름」 23쪽)
무기수가 되어 한 평짜리 아득한 감옥 독방에 던져졌을 때도 ‘한 걸음 두 걸음 반이면 눈앞에 쇠창살, 돌아서 한 걸음 두 걸음 반이면 코앞에 벽’이었어도 ‘걷는 독서’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자유의 몸이 되고 국경 너머 눈물 흐르는 지구의 골목길에서도 ‘걷는 독서’를 계속했다는 그의 길이 오직 ‘Reading while walking along.’(걷는 독서, 그 자체)였음을 알게 됐다. (「지금, 들려주고 싶은 이름」 56쪽)
문득,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마음의 힘을 채워주는 옛사람들의 좌우명을 되짚어보자. 그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대했고, 어떻게 삶의 파도를 헤쳐 나갔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 저자는 말한다. “삶은 외롭고 가련한 것”이라고. 나도 그 명제에 늘 동의하는 사람이기에,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성현들의 삶의 철학이 녹아 있고 묻어나는 좋은 글들이 나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되곤 한다. ‘아항, 이분들의 삶도 내 삶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나와 다른 것은 이분들은 끊임없이 수양(마음의 도를 닦음)하면서 노력하고, 경건하게 산 게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옛 책 읽기의 즐거움」 94쪽)
작가는 냉정히 말한다. 아버지의 ‘죽음일지’는 자신이 잘났다고 뻗대며 살아온 지난 세월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십팔번 말씀’을 받아들이고 보니 세상이 너무 아름답더라고 고백한다. 어찌 섬진강변의 벚꽃길, 반야봉의 낙조, 노고단의 운해만 아름다울 것인가. 고향에 돌아와 보니 서울에서는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이 천지삐까리’인 것을. 작가에게 감정이입이나 된 듯 몰입한 소설을 만난 것은 행운이다. (「책에서 흔들린 마음」 141쪽)
책 읽는 걸 아무리 싫어해도 『강아지똥』과 『몽실언니』만큼은 봐야 할 것같다. 『강아지똥』은 전우익 선생의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가 떠오르고, 『몽실언니』는 가난했던 화가 박수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지나간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진행되고, 앞으로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선생이라고 부르고 싶은 권정생 작가가 ‘랑랑별’에서 건강한 남자로 다시 태어나 25살 때 22살이나 23살쯤 되는 아가씨와 연애했으면 좋겠다. 그분의 말처럼 그때는 ‘벌벌 떨지 않고 잘할 것’을 믿는다. (「책에서 흔들린 마음」 151쪽)
아무튼, 나는 시를, 시 세계를 아예 모르므로, 순전히 내 마음대로 시라는 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집에 없는 〈오늘 햇살은 순금〉이라는 시집 제목이 지극히 마음에 든다. 오늘(지금)의 오월 햇살이 황금도, 다이아몬드도, 억만금도 아니고, 다른 금속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금이란다. 언젠가 친구의 보석 상점 이름이 〈포나인(four nine)〉이어서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순도(純度) 99.99를 이른다고 해 웃은 게 기억났다. 그렇다. 햇살에 무슨 오염이 있겠는가? 햇살이야말로 황금보다 더 좋은 ‘지금(只今)’이자 ‘순금(純金. 100% 금)’인 것을. (「책에서 찾은 아름다운 길」 216쪽)
김 대표는 머리말에서 “책 읽는 사람은 아름답다. 그 마음이 아름답고, 그 행동이 아름답다. 책을 읽으니, 우리는 이미 친구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미 친구, 과연 그러한가? 그렇다. 공자님도 일찍이 ‘이문회우(以文會友)’라고 하지 않았던가. 분명히 맞는 말이건만, 이날 이때껏 나는 책을 좋아하고 즐겨 읽었으면서도, 『서재 탐험』을 읽으며 왜 계속 부끄럽다고 느낀 것일까? 우물 안 개구리. 남다른 성취, 예를 들면 유명한 소설가나 시인, 수필가가 못돼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교수나 유명한 학자와 저술가가 못된 까닭일까? 잘 모르겠지만, 도란도란 바로 옆에서 듣는 듯한 그들의 책(독서력)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서재를 구경하면서도 어쩐지 낯선 듯한 이 느낌은 무엇인가? (「책에서 찾은 아름다운 길」 246쪽)
우리는 ‘너와 나’라는 좁은 의미의 단어가 아니다. 공동체, 커뮤니티, 집단을 뜻하는 광의의 개념인 것을.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당황한 말이 ‘우리 마누라’라고 한다. ‘my wife’가 아니고 ‘our wife’ 이게 말이 되는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집도, 나라도, 말과 글도 모두 ‘나의’가 아닌 ‘우리’이다. ‘우리’를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는 대체 무엇인가? 오죽하면 ‘우리나라’ ‘우리집’ ‘우리말’ ‘우리글’ 등 네 단어는 붙여 쓰는 걸로 사전에 올라와 있을까? (「책에서 지금, 우리를 만나다」 273쪽)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적으로 꿰뚫는, 이런 ‘통시적(通時的) 학자’의 저술을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항상 의식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게 나의 오랜 지론이다. 수도 없이 많은 깨어 있는 ‘깨시민’ 덕분에 비록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6년 전 촛불혁명을 낳았고, 최근 무혈(無血)의 ‘빛의 혁명’을 이룩하여, 드디어 마침내 완성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책에서 지금, 우리를 만나다」 32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