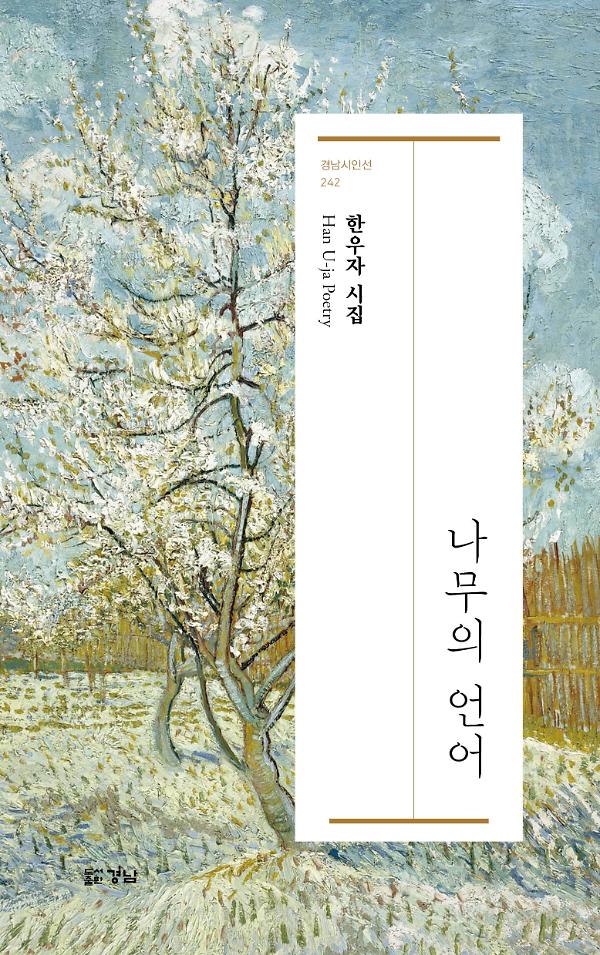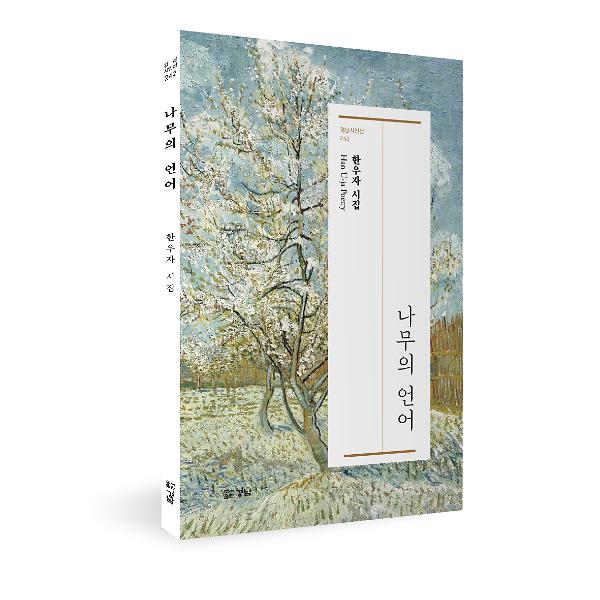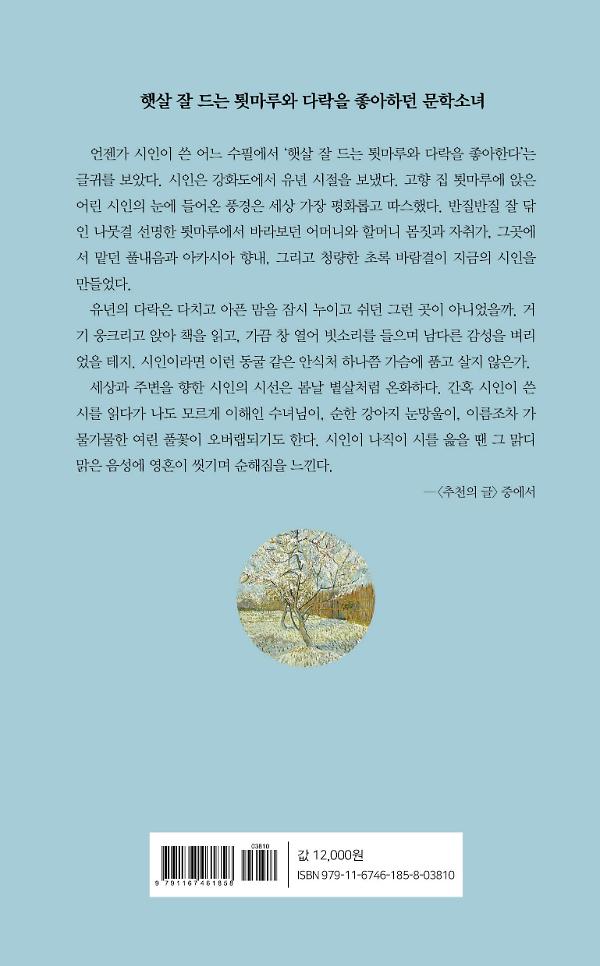햇살 잘 드는 툇마루와 다락을 좋아하던 문학소녀
언젠가 시인이 쓴 어느 수필에서 ‘햇살 잘 드는 툇마루와 다락을 좋아한다’는 글귀를 보았다. 시인은 강화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고향 집 툇마루에 앉은 어린 시인의 눈에 들어온 풍경은 세상 가장 평화롭고 따스했다. 반질반질 잘 닦인 나뭇결 선명한 툇마루에서 바라보던 어머니와 할머니 몸짓과 자취가, 그곳에서 맡던 풀내음과 아카시아 향내, 그리고 청량한 초록 바람결이 지금의 시인을 만들었다.
유년의 다락은 다치고 아픈 맘을 잠시 누이고 쉬던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거기 웅크리고 앉아 책을 읽고, 가끔 창 열어 빗소리를 들으며 남다른 감성을 벼리었을 테지. 시인이라면 이런 동굴 같은 안식처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살지 않은가.
세상과 주변을 향한 시인의 시선은 봄날 볕살처럼 온화하다. 간혹 시인이 쓴 시를 읽다가 나도 모르게 이해인 수녀님이, 순한 강아지 눈망울이,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여린 풀꽃이 오버랩되기도 한다. 시인이 나직이 시를 읊을 땐 그 맑디맑은 음성에 영혼이 씻기며 순해짐을 느낀다.
―〈추천의 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