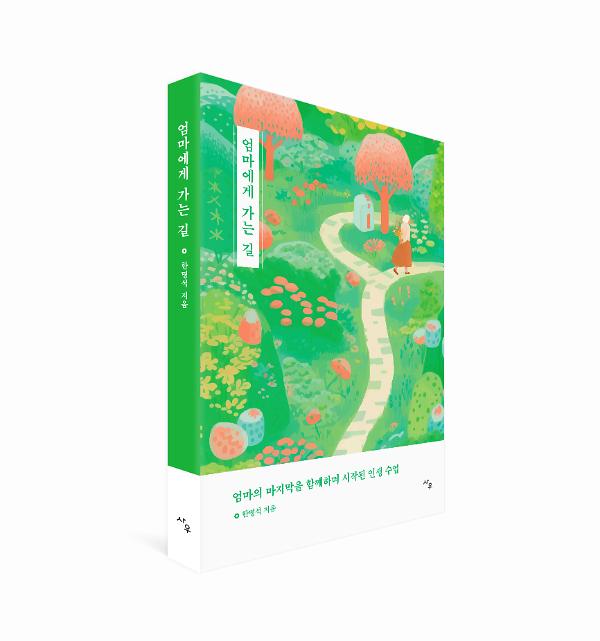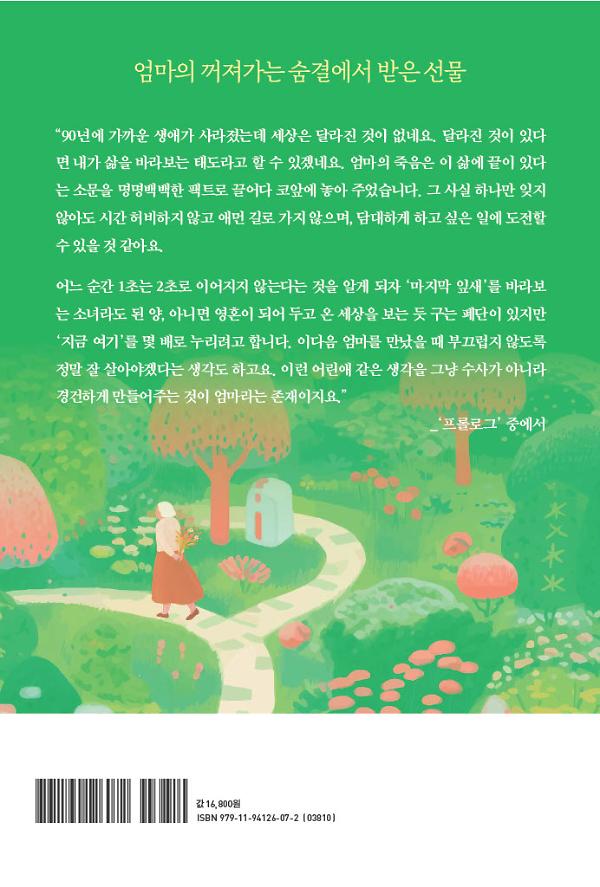맛있는 음식을 먹고 쇼핑도 했다. 푹 쉬었다 가려고 다음날 아침거리까지 산다. 이게 전부인 것이다. 엄마가 하나도 하지 못하게 된 일, 내가 아직은 활개 치며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이렇게 단순한 일상은 더이상 단순할 수가 없었다.
이제 아무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리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주어지면 감사하리라.
오직 살아 있음을 향유하리니, 미친년처럼 웃고 떠들며 뛰어다니리라._32쪽
요양원 근처 모텔에서 머물며 집중적으로 면회를 하는 전략은 꽤 유효해서 나는 그야말로 ‘롱 굿바이’를 할 수 있었고, 그게 슬프다기보다 안온하고 따스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엄마, 내일 또 올게”의 위력이었다. “엄마, 내일 또 올게”라고 말할 때 엄마를 버렸다는 죄책감에서 면죄 받고, 편안함이 나를 적시던 경험은 꼭 마법 같았다._52쪽
그러니 이제야말로 엄마의 인생을 맘껏 인정하고 칭송할 때였다. 나이가 얼마든 상황이 어떻든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인정은 힘이 될 터였다. 정신이 살짝 없을 때도 누군가 자신을 존중하고 칭송하는 느낌은 전달될 것이었다. 게다가 청각은 끝까지 남는다고 하니 나는 다른 건 못해도 3년 내내 엄마의 인생을 인정하고 칭송하는 건 해드렸다. 부지런히 꽃다발을 만들어 갖고 다닌 것도 그래서였다.
꽃이 아니면 무엇으로 애틋함과 죄송함과 먹먹함이 뒤엉킨 심경을 전달하랴. 꽃이 아니면 무엇으로 이렇게 세상이 곱다고, 이 고운 세상에 좀 더 머물러 계셔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엄마의 인생 나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심경으로 나는 장미와 영산홍, 모란과 백합, 으아리와 글라디올러스, 국화꽃을 꺾어 꽃다발을 만들곤 했다._60쪽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말이 이런 뜻이리라. 살고 있는데도 더 벅차게 살아 있고 싶어진다. 유스호스텔 창밖으로 인조잔디가 깔린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사람들. 간밤에 잘 때도 축구를 하더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똑같이 하고 있어서 “꼭 컴퓨터 게임 화면 같네”라고 말하던 아침. 아들이 과일을 자르러 공용부엌으로 갔는데 오렌지를 딱 하나 들고 갔다 와서 웃는 아침. 오늘만 같아라, 더 바랄 것도 없이 지금을 가만히 껴안는다. 그 어렵다는 카르페디엠이 조금씩 되고 있다._84쪽
지금 무언가로 골치를 썩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이의 어깨를 흔들며 마구 소리치고 싶었다. 산다는 건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야. 끝이 분명한 연극 같은 거라고. 결국은 이렇게 끔찍한 농담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웃으며 산다 해도 아까운 게 인생이란 말이야!_119쪽
몇 번을 제외하고는 주로 나를 알아보셨고, 속절없이 저물어가는 한 생애가 보여주는 속내에 내 가슴은 쿵쾅거렸다. 초반에는 “자고 가”라는 말씀을 잘하셨다. 면회시간 내내 별 반응이 없다가 내가 일어서자 “더 있다 가” 하실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기억을 못 하는 날에조차 “누군지 모르지만 나 좀 데려 가” 하실 때면 억장이 무너졌다. 한정된 공간에서 정기적인 그룹 활동을 빼고는 정지화면처럼 고여 있을 엄마의 일상에 잠시라도 틈을 만들어드리고 싶어 달려갔다. 날깃날깃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기억과 감정의 세포를 가지고 언뜻언뜻 보여주는 표현이 감사해서, 나는 남들이 치매 걸렸다고 말하는 엄마가 진심으로 보고 싶었다._171쪽
해드린 것도 없이 지쳐가며 짜증이 늘고 내 속의 ‘화’를 키우는 것이 두려워 손을 놓고 싶을 때, 아기 키우듯 백 일만 더 돌봐드리자고 마음을 다잡았다. 누워서 울기만 해도 이쁨을 받는 아기를 키우듯 그렇게 백 일만 보살펴드리자 …. 엄마의 평생에 걸친 헌신에는 어림도 없지만 ‘백 일’이라는 날짜의 상징성도 있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넘기던 무렵, 문득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피에타〉가 떠올랐다. …
미켈란젤로라는 천재가 형상화해 놓은, 역사상 가장 성스러운 슬픔인 〈피에타〉는 인간이 인간에게 품을 수 있는 연민의 상징인 거고 나는 〈피에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마음이 가라앉았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갑갑하다가 나를 뛰어넘는 어떤 거대한 개념에 연결되었다고 느끼면서 숨통이 트인 것 같다._19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