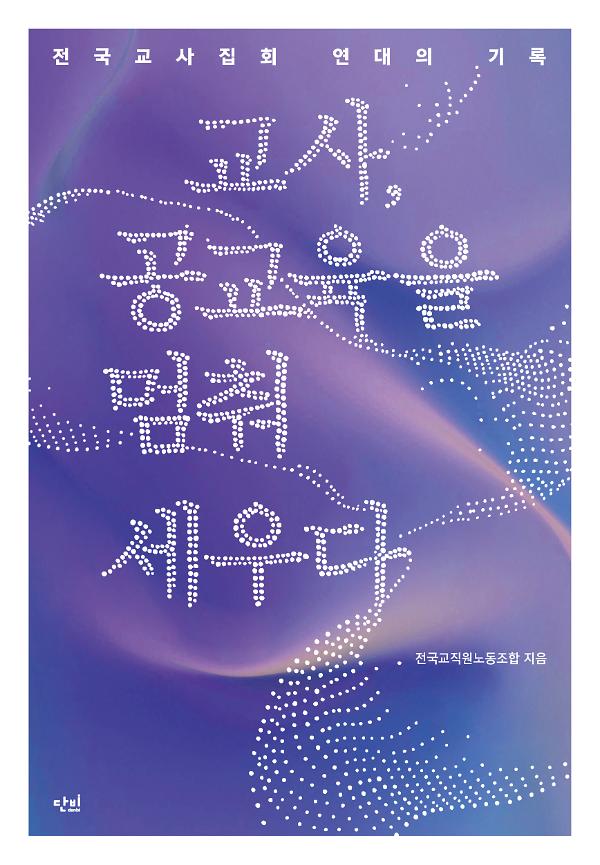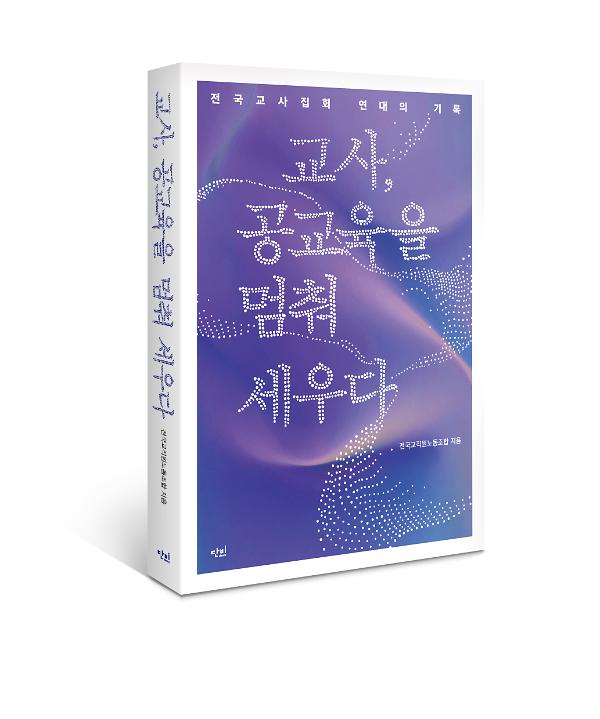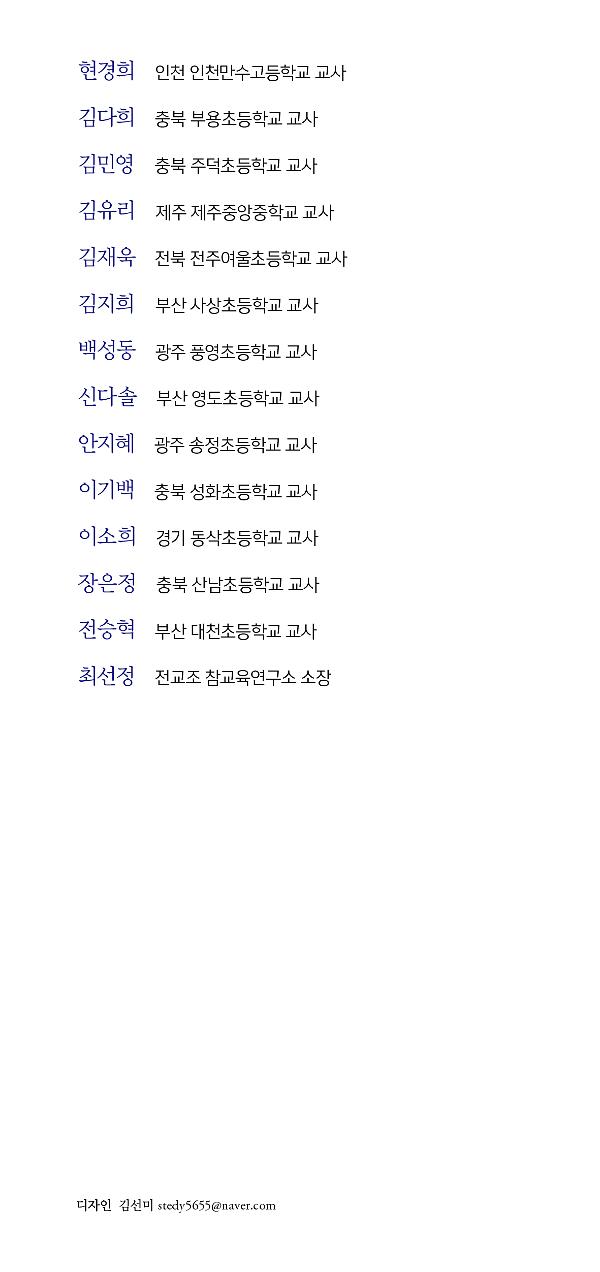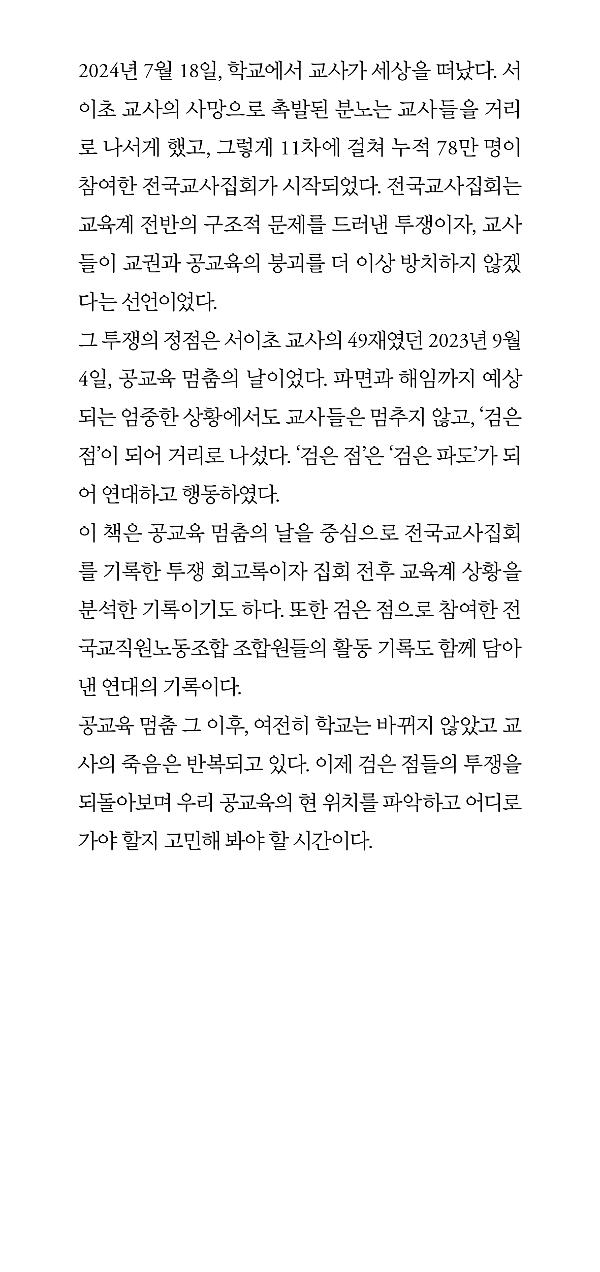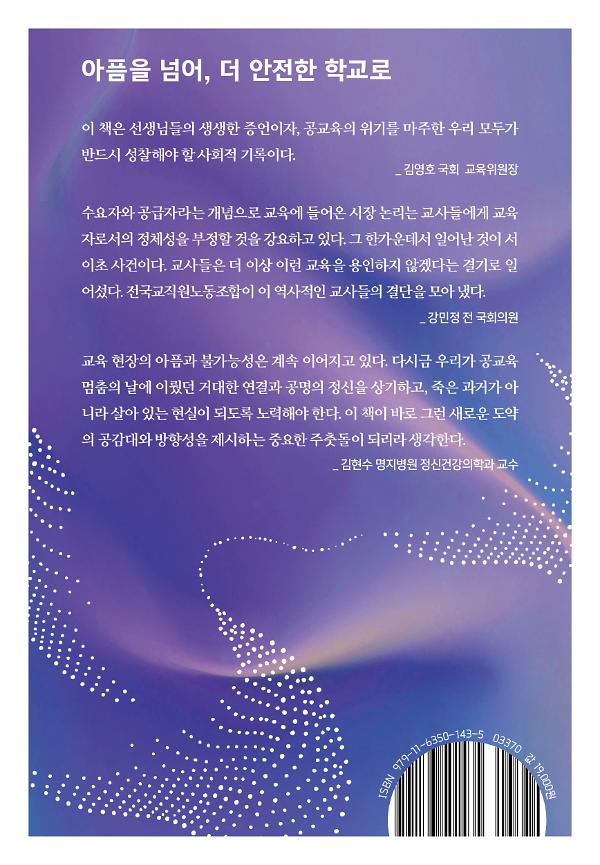책 속에서
《교사, 공교육을 멈춰 세우다》는 우리의 다짐이자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멈췄던 이 걸음이, 공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 가는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이 뜨거운 여름을 함께했던 ‘우리’들의 역사이자, 국민에게 ‘우리’가 함께 지켜 낸 이 순간을 전하는 증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p7)
한 교사는 “5,000명만 와도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5,000명을 모두 징계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런데 국회 앞 도로가 가득 찼다. 경찰도 당황할 정도였다. 밀려드는 검은 옷의 행렬을 보며 계속 눈물이 났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바꾸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9.4 국회 집회는 교육사에 길이 남을 집회로 기록될 것이다. 교육부의 징계 겁박 속에서도 국회 앞 집회 5만 명 참가, 13개 지역 추모 집회에 7만 명 참가, 9월 4일 전국에서 열린 집회에 총 12만 명의 교사들이 연가, 병가, 조퇴 등 자기만의 방식으로 참여했다. (p36)
9월 2일 국회 앞 집회에서 하도 울어서 얼굴에는 짠내가 가득하고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오늘 교육청과 교육부의 겁박이 있었음에도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교육 멈춤 행동’으로 용기를 보여 준 선생님들께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학교는 걱정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수업을 위해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배려해 준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각자 가진 경험치가 다르기에 의견과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성숙하게 서로를 배려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논의를 통해서, 또 각자가 선택한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생각은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서로 미안해하지 말고, 서로 불편해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해하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p51)
대중매체와 언론이 과거의 기억, 폭력적인 사회가 투영된 과거의 학교에 머물러 있는 것도 온 사회가 학교를 불신하게 만드는 큰 원인 중 하나이다. 생각보다 대중매체와 언론의 힘은 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 당국은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몰아가고, 대중매체와 언론이 좋아하는 자극적인 방식으로 교사를 악마화하는 보도자료를 끊임없이 생산한다. (p229)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에게 아무런 권한도 보호도 하지 않은 무능력한 교육 당국이 현재의 교실 문제를 만들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법과 매뉴얼로 교사를 통제하는 동안, 교사의 교육 활동을 돕는 시스템은 전무全無했다. 그래도 교사는 아이들을 지키고 교실과 교육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했다. (p229)
한국 교사들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 입에 완전히 재갈이 물렸고 정치적 금치산자, 정치적 천민이 된 후 60년이 흘렀다. 당연히 집회에서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탈정치’를 외쳤다.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큰 지식인 집단이 교사 집단이다.
독일 교사들은 베를린의 국회의사당 안에 무려 81명이 앉아 있다. 640명 중에 81명 13%가 교사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사들은 국회 밖에서 국회를 둘러싸고 ‘탈정치’를 외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현상 자체에 대한 깊은 분석과 성찰이 필요하다. (p233)
이런 현상이 악화된 것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다. 대학도 마찬가지로 고객 만족도 조사라는 걸 했다. 교원평가가 들어오고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관계로 바뀌면서 시장적 관계로 바뀐 것이다. 야만도 이런 야만이 없다. 참된 교육이라는 것은 민주적 관계에서 가능한 건데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시장적 관계로 바뀌면서 교사들의 권위가 한풀 더 꺾였다. 이런 문제들이 서이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구조적인 환경이라고 본다. (p235)
교육을 경제 논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은 교육기관과 교육정책이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며, 이해득실에 따라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과 거리가 먼 정책을 결정하게 만든다. 교사 증원이나 학급 증설, 행정업무 감축을 위한 행정 시스템 개선 등 비용이 비싼 투자는 꺼리게 될 것이고, 산업계를 지원하여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 아래 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기자재 구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는 결정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육정책이 시장에 의해 좌우될 때, 교육은 공공성을 잃게 된다. (p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