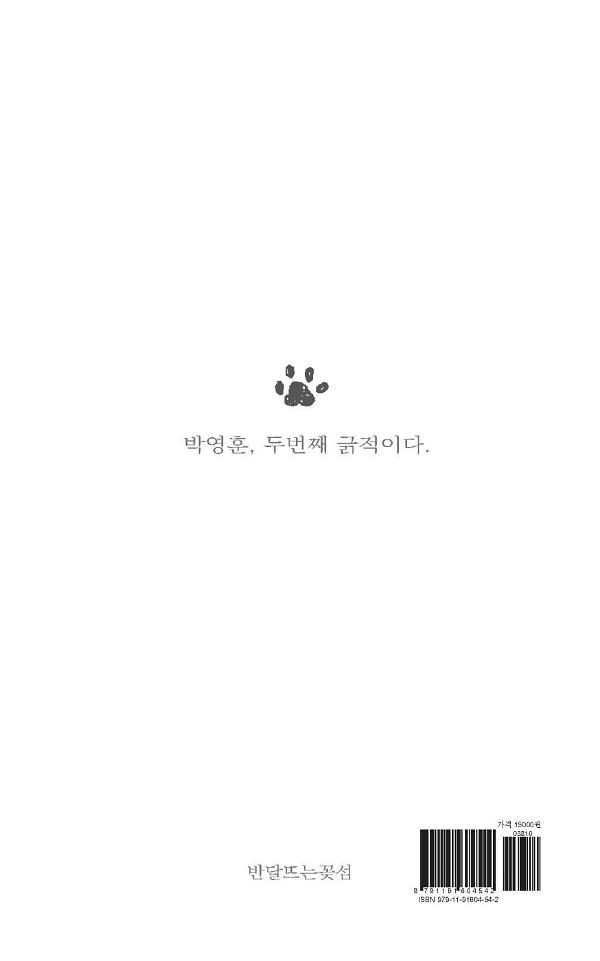삶의 변두리를 기록하는 서정의 눈,
가장 조용한 자리에서 건져 올린 말들의 위로
박영훈 시인의 첫 시집 『흰 양식장의 고양이들』은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난 자리에서 시작된다. 이 시집은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한 세계, 보아도 오래 머물지 못한 세계, 혹은 애써 외면했던 세계를 향해 조용히 말을 건넨다. 시인이 시선을 두는 곳은 대단하거나 눈부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보는 삶의 가장자리는 결코 하찮거나 덧없지 않다. 오히려 그곳에야말로 생의 본질과 고요한 아름다움이 숨어 있음을 이 시집은 알려준다.
박영훈의 시는 일상의 바깥에서 맴도는 풍경들을 들여다보며, 잊힌 사람들의 이름 없는 이야기를 품는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관찰자의 거리에서 던지는 언술이 아니다. 시인은 삶의 안쪽에 조용히 발을 담그고, 한 자락 옷깃을 내어주듯 대상들과 동행한다. 그러면서도 과장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고통을 대상화하거나 슬픔을 미화하지 않는다. 이 시편들은 다만 묵묵히 존재하는 법을 택한 자들의 삶을, 정제된 언어로 천천히 꺼내어 놓는다. 이 시집에는 도시의 화려함보다 외곽의 침묵이, 중심의 고함보다 변두리의 숨결이 우선시된다. 시인은 무너진 지붕과 낡은 다락방, 비에 젖은 손수레와 다정한 침묵 같은 것들에 주목하며, 그 안에 담긴 서사의 온기를 포착해낸다. 그리하여 한 편 한 편의 시는 누군가의 이름 없는 하루를 떠올리게 하고, 독자는 낯선 듯 익숙한 삶의 정경 속에 스며든다. 이 과정은 다정하지만 결코 감상적이지 않고, 따뜻하지만 결코 얕지 않다.
『흰 양식장의 고양이들』은 단순히 현실을 묘사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이 시집은 시가 삶의 품격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시인은 거창한 명제를 말하지 않지만, 각 시편은 삶을 마주하는 윤리적인 태도와 존재에 대한 조용한 존중을 내포하고 있다. 시는 이윤도 명예도 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작고 단단한 헌사이며, 누구도 주인공이 아니지만 누구 하나 배제되지 않는 공동체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 박영훈의 언어는 단단하고 절제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더욱 깊다. 말보다 침묵을 신뢰하고, 묘사보다 여백을 믿으며, 분노보다 품위를 택한다. 이 시집은 한 줄 한 줄의 언어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곁에 머무는 삶’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 화려함이나 기교가 아니라, 조용한 동행과 지켜봄이야말로 문학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되새기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