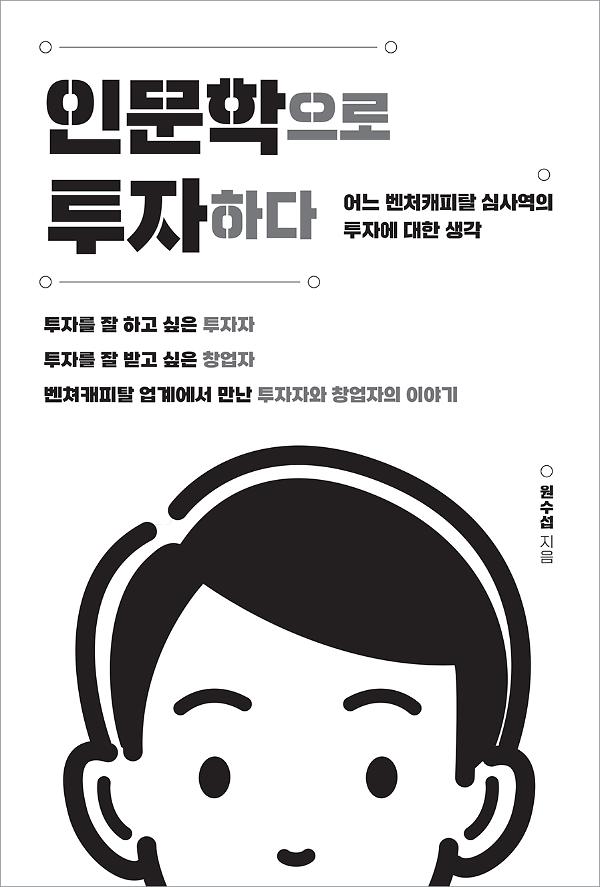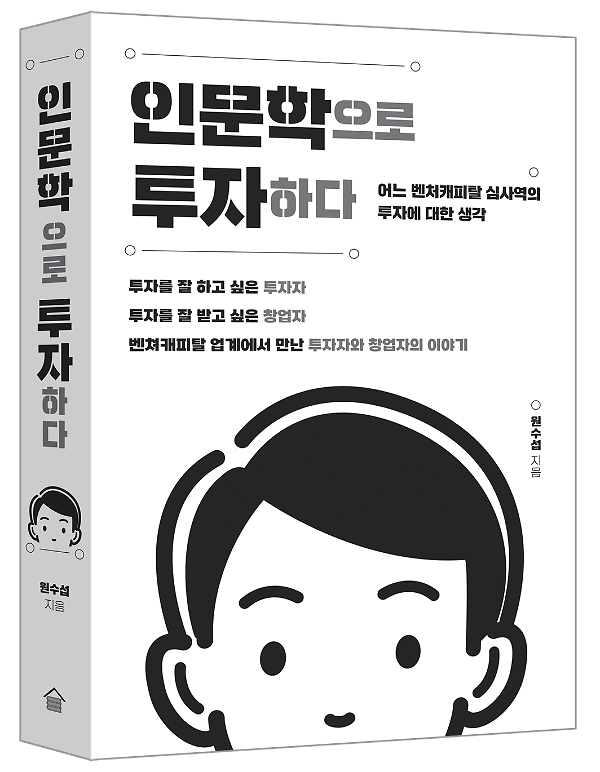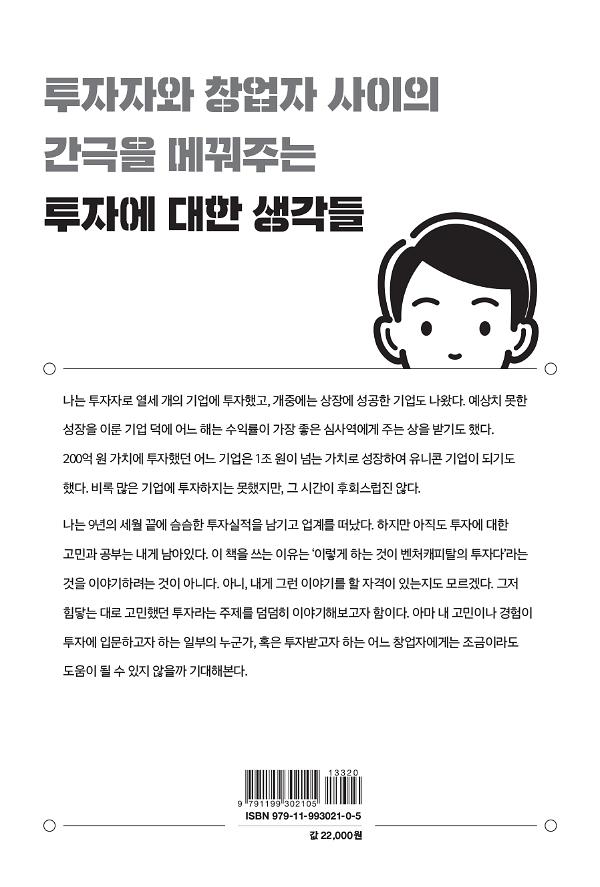워런 버핏은 많은 투자자가 확신도 없이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적지 않은 투자자가 가장 잘 치는 공이 아님에도 섣불리 스윙해 버리고 만다고 말이다. 심지어는 확연히 스트라이크존을 벗어나 걸러야 할 공을 보고도 남이 휘둘러서, 혹은 잘 모르지만 좋아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배트를 돌려버리는 우를 범하고 만다.
워런 버핏의 이야기는 “예·복습에 학교수업 위주면 누구든 공부 천재!” 같은 소리처럼 듣기에는 쉬우나 실천하기는 어렵다. 투자도 타격처럼 ‘선구안과 기다림으로 빚어지는 예술’이다. 선구안은 관점을 말한다. 명확한 관점. 시장에 대한 깊은 통찰과 통섭, 정보와 통계로 다져진 근거,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시장의 모든 정보를 다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나만의 스트라이크존을 만들 수 있다.
_A box of Chocolates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중간 요약하면 이렇다. 심사역은 많은 기업을 만나면서 경험치를 축적해야 한다. 하지만 무작정 경험을 쌓기만 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과거 기업의 사례와 이론들을 참고하여 나의 고유 모델에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투자 심사역이 기업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가 사용하는 고유의 통계 모델이 얼마나 잘 구축되는지가 관건이다. 즉,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기업평가를 위한 통계 모델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고도화시켰는가가 경쟁력이라는 이야기다.
혹자는 “투자는 그냥 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투자 업계에서 흔히 하는 이야긴데, 나는 업계에 다른 이들보다 높은 성공률과 성공적인 회수를 오랜 시간 반복하는 이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반복적인 성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마저도 운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운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왕이면 ‘실력’이라 칭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고 여기고 이를 배우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_투자판에 적응하기
여기서 전문가란, 그저 그 분야의 지식을 빼곡히 채우기만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닐 거다. 그 분야의 요소 사이의 관계를 (확률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응당 전문가로 불려야 하지 않을까?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우주여행 등을 예로 들어보자. 이 기술은 언젠가 우리 삶의 안으로 들어올 법한 기술이다. 하지만 각 기술과 사업의 기회를 잇는 연결고리의 강도는 다 다르다. 이러한 기술이 기술의 영역에서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스토리를 높은 맥락 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게 전문가일 것이다.
맥락 없이 사업에 나서면, 계획은 자칫 공상이 되어버리고 만다. 내 머릿속에 별도의 세계관이 형성되어 실제 현실과 괴리되는 것이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빈번하다. 비단 사업뿐이랴. 투자도 비슷하다. 많은 투자자가 사업이나 기술을 대면했을 때, 그것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등장했고 얼마나 현실성을 갖는지 판단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이 기술이 지금 얼마나 주목받는지를 따진다. 설령 주목받더라도 그 안에서 현실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투자하지 말아야 함에도 과감히 지른다.
_통계적 유의성에 머물러라
기술에 특화된 스타트업의 맹점 같은 것이 있다. 많은 수의 기술 창업자가 ‘시장이 좋아할 만한 제품’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시장이 아니라 창업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인공지능 기술뿐이 아니다. 내가 만났던 드론, UAV, 배터리, 로봇 등을 아이템으로 하는 기업의 적지 않은 수가 서비스를 설명할 때 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흥분시키는 기술’을 이야기하는 데 집중한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기술적 치밀함은 높지만, 시장 검증은 매우 느슨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장의 욕구와 창업자의 욕구 사이의 괴리만큼 실패 확률은 높아진다. 이걸 막기 위해 제품의 콘셉트 단계부터 고객을 인터뷰하거나 제품의 프로토타입을 써보게 해야 한다.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나를 만족시키는 제품’이 과연 ‘시장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_최적의 타이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