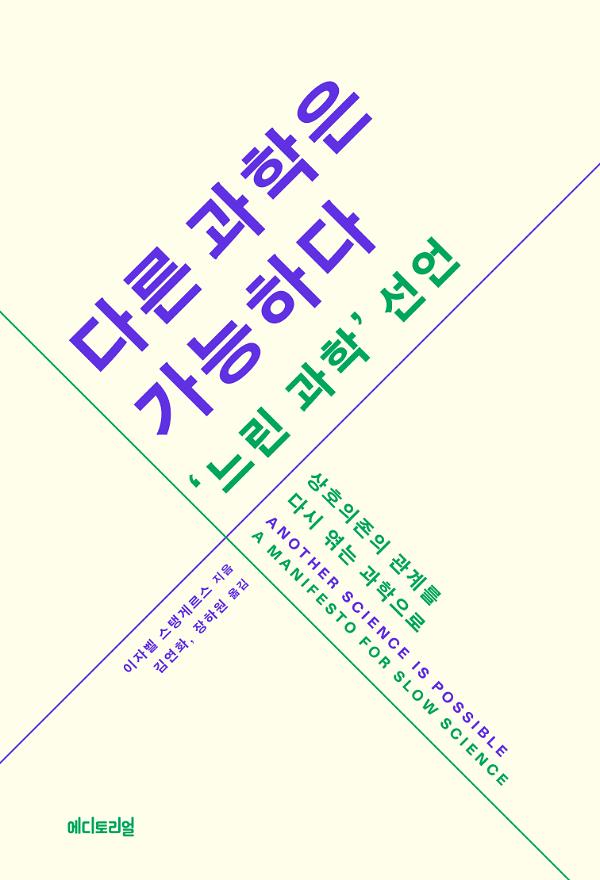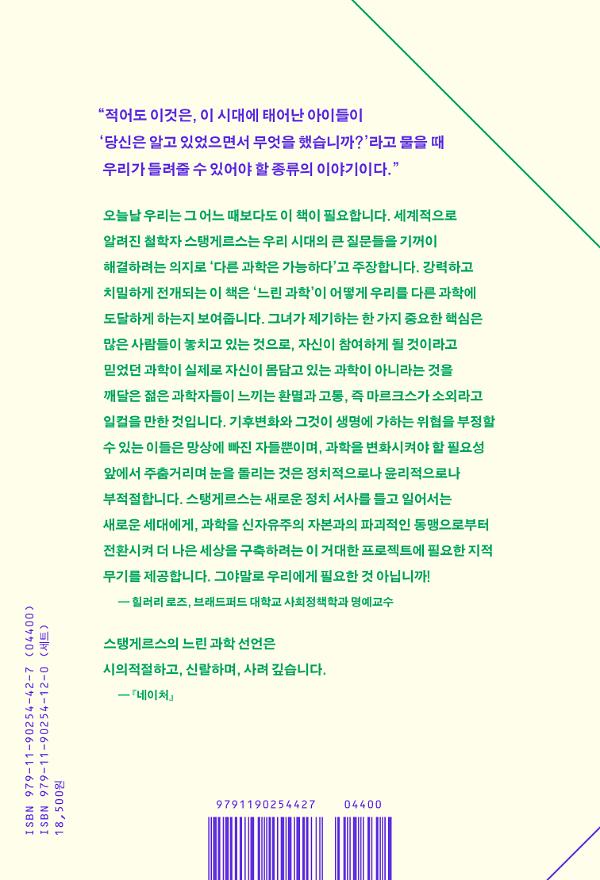‘관심의 문제’에서 핵심적인 것은, 단 하나의 ‘정답’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대신 주저하고 집중하면서 세심하게 조사하는 과정이 불가피하게끔 종종 어려운 선택지를 더하는 데에 있다. 시간을 금으로 여기고, 금지되지 않은 모든 것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기업가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게다가 과학적 전문성과 결탁한 선전은 너무도 자주 어떤 혁신을 ‘과학의 이름으로’ 올바른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곤 한다. 이런 이유로 나는 이해라는 개념을 대신하여 과학에 대한 ‘대중지성(public intelligence)’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는 과학의 결과물뿐 아니라 과학자 당사자들과도 지성적인 관계를 창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_1장 과학에 대한 대중지성을 향하여, 15쪽
오늘날 이 행렬은 이전의 웅장함을 대부분 잃어버려 다소 초라하고 불안해 보이지만, 울프가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질문에 대해 잠시라도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주장하는 여성들과 남성들을 여전히 배제하고 있다. 울프는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우리가 속한 이 ‘문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기를 결코 멈추지 말자”라고 썼다. 그리고 이 물음을 확장하면, 다음 질문으로 이어진다. 탁월성이라는 이름하에 파괴되고 있는 이 학문 세계는 무엇인가? 우리는 실제로 과거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세계에 대한 향수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생각해야만 한다. _2장 올바른 자질을 갖춘 연구자들, 53~54쪽
내가 여기서 보여주려는 것은 이러한 모델이 ‘빠른’ 과학을 위해 고안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에서는 유능한 동료들에게만 전달되는 지식의 누적적 생산과 ‘통속화된(vulgarised)’ 형태의 지식이 엄격히 구분된다. 이와 함께, 나는 과학의 속도를 늦출 것을 호소하고 싶다. 이는 정직하고 훌륭한 연구자들이 동료들에게 공정하게 인정받던 다소 이상화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과학의 다원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어야 하며, 서로 다른 유형의 연구에 적합한 평가 및 가치화의 방식에 대한 다원적이고 협상적이고 실용적인(즉 그 효과에 따라 평가되는) 정의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_3장 과학과 가치: 어떻게 하면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
플렉을 다시 읽으면서, 나는 생의학 연구자들이 자신들이 다루는 주제를 파악하는 불안정한 방식에 대해 플렉이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 여기에는 퍼즐이 없기 때문에 어떤 패러다임도 없다. 나는 파스퇴르와 코흐의 경직된 사고 방식을 다루는 플렉의 온화한 유머가 좋았다. 두 사람 모두 쿤이 패러다임이라고 부른 것을 수립하고자 노력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각각의 질병, 각각의 미생물, 각각의 문화가 각기 예측 불가능한 질문을 계속해서 제기하며, 퍼즐 풀이자의 자신감보다는 냉철한 주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_4장 루드비크 플렉, 토머스 쿤 그리고 과학을 느리게 하는 과제, 147~148쪽
빠른 과학은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를 늦추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명령이자, 그렇지 않으면…과 같은 식의 경고를 의미한다. 이 ‘그렇지 않으면(or else…)’이라는 표현은 추락의 가능성을 상기시킨다. 과학자가 자신의 삶 전체를 과학이라는 소명에 헌신하지 않으면 그 소명을 배신하게 된다는 고귀한 요구와 연관 지어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이 얻어지고 유지되는 방식, 즉 상상력을 억제하면서 주의력과 열의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훈련에는 고귀함이 전혀 없다. 화이트헤드가 말했던 전문가들의 훈련은 오히려 동원된 군대가 진격하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마취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명령은 될수록 빠르게 전진하는 것이다. _5장 ‘다른 과학은 가능하다!’ 느린 과학을 위한 호소, 179~180쪽
나는 철학자로서, 더 구체적으로는 유럽의 철학자로서, 북미에서 이미 대부분 파괴되어버린 방식으로 여전히 철학을 실천하면서 말하고 있다. 사유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모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말이다. 나의 제안이 조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이는 어떤 특정한 되찾기 작업의 경우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사유라는 것은 그 자체로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사유는 독이 되기도 하고 무언가를 활성화시키기도 하며, 가능성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열어주기도 한다. _6장 코스모폴리틱스: 근대적 실천을 문명화하기, 21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