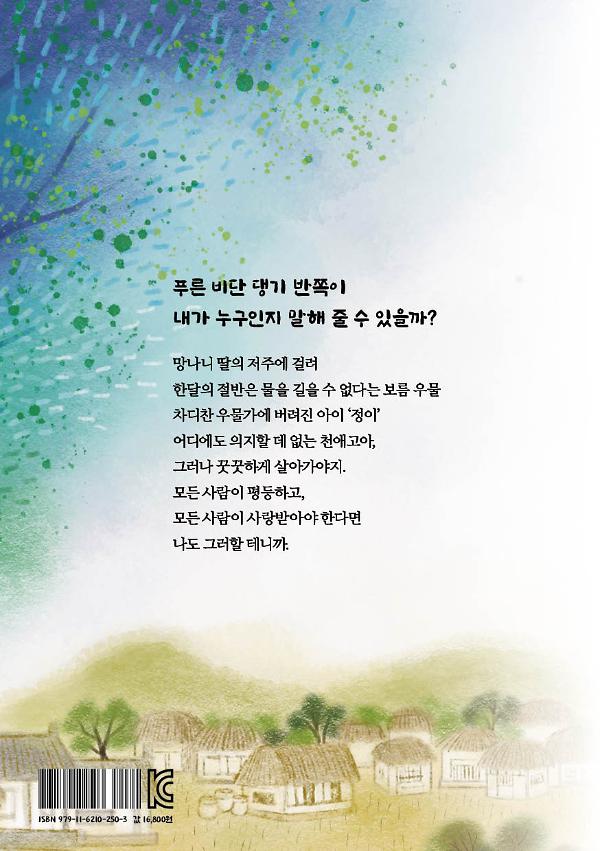“어, 내일부터일 줄 알았는데……. 원래 이 우물이 보름 동안은 물이 탁해지고 맛도 없어서 못 먹고요, 나머지 보름 동안은 물맛이 좋아지거든요. 그때는 늘 사람들로 붐벼요. 그래서 이 우물 이름도 보름 우물이고요.”
“그래?”
정이는 작은 목소리로 여인에게 말했다.
“아주아주 먼 옛날에 양반 아들을 사랑한 망나니의 딸이 여기에 빠져 죽었대요. 예전에는 전혀 먹을 수 없었는데 임금님이 망나니 딸의 혼령을 위해 제를 지내고 나서야, 그나마 보름 동안은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망나니 딸의 화가 반만 풀렸나 봐요.”
“참 신기한 이야기구나.”
여인은 정이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환하게 웃었다.(12쪽)
정이는 가만히 서서 바라만 보았다. 소달구지에 실린 짐, 최씨 아저씨, 최씨 부인, 그리고 정우까지. 그들의 모습이 덜커덩거리며 점점 멀어졌다.
달구지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정이의 다리가 힘없이 풀렸다. 마당에 주저앉았다. 흙바닥의 냉기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손가락이 떨리고 가슴이 아팠다. 매섭게 부는 바람에 뺨이 시려 왔지만, 뜨거운 눈물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흘렀다.(25쪽)
“저 아이를 당장 멍석말이하거라. 다섯 대만 쳐도 죽을 것이다.”
“아니, 저 아니에요!”
정이가 소리쳤다. 마지막 기대를 담아 복순이를 바라보았지만, 복순이는 정이를 외면했다. 정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 살려 주세요!”
정이의 억울한 외침이 멍석과 함께 말려 들어갔다.
순식간에 시야가 어두워졌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허벅지에 불타는 듯한 고통이 전해졌다. 목이 바짝 마르고 손끝이 싸늘해졌다. 정이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두 번째 퍽 하는 소리에 등은 화끈거리고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온몸이 점점 굳어졌다. 세 번째 매질에 점점 의식이 희미해졌다. 눈꺼풀이 스르르 감겼다.(63쪽)
“그래도 일단 데려가는 게 어때? 여기 있다간 금세 떠내려갈지도 몰라. 왕초가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한댔잖아. 서로 사랑하면서 말이야. 천치님의 뜻이라고 알려 줬잖아.”
“이 바보야! 천치님이 아니고 천주님! 그리고 너! 왕초가 사람 많은 데서 천주님 소리 하지 말랬지. 머리에 돌이 들었냐!”
개똥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 천치든 천주든. 우리 왕초라면 당연히 얘를 데리고 갔을 거라고.”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어. 너 자꾸 내 말 안 들을래?”
“그게 아니고……. 왕초가!”
만이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개똥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나머지 아이들도 떨떠름하게 그 뒤를 따랐다. 정이는 수표교 아래에서 점점 멀어지는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무언가를 결심한 듯 벌떡 일어났다.(78쪽)
“너도 믿을 거야?”
복순이의 목소리에 특별한 감정이 묻어나진 않았다. 장터에서 신기한 물건을 구경할 때처럼, 그저 가벼운 호기심인 듯했다.
정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잘 모르겠어. 여기 오는 사람들 보면 천주학에서는 서로 도우며 착하게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것 같거든. 우리 마님이 나 같은 아이 글공부도 알려 주고……. 그런 거 보면 천주학이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왜 나라에서는 금지하는 걸까?”
복순이가 피식 웃었다.
“못 하게 해서 그래. 하지 말라니까 사람들이 몰래몰래 믿고, 몰래몰래 이 집에 오는 거지. 우리 마님이 양반인 데다가, 남편도 없이 혼자 살고. 게다가 여긴 여인들만 사는 곳이라서 관아에서 함부로 뒤지지 못한대. 그래서 이 집으로 천주학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는 거라더라.”
정이는 말없이 복순이의 말을 곱씹었다. 천주학은 나라에서 금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마님은 다른 어떤 양반보다도 자유로워 보였다. 오히려 거리낌 없이 자신의 신념을 지켜 나갔다. 정이는 그 모습이 우러러보였다.(136쪽)
“정이야, 어떻게 왔니? 다치진 않았니?”
“저는 괜찮아요.”
홍월이 정이의 손목에 묶인 푸른 댕기를 바라봤다. 홍월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정이야. 잘 들어. 그 댕기에 대해 말해 줄게.”
정이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너를 찾으려고 내가 거지골 왕초가 된 거야. 혹시 널, 어디선가 마주칠 수 있을까 싶어서…….”
“설마…… 제 어머니세요?” (19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