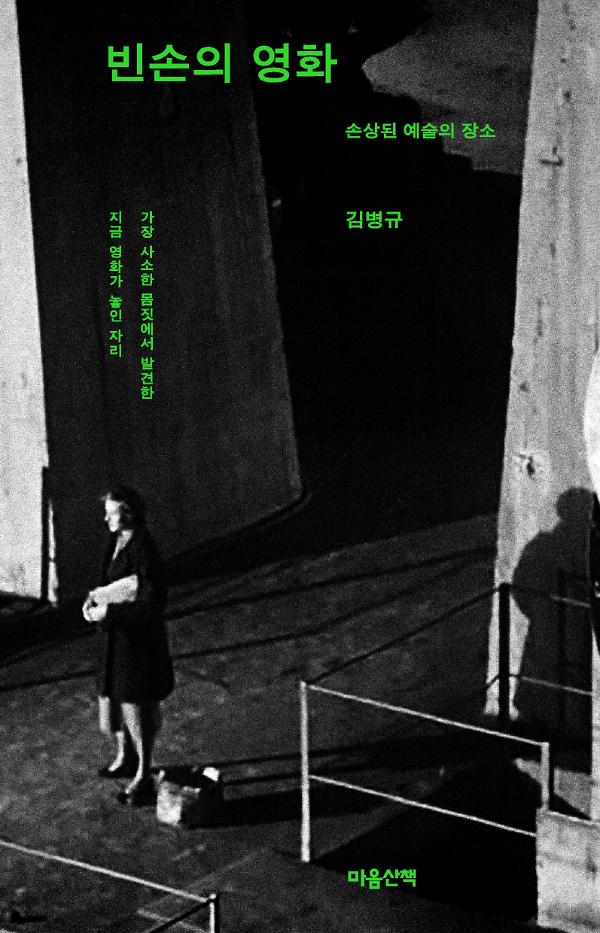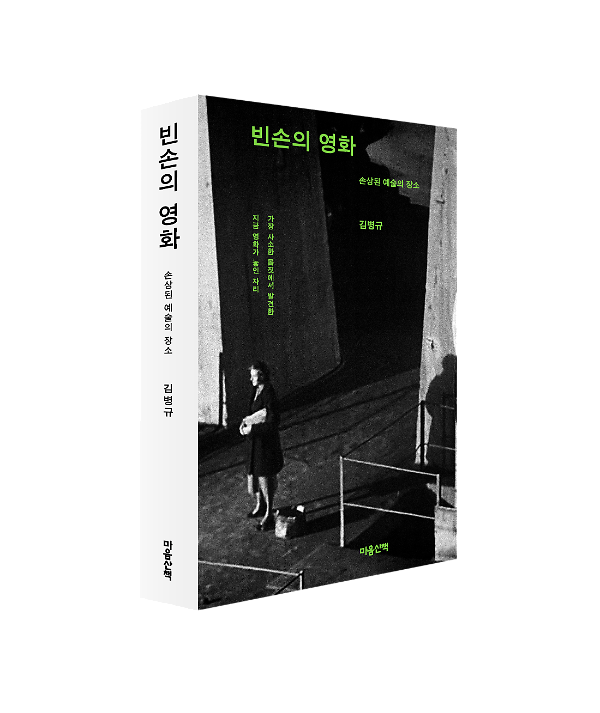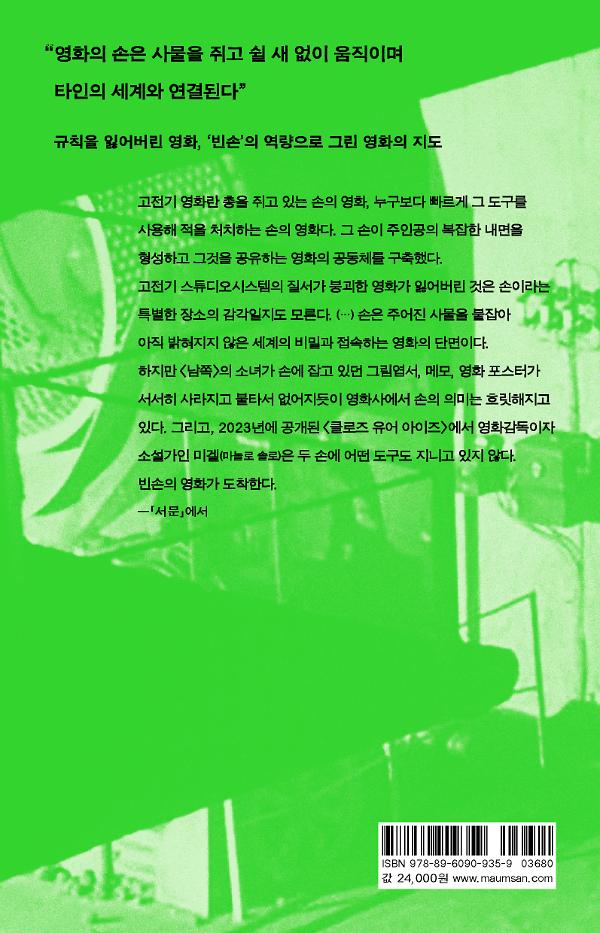〈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강제수용소 중심부에서 20세기 영화의 또 다른 전통적 기억을 깨운다. 그건 홈드라마의 기억이 다. 설정의 구체성을 소거하고 줄거리만 요약한다면, 이 영화는 한 가족이 아버지의 전출로 인해 흩어졌다가 재회하는 20세기적 홈드라마다. 다만 이 문장에서 아버지는 강제수용소의 기획자이고, 가족이 재회하는 장소는 아우슈비츠다.
_38쪽
서치라이트의 빛이 너무 강렬하다면, 온갖 기계장치들의 소음이 너무 과도하다면 리얼리티는 잠식되어버린다. 이것이 아우슈비츠에서 탈출한 두 명의 생존자가 가스실의 존재를 고발했음에도 수용소의 이미지가 우리의 인식에 포착되지 않은 이유이다. 그러므로 리얼리티를 초과하는 결합과 상상이 필요하다.
_72쪽
우리의 삶을 한정 짓는 조건이 우리의 현실을 연장하는 필연적 근거로 거듭난다. 아름다운 순간이다. 이 장면에 카우리스마키가 응시하는 ‘현재’의 시간이 있다.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완료되지 않은 미래로 향하는 그들의 뒷모습에서 그 특별한 시제가 솟아오른다. 이것이 우리가 영화에게서 상속받은 자리, 영화의 시간이 속한 자리다.
_110쪽
그런데 도대체 ‘예술영화’란 무엇을 가리키는 용어일까? 이 글을 쓰는 나도, 읽고 있는 당신도 예술영화가 무슨 뜻으로 쓰이는지 안다. 우리는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예술영화의 의미와 규격을 파악하고 있다. 우리는 예술영화라는 범주에 익숙하고 예술영화의 외양을 구분하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간단히 안다고 말하는 ‘예술영화’는 어떤 영화를 지목하는가?
_131쪽
다르덴 형제는 소외된 자들의 운명을 주시하는 관찰자일 뿐만 아니라 강렬한 신체적 반응의 창조자다. 다르덴의 영화에서 견고한 질서에 저항하는 감정은 단 한 번의 행동이 남기는 세부적 이미지에 깊이 새겨진다. 카메라에 담기는 신체는 영화의 두 주인공을 참혹한 현실로 내모는 현실의 질서가 훼손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일 것이다.
_159쪽
오펜하이머의 손은 나치 독일보다 먼저 원자 폭탄을 개발해야 하는 성찰 없는 속도전에 뛰어들지만, 그의 얼굴은 폭탄의 개발과 투하가 불러오는 여파를 직시한다. 그는 세계의 원리를 통제하려 드는, 그러나 세계가 자신의 통제 바깥에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전형적인 크리스토퍼 놀런 영화의 주인공이자 필름누아르 무대의 눈먼 탐정이다.
_246쪽
〈스파이의 아내〉가 구축하는 긴장은 부부가 꾸미는 비밀 스러운 공모가 발각되는지, 혹은 누가 누구를 밀고했는지 밝혀내는 극적인 서스펜스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구로사와 기요시가 몰두하는 건 내부의 일상적인 공간 위로 외부의 자극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_327쪽
비유컨대 하마구치 류스케의 영화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감염과 그 감염에 대항해 항체를 만들고 신체를 재구성하는 면역이라는 문제와 밀접하게 닿아 있다.
_333쪽
냉소적으로 되묻자면 영화학교, 영화제, 예술영화관, 영화잡지와 비평의 결속으로 채워진 1995년의 체제는 2000년대 이후의 환경에 걸맞은 작가를 발명하는 데 실패한 체제인 것은 아닐까?
_367쪽
지각의 오인에 노출된 박찬욱의 캐릭터들은 제대로 말하고 듣기 위해 수없이 변주되는 목소리(들)로 정체성의 표면을 치장하고 교란하는 또 다른 강박을 생산한다. 목소리는 고정되지 않고 흩어진다. 박찬욱의 인물들은 웅얼거리고 횡설수설하고 했던 말을 다시 하고 앞뒤가 다른 말을 한다. 그들은 화면 바깥에서 영화의 규칙을 조정하는 목소리의 엄격한 장력 앞에서 위태로워진다. 〈헤어질 결심〉에 중대한 과업이 있다면 이는 목소리에 달라붙은 박찬욱의 강박과 위태로움을 노골적으로 폭발시켜 영화에 최면을 거는 작업이다.
_398쪽
홍상수의 교육학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주제와 지식을 건네는 유형의 교육이 아니다. 그는 서로 다른 요소들의 자율적인 결합으로 단 한 번만 만들어질 수 있는 영화의 픽션적 순간을 추출한다. 책방에 들러 수어를 배우고, 우연히 마주친 감독에게 망원경의 작동법을 배우는 순간처럼 반복해서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의 반응과 결과에 홍상수는 주목한다.
_40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