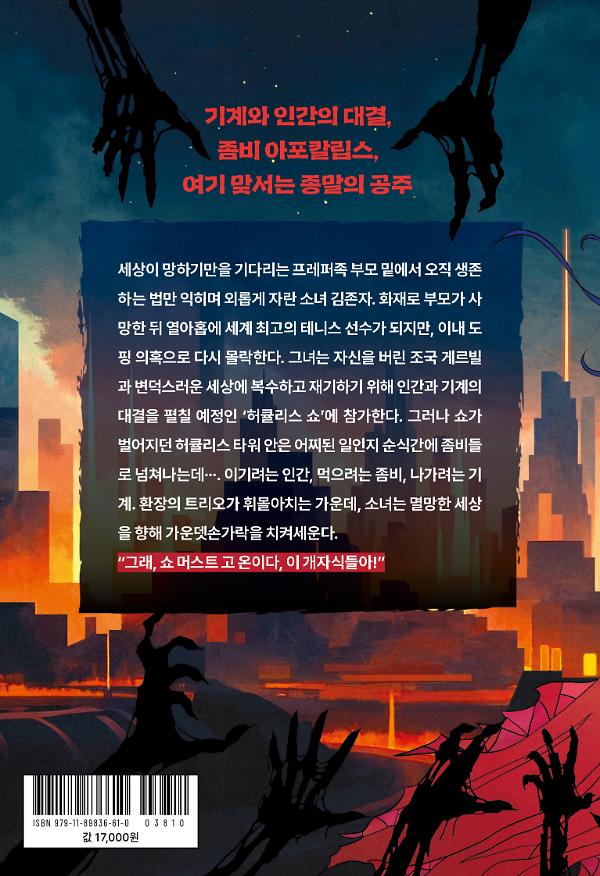내 이름은 김존자였다.
한자로는 있을 존存에 놈 자者. 배우는 작품 따라가고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는 말처럼 사람의 인생도 이름 따라간다고 믿은 걸까. 도대체 내 이름을 왜 그따위로 지은 것인지 부모에게 물어보진 못했으나 이유는 안 들어도 빤했다.
나의 부모는 불온한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신만의 신념이 확고한 사람들이었으니, 아마 자식의 이름으로 존자 외에 다른 이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름이란 게 참 얄궂다. 평생 내가 써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취향에 의해 결정되니까. 아, 취향이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인가. 어쨌든.
--- p.15
손질이 끝난 라켓을 테이블 위에 놓고 그가 가져온 옷과 고글, 이어 커프를 보았다. 특수 제작된 고글과 이어 커프를 차야 하는 이유는 귀가 따갑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 시청자들은 내 시선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걸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건 돈이 되고.
“경기 때만 쓰면 되잖아요.”
“계약서 다시 읽어줘? 경기 시작 24시간 전부터 착용해야 한다니까.”
“저걸 쓰고 화장실을 어떻게 가요?”
“넌 여기서 경주마야. 시청자들은 자신이 돈을 걸 말이 어떤 걸 먹고 몇 번이나 싸는지, 잠은 충분히 잤는지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한다고.”
--- p.82~83
그렇다면 저 바보 같은 기계를 움직일 방법은 계약서 조항에 적힌 매뉴얼대로 하는 것뿐이다. 12시간 동안 12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허큘리스 쇼. 어느덧 시간은 자정이 넘었으니 이제 반을 통과했을 것이다. 과연 그들이 성공할까?
“해킹해서 타워를 개방하는 건? 넌 인공지능이잖아.”
“인간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기계에 한계를 만들었습니다. 오직 규칙이 정해진 놀이터에서만 놀도록. 해킹은 인간들이 정한 규칙에 위배되므로 할 수 없습니다.”
한쪽 눈썹이 위로 찌이익 올라갔다. 안전, 규칙, 놀이터라는 말을 기계에게서 듣자 묘하게 기분이 헝클어졌다.
--- p.178~179
나란 인간의 무기는 믿음, 소망, 사랑 같은 게 아니다.
높은 곳에 자리 잡고 라켓을 힘껏 휘둘러 테니스공을 날렸다. 최고속도 198킬로미터에 달하는 서브를 맞고 머리가 터져서 한 놈이 쓰러졌다. 내 위치에서 사선으로 이어진 곳에 설치된 CCTV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프리미엄 결제를 한 시청자의 시선에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피에 물든 치마 나풀거리는 모습 어때? 핑크빛 브라는 섹시해? 이제 만족스럽냐고 벌건 눈으로 네모난 기계에 코를 박고 있을 인간들 멱살을 틀어쥐고 묻고 싶었다.
--- p.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