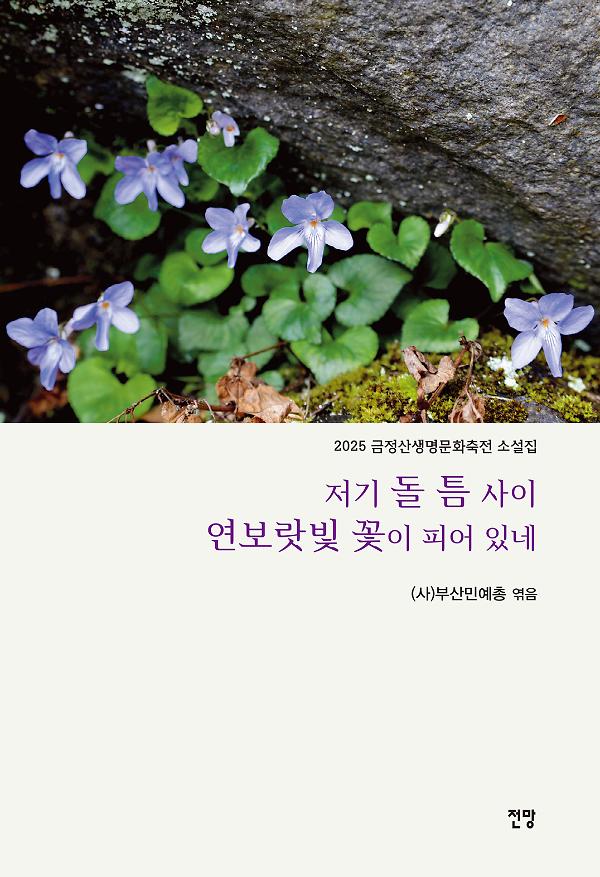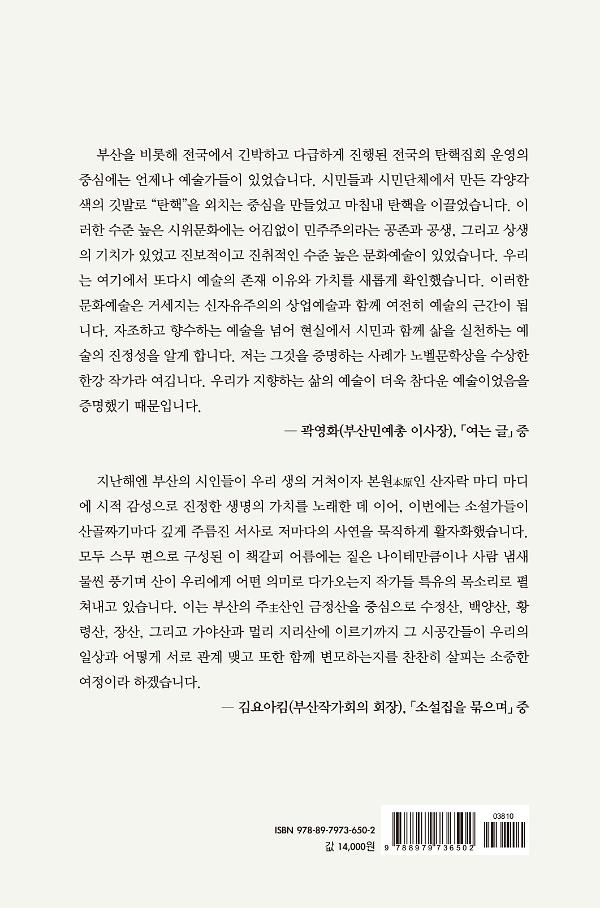진우 선배는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왔다. 시계를 보니 여섯 시였다. 일주일 전, 그와 나는 그곳에 가야 한다는 묵계를 확인했다. 오늘은 용하의 기일이었다. 그곳은 8부 능선 길과 억새밭, 촛대바위들이 푸른 녹음 사이로 펼쳐진 장산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장산의 숲속에 있는 어느 작은 돌탑이었다.
그와 만나기로 한 장산 입구로 가보니 구름 사이로 붉은 여명이 진진하게 퍼져 있었다. 기온은 등반하기에 적당한 날씨였다. 진우는 일찌감치 도착했는지 은린처럼 반짝이는 저수지를 지긋이 응시하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엷은 미소를 저수지에 남겨둔 채 천천히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오늘 우리는 장산에서 간비오산으로 향하는 여정을 밟을 것이다. 장산과 간비오산은 부산의 삼대 산맥 중 하나인 금련 산맥의 줄기이다. 이곳을 따라가면 동해와 남해의 코발트 물결을 만나게 된다. 또한 은은하게 흐르는 갯냄새의 여운을 만날 수 있다. 덩달아 용하의 여운도 느낄 수 있다.
진우와 나는 장산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뎠다. 안적사로 향하는 길에는 조그마한 계곡이 하나 놓여 있었다. 계곡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너무 작은 곳이었다. 그러나 그 계곡에 흐르는 물은 너무 맑았다. 그와 나는 말없이 걷기 시작했다. 멀리 돌탑 군락이 가까워졌다. 사실, 나는 이곳에 오기 싫었다. 두 번 다시 이곳으로 오지 않으리라 결심했었다. 먼 후일, 용하에 대한 기억이 아련해질 즈음에 찾아올 생각이었다.
돌탑 군락지에 도착한 진우는 버릇처럼 가장 작은 돌탑에 돌을 하나 얹었다. 원뿔 모양으로 정교하게 세워진 돌탑들은 그런 진우를 조용히 응시했다. 이 깊은 산중에 누가 이렇게 많은 돌탑을 쌓았을까? 그는 배낭에서 막걸리를 꺼내 코펠에 가득 부었다. 우윳빛의 막걸리 사이로 돌탑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맺혀 있었다. 진우는 그 막걸리를 돌탑 뒤의 편편한 공간에 조금씩 뿌리면서 소나무가 우거진 숲속으로 조금씩 들어갔다.
키 작은 소나무들이 있는 곳까지 간 진우는 잡초를 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잡초를 거의 뽑을 즈음, 우리를 맞이하는 동판이 보였다. 동판에는 푸른 녹이 조금 피어 있다. 풍우에 시달리긴 했지만, 동판은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진우는 담배 하나에 불을 붙인 후, 동판에 새겨진 어떤 글자 위에 그것을 조심스레 놓았다. 비어 있는 존재, ‘박용하’였다.
용하의 왼 손목은 없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손목이 없어진 그 자리에는 허연 표피가 피었다. 그 표피에는 말라버린 국화 꽃잎, 허리가 꺾여 흐트러진 개미들, 그리고 가을 뱀의 허물들이 묻어 있었다. 스무 살이 되던 해, 공장에서 프레스에 찍혀 잘렸다며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나에게 말해주었다. 나는 그의 손목을 볼 때마다 그저 씁쓸한 마음으로 술을 따라주었을 뿐이었다.
내가 용하와 진우를 처음 만난 곳은 민주청년회라는 진보적인 청년 단체였다. 그래서 다양한 동아리반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진우는 나와 용하, 그리고 여타 몇 명을 묶어서 등산반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등산반의 명칭은 ‘원두막’이었다. 원두막처럼 누구나 올 수 있다는 의미였다.
통도사 영취산을 등반하고 사무실 근처 막걸리집에서 회포를 풀던 어느 날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등반 도중에 일어났던 갖가지 에피소드들을 말하며 모두 행복해했다. 어느새 밖에는 안개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었다. 몇 순배 술잔이 돌아가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갑자기 용하가 벌떡 일어났다.
“뭐야, 이런 짓이. 그래 우리가 이따위 놀음이나 해서 되겠어?”
갑자기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모두 어안이 벙벙한 채로 용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용하의 그런 소리에 무엇보다 가장 놀란 사람은 진우였다. 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갔다. 사실 그동안 등산반 운영을 둘러싸고 진우와 용하는 간간이 충돌했다.
청년회 교육위원인 용하는 등산반원을 정치 교육의 장으로 빨리 데려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반장인 진우는 아직 반원들의 정치 의식이 성숙하지 않았으니 천천히 하자는 입장이었다. 나 역시 진우의 의견에 동조하는 편이었지만 용하의 의도를 모르는 바도 아니었다. 그래서 용하와 진우의 대립을 그저 멀거니 구경만 해야 했다.
급기야 진우와 용하는 말싸움을 벌이고 말았다. 이미 용하는 취한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서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용하를 견디다 못해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덩달아 회포 자리는 파장이 나고 말았다. 나는 진우를 따라 급히 뛰어갔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리를 떠났다. 술집을 나서며 흘깃 돌아보니 용하와 수철이 묵묵히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평소에도 늘 붙어 다니던 두 사람이었다.
나는 진우를 붙잡아 가로등 밑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우는 용하를 욕하진 않았다. 다만 안타깝다는 말을 반복했다. 사실 등산반뿐만 아니라 회원 모두 용하에 대한 감정은 안타까움이었다. 계모 밑에서 온갖 학대를 받으며 자란 용하였다.
그 몇 시간 후였다. 갑자기 용하의 죽음이 너무나도 어이없게 다가왔다. 용하와 수철은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기 위해 청년회 사무실로 갔다고 했다. 사무실 문이 잠겨 있었고 용하는 손에 닿을 듯 가까운 그 창문을 열기 위해, 사 층에 매달린 그 창문을 향해, 그 비어 있는 손으로 창문 턱을 붙잡고 넘어가려고 했다. 결국 보도블록 위로 추락하고 말았다.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고 그의 유골은 나무 상자에 담겨 장산으로 향했다. 누군가의 제안으로 그를 기념하는 동판을 만들어 그의 유골이 뿌려진 곳에 묻기로 했다. 회원들은 그것을 ‘시지프스의 동판’이라고 불렀다.
동판을 매만진 진우는 막걸리를 한 잔 따라서 동판 주위에 뿌렸다. 나와 진우가 장산을 내려오는 동안, 삼월의 날씨에 어울리지 않게 진눈깨비가 내렸다.
―김대갑, 「시지프스의 동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