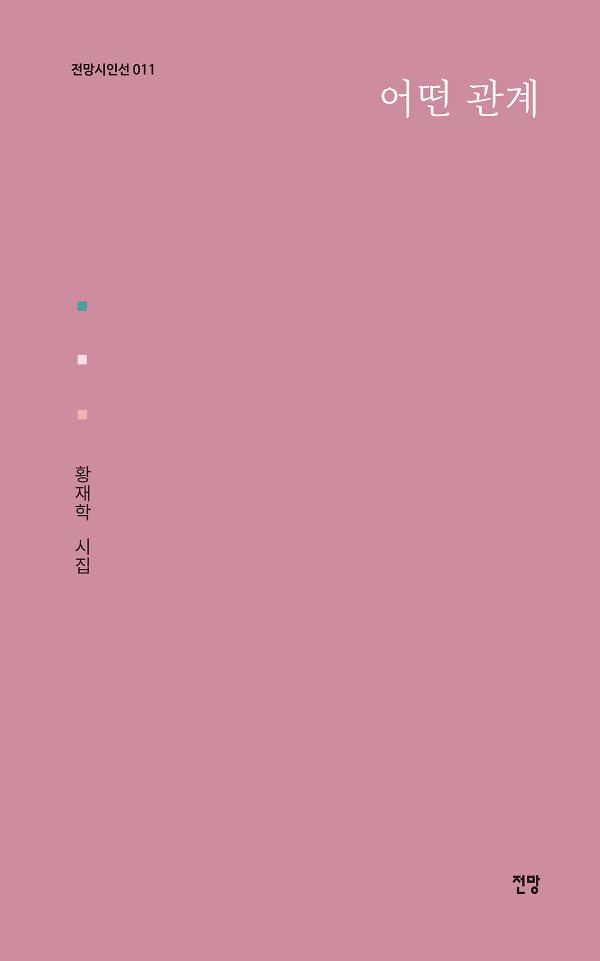봄날 들녘 물들이는 연두빛일랑 다 줘버리고 허리 꼬며 아른대는 아지랑이만 남겨두자
봄날 종달새 날아오르는 파란 하늘일랑 다 줘버리고 저기 떠다니는 흰 구름만 남겨두자
봄날 환하게 핀 연분홍 살구꽃일랑 다 줘버리고 잉잉대며 날아오르는 벌 소리만 남겨두자
봄날 파릇파릇 돋아나는 보고 싶은 마음일랑 다 줘버리고 오직 한 점 외로움만 남겨두자
―「봄날」
봄날 아침 산 너머 들리는 아련한 뻐꾸기 울음 같다야
소나기 한바탕 퍼부은 뒤 마당가에 피어나는 흙내음 같다야
까마귀 떼 날아오르는 서리 내린 텅 빈 들녘 같다야
문고리 손에 쩍쩍 달라붙는 시린 겨울 아침 같다야
―「지난 날」
물이 고인 곳이라면 어디라도 좋다. 웅덩이도 좋고 둠벙도 좋고 비온 뒤 소가 밟아 움푹 패인 곳이라도 좋다. 가느다랗고 길다란 다리로 물 위를 총총 걸어 다니는 소금쟁이. 바람 불어도 비가 내려도 건중건중 우쭐우쭐 물에 빠지지도 않고 잘도 걸어 다닌다. 마음 비웠나 물 위에 내려앉은 가랑잎처럼, 물 위에 얼비치는 흰 구름처럼
―「소금쟁이」
여름 지나 담 밑에 주황빛 꽈리. 끝이 뾰쪽한 세모난 주머니엔 갓 시집온 색시처럼 다소곳이 얼굴 붉히고 있는 동그란 꽈리. 꼭지를 똑 따내고 고추씨 보다 작고 노르스름한 씨를 빼내어 입에 넣고 살짝 깨물면 꽉꽉 오리 우는 소리가 났다. 다른 애들은 연신 잘도 부는 데 나는 어쩌다 한번 꽉꽉 소리가 났다. 여자 애들 얼굴만 봐도 괜히 얼굴이 달아오르던 때다.
―「꽈리」
친구 따라 냇가에서 물장구치다 싫증나면 둑방에서 게를 잡았다. 게구멍에 팔뚝까지 손을 집어넣으면 누가 팔을 잡아당기는 것 같기도 했다. 한번은 게구멍에 손 넣고 더듬다 갑자기 서늘하고 물큰한 게 만져져 깜짝 놀라 물 밖으로 뛰어나와 파란 하늘을 보며 숨을 고르기도 했다. 하늘가엔 뭉게구름 뭉게뭉게 피어나고 불현듯 나의 전생이 궁금해졌다.
―「그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