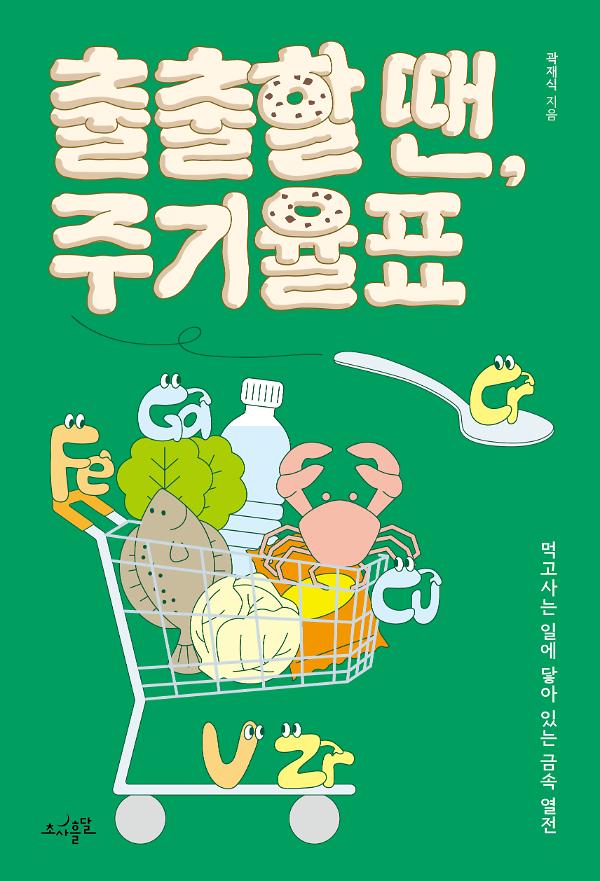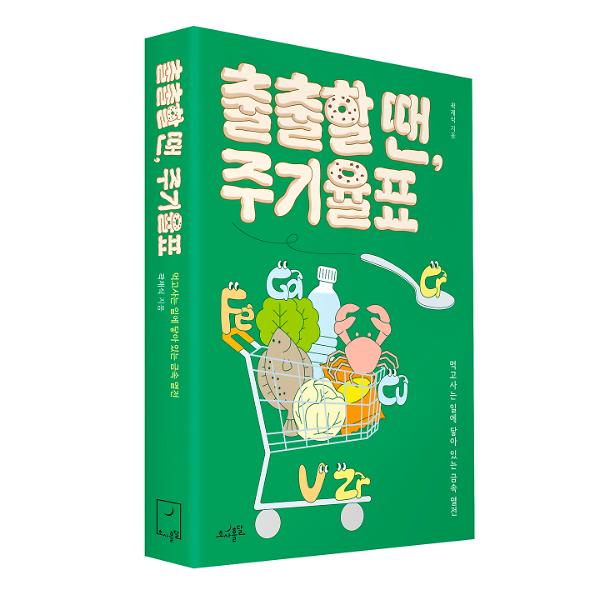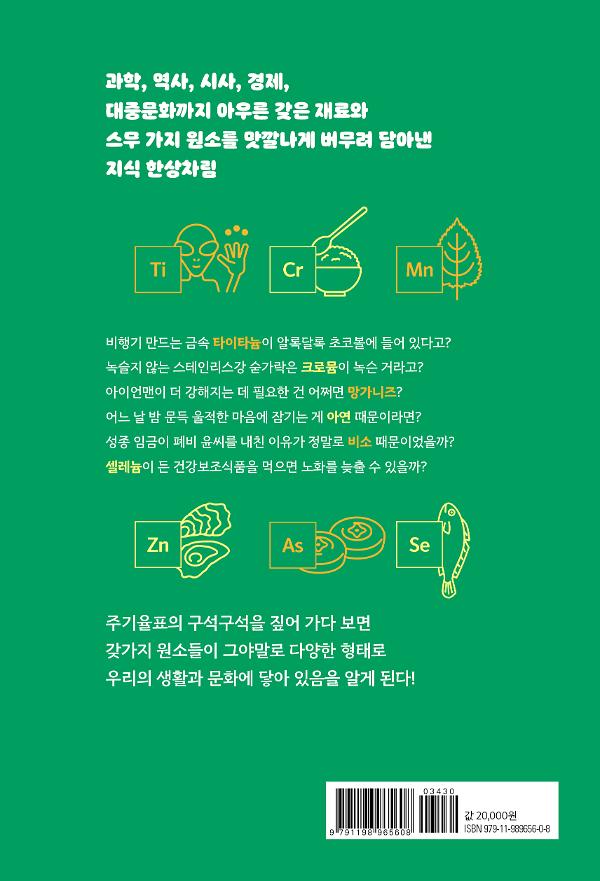매연 속에서 이산화황을 계속 빼낸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버릴 곳도 마땅치 않은 오염 물질이 점점 쌓이게 된다. 이 많은 이산화황을 어쩌면 좋을까? 이럴 때, 모아 놓은 이산화황에 오산화바나듐을 넣어 화학반응을 일으키면 황산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만든 황산 또는 이산화황 계통의 성분을 빼내고 남은 물질은 그 물질이 필요한 곳에 돈을 받고 팔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기 오염을 막기 위해 억지로 제거해야 했던 골칫거리이자 비용일 뿐이었던 이산화황을 오산화바나듐을 이용해 가치 있는 제품으로 바꾸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나는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득으로 연결되는 길을 찾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산화바나듐을 사용하는 기술처럼 환경 보호 활동을 이득과 연결해 놓으면 그때부터는 정부에서 강제로 시키고 단속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스스로 나서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면서 이익도 얻는 것을 나는 “꿩 먹고 알 먹고 방법”이라고 부르는데, 바나듐은 바 로 꿩 먹고 알 먹고 방법 중에서도 대표로 내세울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산성비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 데도 바나듐의 역할이 작지 않았다. - 〈23 바나듐: 생수 맛을 음미하며〉 중에서
태양이 뜨겁게 빛나는 것도 태양 속에서 핵융합 현상이 일어나서 수소라는 원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핵융합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면 그만큼 주변이 더 뜨거워진다. 주변의 압력도 더 높아진다. 그래서 한 번 핵융합이 일어나면 그 열 때문에 주변에서 또 핵융합이 이루어진다. 주변에서 핵융합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또 그만큼 열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그 때문에 다시 그 주위에서 핵융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핵융합은 한 번 일어나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별 속에서는 이런 일이 수 억 년, 수십억 년 동안 이어진다. 그러면서 한 원소가 다른 원소와 합쳐지면서 새로운 원소들이 계속 만들어진다.
그런데 여기에 단 한 가지 이상한 걸림돌 같은 현상이 있다. 그게 바로 철이다. 원소들이 뭉쳐서 새로운 원소들이 생겨나다가 철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철은 거기에 무슨 다른 원소를 억지로 갖다 붙여 핵융합을 일으키려 해도, 다른 원소들의 핵융합이 일어날 때만큼 열을 내뿜지 않는다. 도리어 주변을 더 차갑게 식힌다. 따라서 일단 철이 생겨나면, 핵융합으로 발생한 열이 연달아 핵융합을 일으키는 현상이 더는 이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철은 별이 핵융합으로 빛을 내면서 여러 원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며 열의 연결 고리를 끊는 물질이다. 별의 잿더미가 철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 〈26 철: 도다리쑥국을 기다리며〉 중에서
그렇다고 사람 몸속에서 구리가 아무 쓸모 없는 것은 아니다. 극히 적은 양이지만 인체에서 구리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몇몇 효소들이 있다. 그러므로 구리 성분이 든 음식을 전혀 먹지 않으면 분명히 몸에 무슨 탈이 날 것이 고, 그 정도로 구리가 아주 부족한 상황이라면 구리를 보충해 주어야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보통은 여러 음식에 들어 있는 아주 약간의 구리만으로도 사람 몸에 필요한 정도는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다. 간장게장처럼 구리가 많이 든 편에 속하는 해산물을 어느 정도 먹으면 몸에 필요한 양을 더 쉽게 채울 수도 있다.
하지만 구리 공장에서 나온 폐수 같은 것을 벌컥벌컥 마시거나 하면 몸에 구리가 지나치게 많이 쌓여서 오히려 병이 든다. 특히 간에 구리 성분이 많이 쌓이면 제 역할을 못 하게 돼서 몸 곳곳이 병드는 사례도 알려져 있다. 한국인에게 가끔 나타나는 사례로는 윌슨병이 있다. 희소병이기는 하지만 간에 나타나는 질환 중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한국인에게 사례가 많은 편이어서, 한국인 수만 명당 한 사람 정도는 이 병이 있다고 한다. 윌슨병은 유전성 질병으로, 타고난 체질이 구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생긴다. 사람이 음식물 등으로 구리를 먹었을 때, 몸에서 필요한 만큼은 사용하고 나머지는 노폐물로 배출하는데, 체질 이상으로 구리가 몸의 엉뚱한 곳에 조금씩 쌓이다 보면 윌슨병이 된다. - 〈29 구리: 꽃게를 손질하며〉 중에서
브로마이드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 원래 브로마이드는 브로민을 이용해 만든 화학물질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다. 대체로 브로민을 이용해 산화 반응이라는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만든 물질에 이런 이름을 자주 붙인다. 예를 들어 하이드로젠 브로마이드라고 하면 수소와 브로민을 이용해 만든 산성 물질을 말한다. 여기까지 알고 나면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브로마이드를 준다고 하는 잡지를 샀을 때 브로민으로 만든 화학물질이 담긴 약병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왜 이런 말을 커다란 연예인 사진이라는 뜻으로 쓰게 된 걸까?
그 까닭은 브로민이 화학반응을 잘 일으키는 성질을 이용해 빛에 잘 반응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사진을 만드는 데 활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은과 브로민을 이용해 만든 실버브로마이드, 즉 브로민화은은 과거에 사진을 만들 때 굉장히 널리 사용하던 물질이다.
지금은 대부분 반도체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카메라,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곧바로 화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사진 촬영용 필름에 사진이 담기게 하고, 그 필름에 담긴 사진을 다시 종이에 나타내는 인화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사진을 볼 수 있었다. 이때 여러 가지 화학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깨끗하고 보기 좋은 사진이 나왔다.
그러다 보니 사진을 만드는 사람 중에 몇몇이 고급 사진을 만들 때 성능 좋은 특별한 브로마이드 물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브로마이드라는 말 자체가 그런 좋은 물질을 사용해 만든 고급 사진이라는 뜻으로 얼렁뚱땅 변해 버린 것이다. - 〈35 브로민: 어묵탕을 끓이며〉 중에서
온도가 1,200℃에 가까워지자 지르코늄이 물과 반응해 수소를 만들어 내는 엉뚱한 성질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금은 물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반응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높은 온도라는 조건이 갖춰지자 지르코늄은 아무도 바라지 않는 수소 생성 반응을 시작한 것이다. 원자로 안에 있던 물과 수증기는 지르코늄 때문에 산소와 수소로 분해되기 시작했다. 연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수소야말로 지구를 구할 깨끗한 물질이지만,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는 원자로 내부에서 수소가 풀풀 피어오르면 이것은 골칫거리만 된다. 심지어 지르코늄은 물에서 수소를 뽑아내면서 열도 내뿜기 때문에, 원자로 안의 온도는 더욱더 올라갔다.
평상시 안전을 위한 방어 판 같은 용도로 넣어 두었던 지르코늄이 이런 비상 상황에서 오히려 수소라는 불쏘시개를 잔뜩 만들어 낸 셈이다. 수소가 좋은 연료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불이 잘 붙는 물질이라는 뜻이다. 결국, 수소는 불이 붙어 폭발을 일으켰다. 원자력발전소의 장비들이 박살 났고 걷잡을 수 없이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했다. 얼마 후 원자로 안에 있던 방사성 물질들이 주변으로 튀어나오게 되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는 일반인이 살 수 없게 되었고, 어마어마한 양의 물에 방사성 물질이 섞여 오염수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원자력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만약의 경우 원자로 안에서 이렇게 수소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보다 더 치밀하게 연구하게 되었다. 맹물로 가는 자동차, 청정에너지 수소, 신비의 촉매 기술은 이렇게 무서운 사고와도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과학의 원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선과 악의 양쪽에 동시에 걸쳐 있는 것이 많다. - 〈40 지르코늄: 과자 봉지를 뜯으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