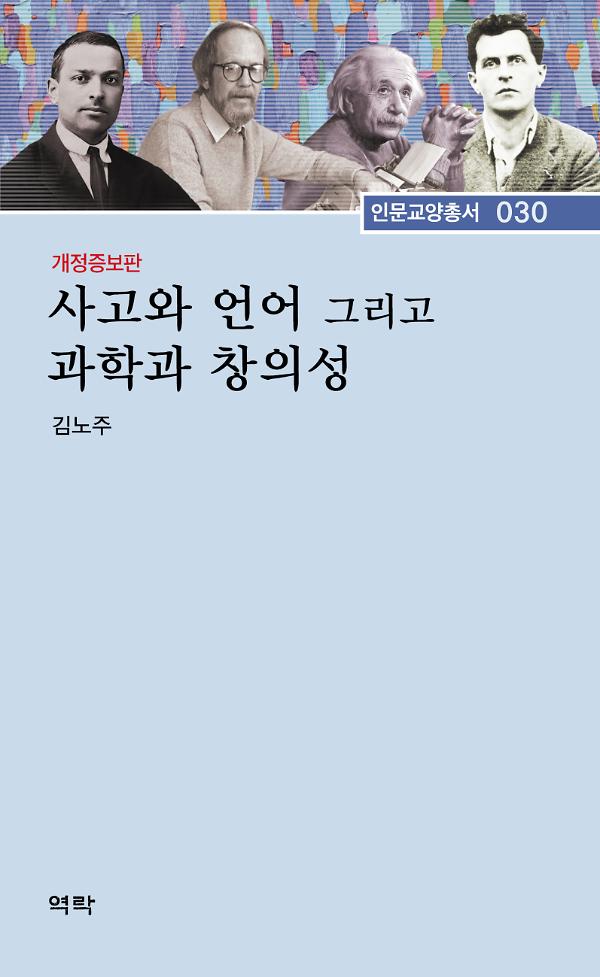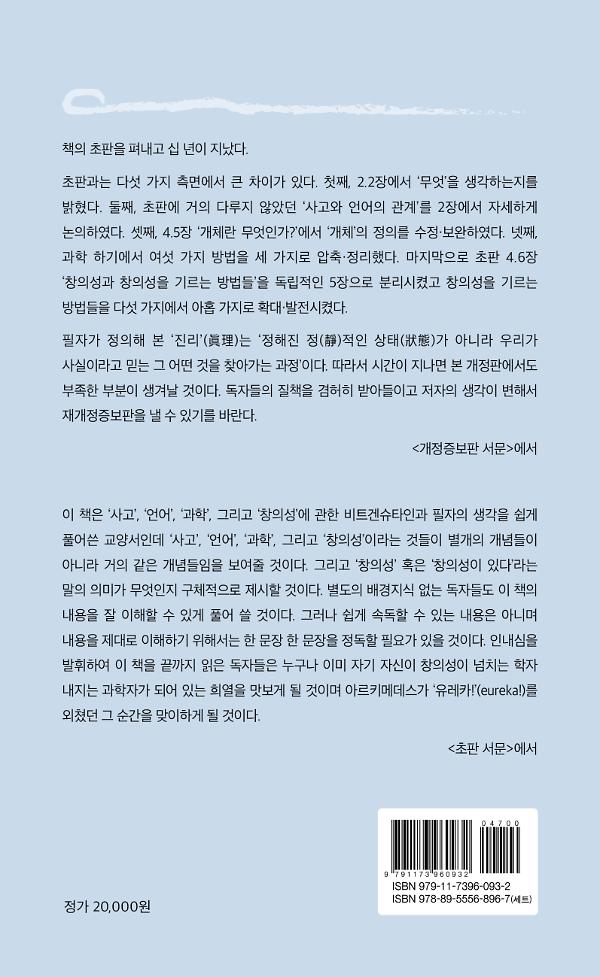‘창의성’ 함양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창의성’ 혹은 ‘창의성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한 채 막연하게 혹은 맹목적으로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의성 함양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유와 원리를 무시한 채 선생님들은 지식 붓기에 여념이 없고 학생들은 지식 쌓기에 밤낮을 설치고 있다. 그래서 몇 문제를 더 맞힌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운명은 갈라지고 전자들은 소위 일류대 출신이라는 프리미엄을 평생 양어깨에 견장으로 붙이고 살지만, 후자들은 일류대 출신이 아니라는 주홍 글자를 목에 걸고 살아야 한다.
이 책은 ‘사고’, ‘언어’, ‘과학’, 그리고 ‘창의성’에 관한 비트겐슈타인과 필자의 생각을 쉽게 풀어쓴 교양서인데 ‘사고’, ‘언어’, ‘과학’, 그리고 ‘창의성’이라는 것들이 별개의 개념들이 아니라 거의 같은 개념들임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창의성’ 혹은 ‘창의성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별도의 배경지식 없는 독자들도 이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풀어 쓸 것이다. 그러나 쉽게 속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정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내심을 발휘하여 이 책을 끝까지 읽은 독자들은 누구나 이미 자기 자신이 창의성이 넘치는 학자 내지는 과학자가 되어 있는 희열을 맛보게 될 것이며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eureka!)를 외쳤던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초판과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첫째, 2.2장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밝혔다. 우리는 이름이 없는 어떤 것에는 이름을 지어 개체화하고, 개체는 그 속성을, 개체 간에는 그 관계를 생각한다. 이전의 어떤 연구도 이점을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았고 막연하게 생각의 중요성만 강조해 왔다.
둘째, 초판에 거의 다루지 않았던 ‘사고와 언어의 관계’를 2장에서 자세하게 논의하였다. 사고와 언어의 관계에 관한 주된 연구서인 Sapir(1929), Whorf(1956), Piaget(1950, 1967), Chomsky(1957, 1959, 1965), Vygotsky(1962)와 Wittgenstein(1922)의 견해를 비교하고 장단점을 밝혔으며 이 책의 견해도 밝혔다.
셋째, 4.5장 ‘개체란 무엇인가?’에서 ‘개체’의 정의를 수정·보완하였다. ‘개체’(entities)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 중에서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이름 명’(名)이라는 자구(字句)에 현혹되어 명사 또는 명사구만이 이름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든 용어가 개체의 이름이며 개체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 명사나 명사구로 이름이 붙여진 ‘대상들’(objects), 형용사, 자동사, 부사 그리고 보어로 쓰인 명사구로 이름이 붙여진 ‘속성들’(properties), 그리고 타동사로 이름이 붙여진 ‘관계들’(relationships)이 있다. 대상들과 속성들 속에도 각각 세 종류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이해하는 데 개체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4.5장에 각별한 주의를 쏟아 주길 바란다.
넷째, 과학 하기에서 여섯 가지 방법을 세 가지로 압축․정리했다. 과학은 주어진 분야에서 새로운 것(대상, 속성, 관계)을 찾아 이름을 지어 개체화하고, 개체의 이름인 용어를 정리하는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초판 4.6장 ‘창의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들’을 독립적인 5장으로 분리시켰고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들을 다섯 가지에서 아홉 가지로 확대․발전시켰다. ① 자신이 사용하는 용어 정리하기, ② 의의(意義, sense)만 지닌 용어 정리하기, ③ 비사실적 사고(창의, 상상 및 공상)의 중요성 인정하기, ④ 기초에 충실하기, ⑤ 교수와 학생에 대한 바른 관(觀) 갖기, ⑥ 진리 탐구에 대한 바른 관(觀) 갖기, ⑦ 소극적 깨달음이 아닌 적극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 ⑧ 끊임없이 생각하고 세상에 알리기, 마지막으로 ⑨ 메타 자아 활용하기가 이 책이 권장하는 아홉 가지이다.
필자가 정의해 본 ‘진리’(眞理)는 ‘정해진 정(靜)적인 상태(狀態)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그 어떤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본 개정판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생겨날 것이다. 독자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자의 생각이 변해서 재개정판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