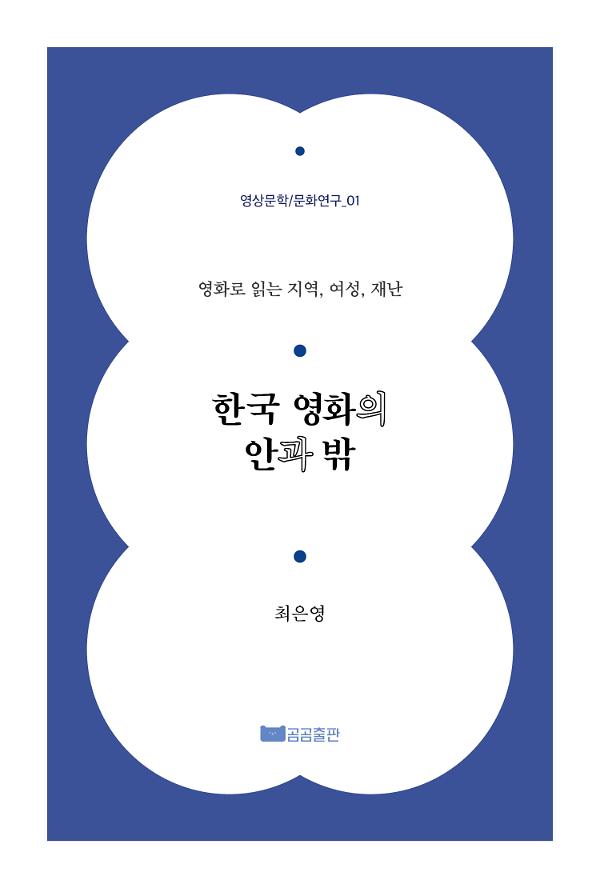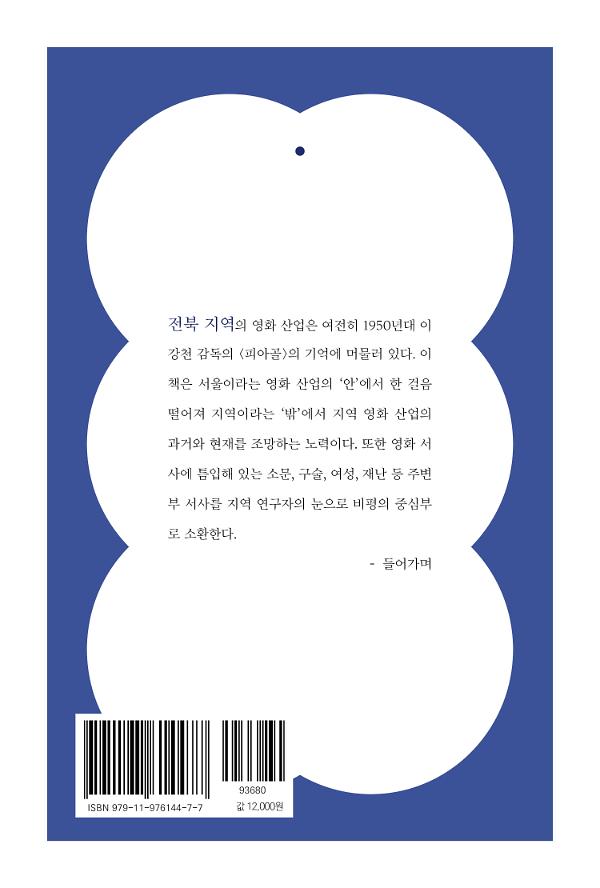한국 전쟁 중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공연이 열리는 전주에 영화인들이 모여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5쪽.
전주는 이제 ‘영화의 도시’가 아니라, ‘영화를 촬영하기 편한 도시’이고, 영화제는 지역축제가 아닌 ‘국제 행사’로 그 성격이 점차 변하고 있다. -23-24쪽.
이강천 감독의 〈피아골〉(1955)과 〈격퇴: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는 6.25 전쟁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던 빨치산과 국군의 실상을 보여주는 이중 거울과 같다. -46쪽.
여성 감독 홍은원은 젠더화된 분업에서 벗어나지 못한 1960년대 영화계에서 한국 최초의 여성 판사를 소재로 〈여판사〉를 만들면서 이 문제를 풍자와 조롱이 아닌 공적 담론으로 이끌어 냈다. 이는 공적인 영역에 진출한 한 여성의 죽음을 개인이 겪는 갈등으로 축소시켜 대중의 흥밋거리로 만든 신문 기사와는 다르다. -75쪽.
내 어머니 이야기와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는 ‘구술자-어머니’, ‘면담자-딸’이라는 다층적인 역할에서 구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동 기억과 개별 기억을 구술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현재로 소환한다. 이 때문에 모녀 관계에서 진행되는 구술은 어머니와 딸이라는 세대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작업이다. -106쪽.
영화 〈서복〉과 〈정이〉는 오히려 비인간 주체인 복제 인간과 사이보그에게도 ‘인간다움’을 환기시킨다. (중략) 이처럼 한국 영화에 등장한 포스트휴먼은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재형상화하고 재신체화하는 과정에 머물러 있다. -125쪽.
영화 〈카우〉와 〈당나귀 EO〉는 인간의 시점과 동물의 시점을 오가며 인간이 끊어버린 실을 연결하고 패턴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성실한 자세로 실을 끊지 않고 실뜨기 릴레이를 지속할 때, 세계는 공진할 수 있다. -13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