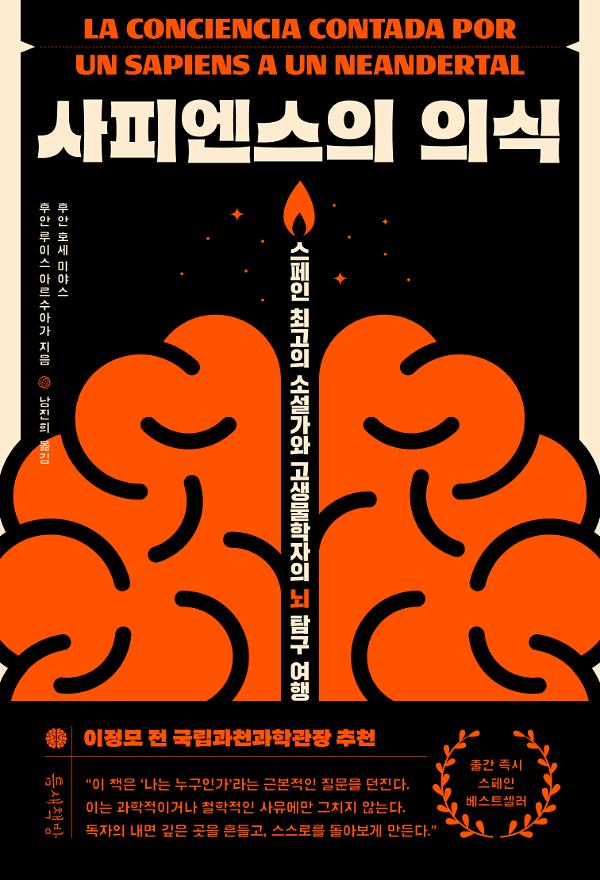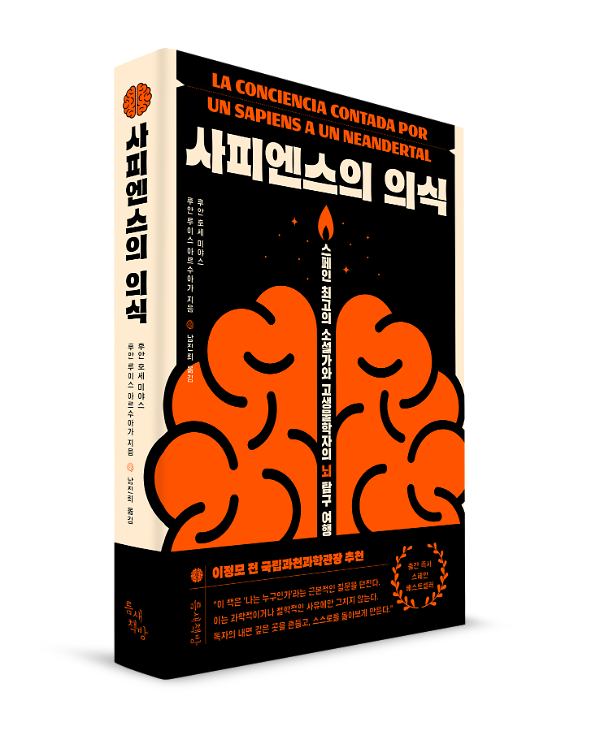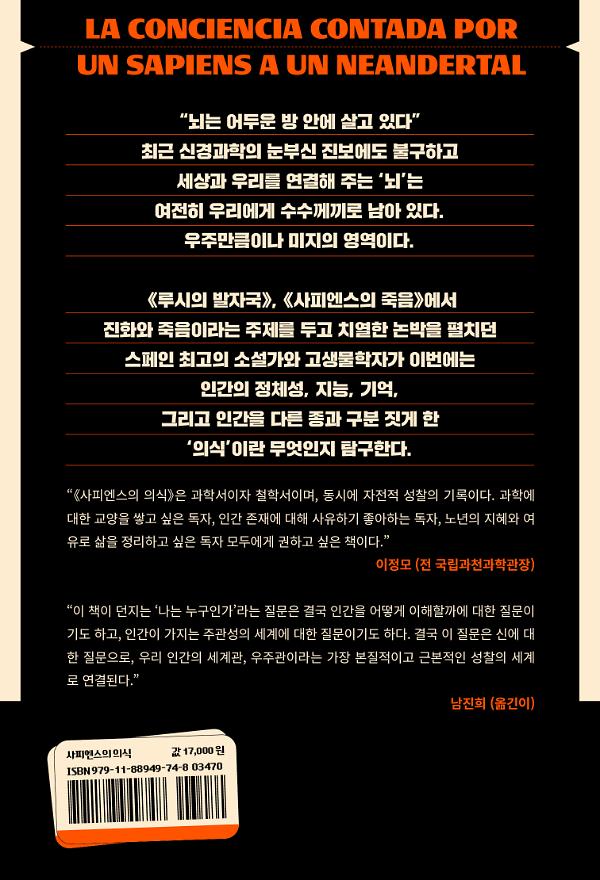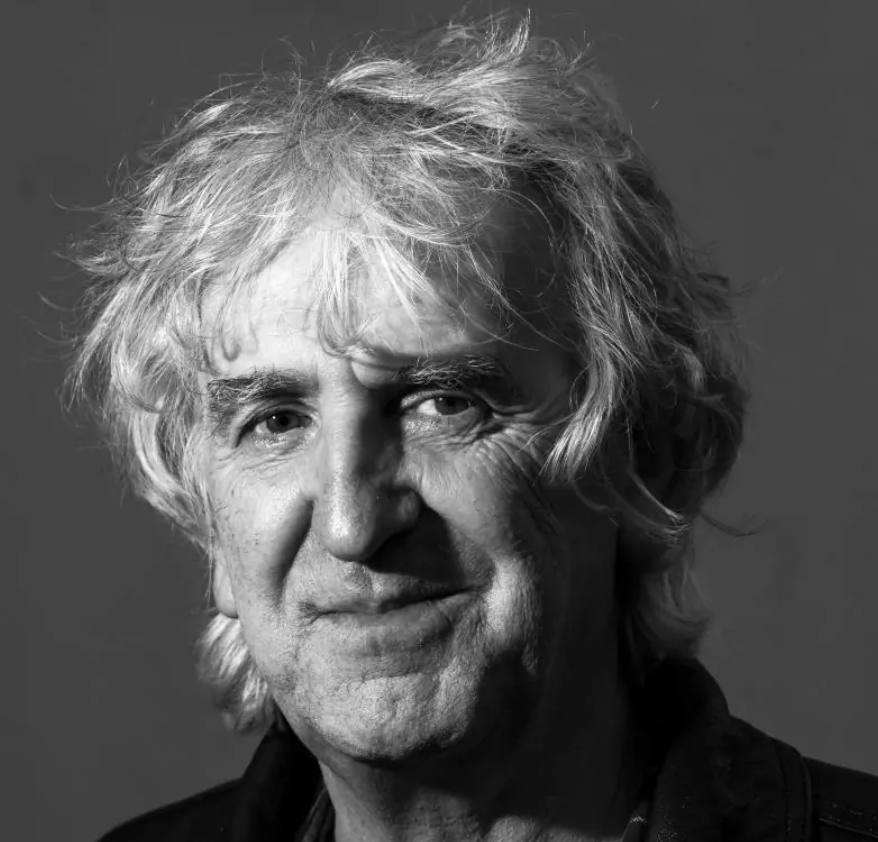“후각은 아주 특별한 감각이에요. 다른 감각들과는 달리 감정을 유발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죠. 이는 냄새가 중개 역할을 하는 수용체 없이 직접 뉴런, 즉 우리가 뇌라고도 하는 뉴런까지 바로 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후각 자체가 바로 뇌인 셈이네요?”
_0. 뇌
“라플라스의 악마 역시 알고리즘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거예요. 라플라스의 악마가 알고리즘인 셈이니까요. 우리의 인식 밖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 인해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선생님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_1. 이미 쓰여 있다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프로그램에 종속되어 있을까요? 만일 뇌가 일종의 기계라면 의식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반대로, 컴퓨터가 뇌와 똑같다면 컴퓨터도 언젠가는 의식을 갖게 될까요? 혹 지금도 의식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뇌와 정신과 관련해서 쌓아 올리고자 하는 모든 것은 아날로그적인 세계와 디지털적인 세계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서 비롯될 거예요. 바로 거기에 출발점이 있는 거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문학이 되어 버릴 거고요.
_2. 먼저 요새를 포위하자
그런데 뇌는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을까? 눈은 스스로를 지켜볼 수 있을까? 이 모든 것과 애매한 관계를 맺고 있긴 하지만, 문득 이름도 잊어버린 한 신비주의자의 수수께끼와 같은 말이 떠올랐다. ‘내가 신을 보고 있는 눈이 바로 신이 나를 보고 있는 눈이기도 하다.’ 내가 세상을 생각할 수 있게 해 주는 뇌는 세상이 나를 생각할 수 있게 해 주는 뇌와 같은 것일까?
_3. 악어
“뇌는 두개골이라는 검은 상자 안에 갇혀 있어요. 검다고 한 것은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인데, 물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뇌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냄새도 맡을 수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죠. 영미권의 신경철학자들은 널리 알려진 사고 실험을 지칭하기 위해 이를 ‘플라스크 혹은 네모난 그릇에 들어 있는 뇌’라는 의미에서 ‘brain in a vat’라고 불러요.”
_6. 누구도 완벽하진 않다
“주관성은 적응과는 관련이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가정용 진공청소기인 룸바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자 회로에 완벽하게 지도화된 온 집안을 다 청소하죠. 그리고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 스테이션으로 돌아가 스스로 충전을 하죠. 그런데 배가 고팠을까요? 자동으로 충전을 하기 위해 로봇 청소기가 배고픈 것을 느껴야만 할까요?”
“아뇨.”
“그럼 왜 우리는 그렇죠? 왜 우리는 먹기 위해선 배고픔을 느껴야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의심이 일었다.
_10. 실존의 위기
“포르투갈의 신경과학자인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컴퓨터는 몸이 없어서 의식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즉 지금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말할 수 없고, 또 터놓을 수도 없어서 말이에요. 요약하자면 ‘내장’이 사람의 ‘의식’을 만들어요. 우리가 ‘몸’이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데카르트가 착각한 거죠.”
_11. 축제의 끝
“갑자기 바뤼흐 스피노자가 서구의 지성계에 나타나 모든 것을 바꿔 놓았어요. 신은 시계공도 아니고, 기계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라고 했어요. 신이 기계라는 거죠. 선생님이 본 모든 것이 신이에요. 게다가 선생님과 나도 마찬가지로 신이고요.”
_11. 축제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