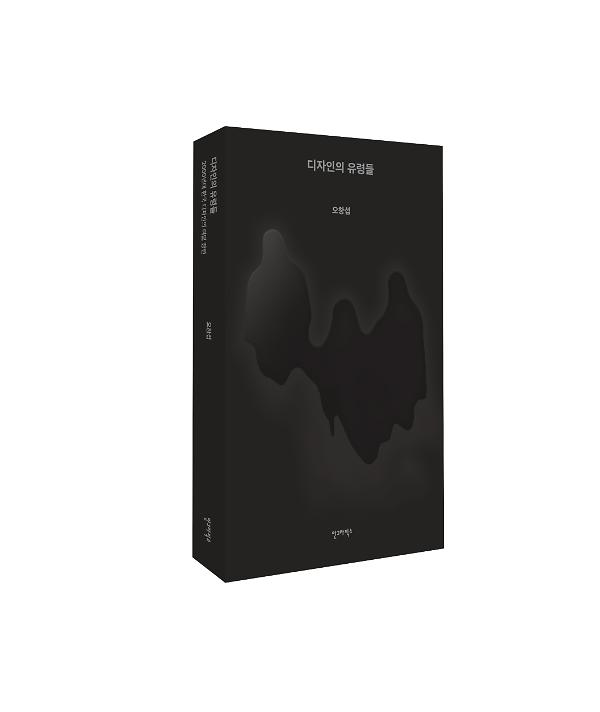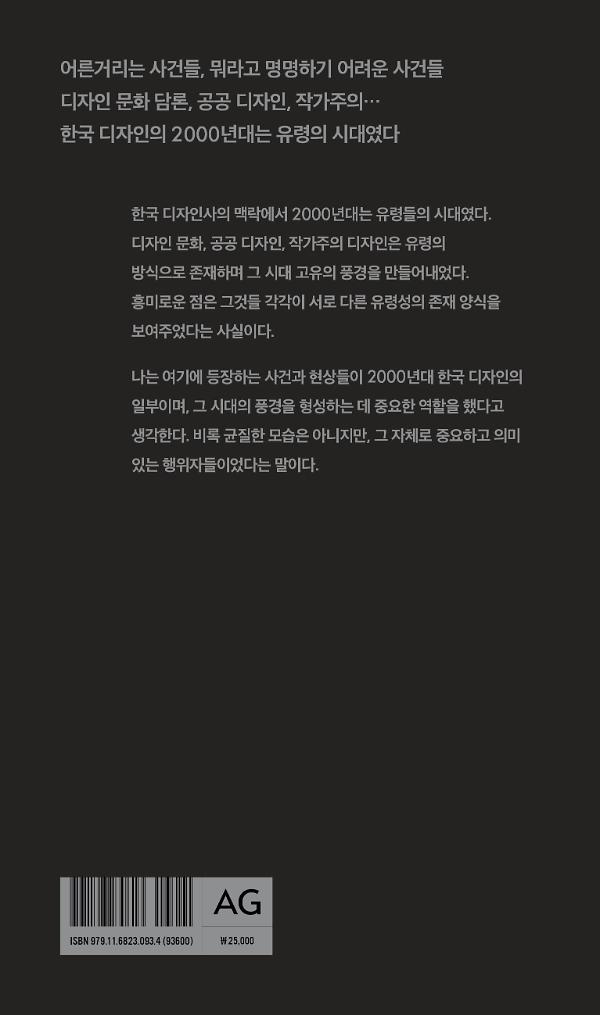유령이란 무엇인가? 유령은 죽은 산 자다. 저 세계에 있으면서 이 세계에 있는 무엇이다. 부족하면서도 넘치고, 넘치지만 부족한 양가성을 지닌 존재다. 유령의 출몰은 언제나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다. 유령은 이것과 저것, 과거와 현재, 삶과 죽음과 같은 이분법적 경계가 흐려지는 지점에 존재하는 무엇이다. 그래서 그것은 늘 흐릿하고 애매한 형식으로 존재한다. 유령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 유령은 사이 존재인 것이다.
한국 디자인사의 맥락에서 2000년대는 유령들의 시대였다. 디자인 문화, 공공 디자인, 작가주의 디자인은 유령의 방식으로 존재하며 그 시대 고유의 풍경을 만들어내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것들 각각이 서로 다른 유령성의 존재 양식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다.
「여는 글」, 10‒11쪽
디자인 문화 담론이 구체적인 현실을 구성해 냈는가를 묻는 것이라면 ʻ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0년대 후반의 디자인 문화 담론은 그 무렵 한국 디자인의 양상을 담아내는 역할은 물론이고, 새로운 디자인 현상을 만들어내는 코드로서도 기능했습니다. 2000년대의 디자인 분야에 나타난 현상과 사건들, 구체적으로 디자인미술관의 설립과 활동, 공공 디자인의 등장과 확산, 심지어 작가주의 디자인 현상 등에서 디자인 문화 담론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디자인 문화 담론은 2000년대 한국 디자인의 고유한 현상과 실천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디자인 문화 담론의 출현 」, 25쪽
디자인미술관의 설립은 디자인 분야의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디자인미술관이 개관하자 그 사실을 알리는 기사들이 이어서 등장했다. 연합뉴스의 기사 「국내 첫 디자인미술관 개관」도 그중 하나였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문화관광부가 디자인미술관을 만든 목적은 “디자인 미술의 진흥”을 위해서였다. 디자인 미술이란 무엇일까? 기사는 “산자부가 전담하던 기존 디자인이 주로 산업,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면 문화부가 건립한 (디자인미술관의) 디자인 미술은 순수 학문이나 생활 디자인에 가깝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에 등장하는 디자인 미술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순수 학문과 생활 디자인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과연 당시에 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순수 학문이라 부를 만한 것이 있었을까? 기사의 내용적 화자는 도대체 무엇을 떠올리며 그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일까?
「2장 디자인, 문화의 영토 속으로」, 95‒96쪽
⟨de-sign korea: 디자인의 공공성에 대한 상상⟩ 이전에는 공공 디자인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 디자인과 유사해 보이는 현상이나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식하는 이가 공공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고, 당시에 그것은 공공 디자인으로 지각되지 않았거나 기존 디자인과 다르지 않은 디자인으로 인식되었다. 새로운 디자인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그 시대가 디자인이라고 이해하는 디자인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de-sign korea: 디자인의 공공성에 대한 상상⟩을 통해 공공 디자인이라 부를 만한 개념적 회집체가 만들어지고 가시화되면서 비로소 이전이라는 시간의 영토에서 공공 디자인과 유사한 사건과 현상들을 발견하고 유사점과 차이, 한계 등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역사 속 사건과 현상들이 공공 디자인의 촉수와 만나 공공 디자인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3장 상상하는 전시와 공공 디자인의 탄생」, 130쪽
물리적 공간과 다른 새로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네티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2004년 1월,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을 하나의 사건으로 만든 중요한 주체가 바로 이들 네티즌이었다. … 2000년대 초에 이미 현직 장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자 못지않게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네티즌입니다. 아니, 기자들보다 더 눈치를 보게 됩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2000년대 중반 무렵부터는 전통적인 매체들 역시 이들 네티즌의 의견을 토대로 방송을 제작하고 기사를 쓸 정도가 되었다. 이처럼 달라진 매체 환경 역시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사건을 강한 폭발력을 지닌 사건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4장 공공 디자인, 자동차 번호판에서 법까지」, 158쪽
200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는 입선이나 특선이라는 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상이 우수상이었고, 그 위에 최우수상이 있었으며, 최고상의 명칭은 대상이었죠. 왜 그랬는지는 명확합니다. 만일 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상대적으로 급이 낮은 상, 예를 들어 입선이나 특선을 받았다면 수상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을 고려해 상의 명칭을 정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우수상을 받았더라도 상을 받은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불편함이나 거리낌 없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5장 어떤 공모전의 꿈」, 196‒197쪽
2001년에 등장해 유행했던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라는 BC카드 광고 문구는 IMF 외환 위기 이후 달라진 가치의 지형이 어떤 것이었는지 잘 보여준다. 탤런트 김정은이 눈밭에서 외쳤던 이 광고 문구를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에서의 행동 지침이자 윤리로 받아들였다. 이명박을 거쳐 오세훈이 시장에 당선되었던 2006년에 이르러 그런 마음 씀은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 오세훈의 뉴타운 공약에 당시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건 그런 마음 씀의 구조 변화 때문이었다. 뉴타운 공약은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의 정치판 버전이었고, 달라진 마음 씀의 구조는 거기에서 매력을 느꼈다. 부자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솔깃한 이야기에 매력을 느끼는 그 마음 씀의 구조는 1년 후인 2007년 말, 이명박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데도 작동했다.
「6장 디자인서울의 디자인과 서울」, 221‒222쪽
그는 어느 시대든 규모가 작은 스튜디오는 있지만, 규모가 작은 것 자체가 그 성격을 규정하던 시대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가 유일했다고 주장한다. 무슨 이야기일까? 그의 주장은 사실 여러 의문을 낳는다. 과연 ʻ소규모'라는 게 특정 세대의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들을 묶는 틀이 될 수 있을까? ʻ소규모'라는 필터에 걸러지는 게 어떻게 특정 세대의 성과가 될 수 있을까? 김형진은 그렇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기이하게도 설명이 이어질수록 의문은 오히려 짙어진다. 소규모라는 필터의 정당성은 그렇게 안개 속에 머물며 글이 끝날 때까지 뚜렷한 형태를 드러내지 못한다.
「7장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 신화로부터 구해내기」, 275쪽
이전과 다른 모습의 디자인 전시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욕망이 디자이너 사이에 출현하기 시작했다. 디자인 전시가 매력적으로 인식되면 될수록, 전시를 위해 호명된 디자이너들이 작가주의 디자이너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분명하게 가시화되면 될수록 욕망의 농도도 따라서 짙어져 갔다. 그 욕망의 정체는 ʻ나도 작가주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었다. 이 새로운 욕망의 존재 양태는 하나의 꽃잎으로 이루어진 통꽃보다는 꽃잎들로 구성된 갈래꽃의 구조에 가까웠다. 여러 꽃잎이 어우러져 하나의 꽃이 되는 갈래꽃처럼 ʻ나도 작가주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는 욕망도 ʻ수동적으로 살고 싶지 않다' ʻ내 디자인을 내 방식대로 디자인하고 싶다' ʻ전시에 작가로 호명되고 싶다' 같은 다양한 욕망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8장 공명하는 작가주의 디자인」, 30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