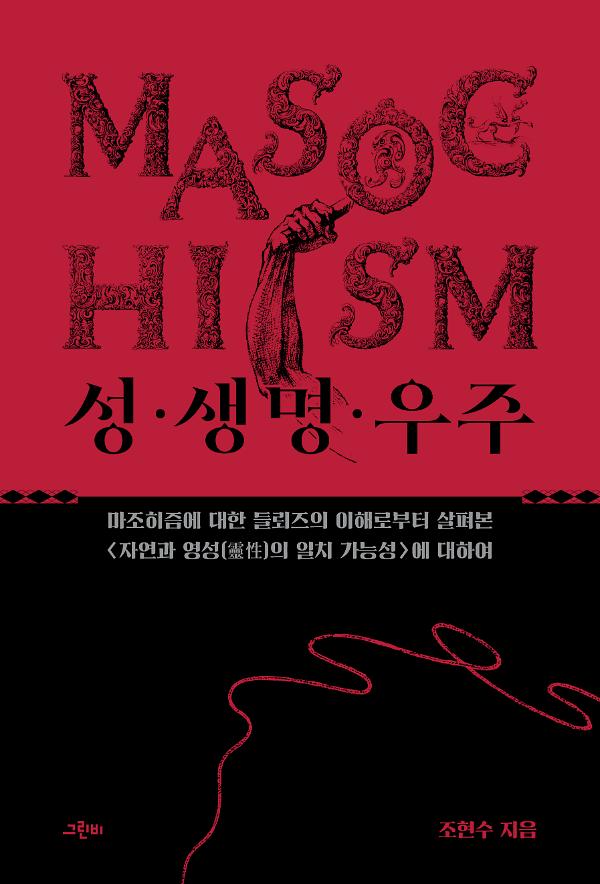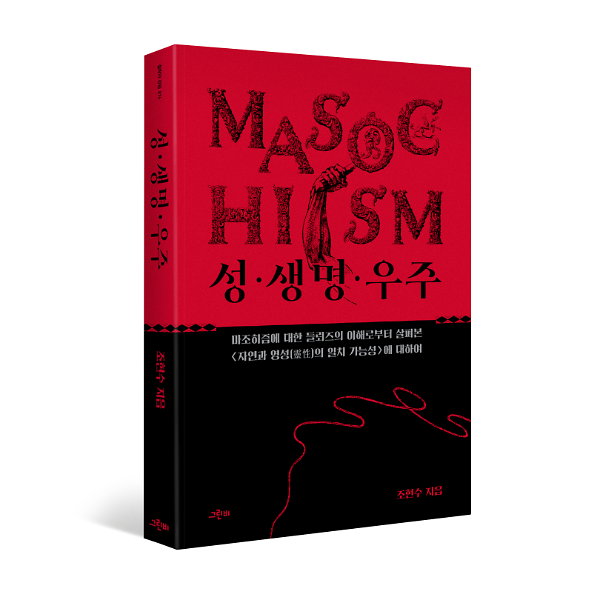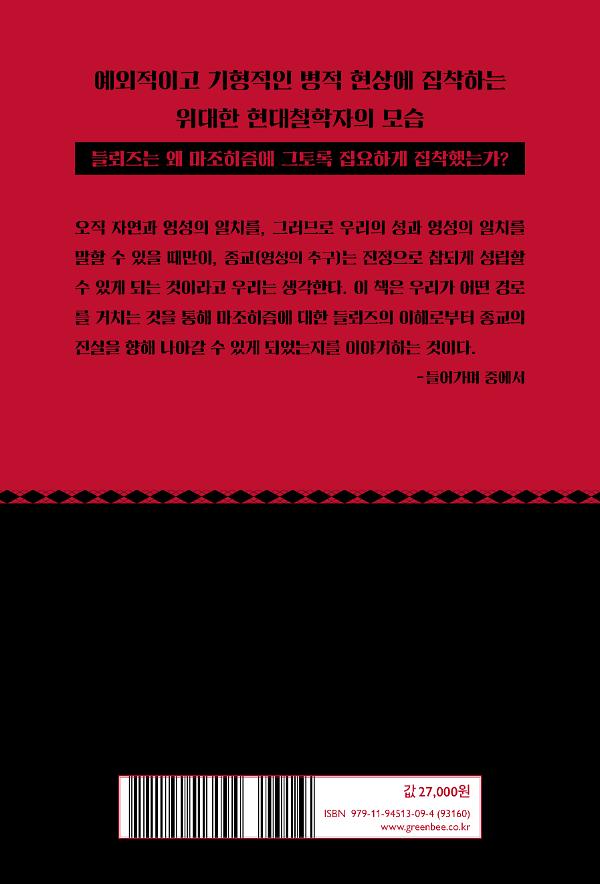마조히즘이라는 예외적이고 기형적인 병적 현상에 집착하는 위대한 현대철학자의 모습, 이것은 단지 오늘날의 철학이 겪고 있는 내적 빈곤을, 우주의 운명이나 존재의 본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온통 과학에게 다 빼앗겨 버린 채, 염치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과거의 철인(哲人)들은 차마 입 밖에 꺼내 놓기를 힘들어했던 세속적이고 타락한 주제를 거침없이 터놓고 까밝히는 데서 자신의 구차한 연명을 위한 수단을 찾으려 하는 철학의 몰락한 현주소를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우리는 마조히즘에 대한 들뢰즈의 연구가 어느 일탈적인 개인의 사소하고 병적인 성적 판타지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이 이상한 현상의 기저에 실은 생명과 우주 전체에 관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 인간 모두의 삶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해 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
달을 수 있게 되었다. (16~17쪽)
쾌락을 추구하면 그에 대한 대가(결과)로 고통(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법이 세우는 원래의 논리이지만, 마조히스트는 선제적으로 고통(벌)을 먼저 자청해서 받음으로써 이 논리의 앞뒤 순서를 뒤집는다. 즉 먼저 자청해서 매질(거세를 대신하는 매질)의 고통(벌)을 당함으로써, 이 고통(벌)의 위협이 금지하고 있던 쾌락을 맛볼 수 있는 면죄부를 미리 얻게 되는 것이다. 마조히즘에서 나타나는 ‘고통과 쾌락의 연관’이 논리적 인과 관계(일치의 관계)가 아니라 시간적 선후관계인 것은, 즉 마조히스트가 그의 파트너와의 성적 관계에서 먼저 고통을 겪고 난 연후에야 비로소 쾌락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법을 뒤집는 마조히스트의 이와 같은 반전의 논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들뢰즈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83~184)
마조히즘에서 발견되는 초개인적인 환상이라는 문제는 우리를 한순간 이와 같은 신비로운 상념 속에 빠져들게 만든다. 하지만 다음 순간, 우리는 곧 다시 냉철한 이성의 고개를 저으며 이런 물거품 같은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오려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성의 눈으로 볼 때, 이 같은 생각들은 참으로 실소를 자아내는 병리적 망상으로 보일 뿐일 것이다. 하지만 실로 들뢰즈는, 비록 단 한 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초개인적인 환상이 개인의 우연적 삶을 넘어서는 초개인적인 운명으로 마조히스트를 이끌어 가는 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204)
마조히즘에 대한 들뢰즈의 논의가 실은 단지 마조히즘이라는 하나의 병리적 사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본성이 무엇인가라는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현대 유럽 철학의 근본적인 믿음을 뒤흔들 수 있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해를 모색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PSM에서 논의되고 있는 초개인적인 환상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초개인적인 환상의 존재와 연결되는 초개인적인 운명의 문제는 이 최초의 글이 가리키고 있는 무의식에 대한 융의 이론을 배경으로 할 때, 아직 석연치 않게 남아 있는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서서히 드러내게 된다. 마조히즘에 대한 들뢰즈의 모든 논의는 이 최초의 글에서 논의되고 있는 융의 이론과 연결될 때 비로소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마조히즘에 대한 들뢰즈의 논의가 함축하고 있는 이 본래의 의미가 바로 베르그송의 생명의 약동 이론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임을 역시 이 최초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7~208)
우리는 바로 베르그송에게서 이러한 ‘프로이트의 부정’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 ‘프로이트 이후’의 이론들이 무의식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해를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새로운 변주나 아류를 만들어 내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들인 반면, 베르그송은 바로 무의식이 무엇이냐는 이 출발점 자체에 있어서 프로이트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해의 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단추가 어떻게 꿰어지느냐에 따라 나머지 다른 단추들의 운명이 달라지듯이, 무의식에 대한 베르그송의 새로운 이해는 또한 각종 정신병리적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제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잉태한다. (256)
마조히즘은 이 둘 사이에 이와 같은 대립과 반목의 관계가 아니라 실은 가장 근본적인 일치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조히즘을 통해 우리는 성과 영성의 완전한 일치라는 불가사의한 세계이해를 말해 온 동양의 오랜 신비주의인 탄트리즘(밀교密敎)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우주의 가장 근원적인 비밀이 바로 우리 자신의 성 속에 있으며, 그러므로 깨달음(해탈)의 완성은 바로 우리 자신의 성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해 온 탄트리즘의 ‘성-신비주의’, 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해 주는 마조히즘은 과연 이 탄트리즘을 재발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일까? (328)
그러므로 탄트리즘에 따르면 해탈은 성욕에 대한 부정과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욕에 대한 긍정에 의해서, 성욕의 참모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욕의 참모습이 가진 가능성의 올바른 실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탄트라는 말한다. 피하려 하지 말라. 회피는 이미 불가능하다. 초월하기 위해서는 본능 그 자체를 사용하라. 싸우지 말라. 초월하기 위해서는 본능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성을 회피하려 하는 것, 본능을 회피하려 하는 것, 그것은 생 자체를 회피하려 하는 것이다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