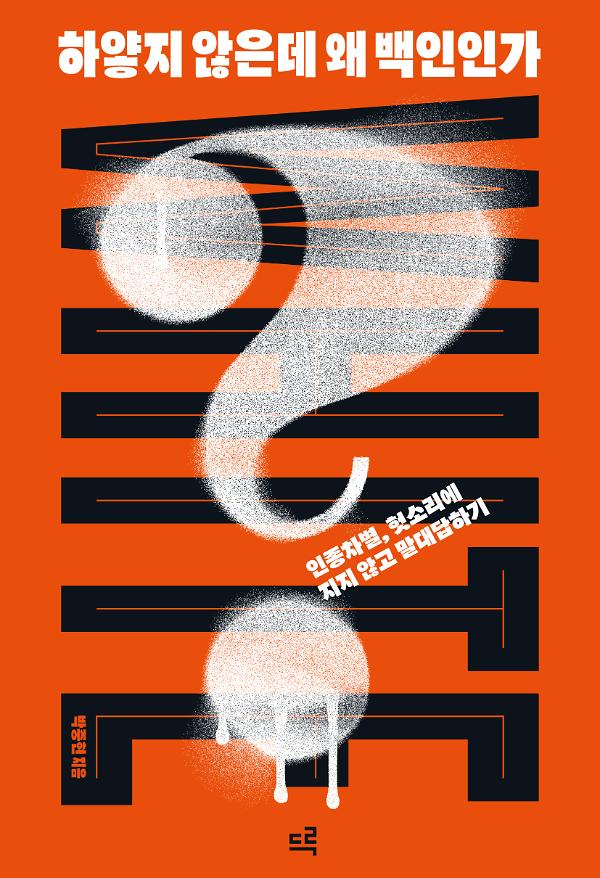우리를 주눅 들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차별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19세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는 흑인과 백인의 삶을 철저히 분리하는 정책이었다. 차별의 시작은 인종이었으며, 그 인종을 구분하는 가시적인 요소는 바로 피부색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후 시간이 흘러 차별을 위한 법안이 철폐되며 평등한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했으나 사실 그렇지 않다. 21세기의 차별은 법과 제도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더 정교한 형태로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다. 최근 들어 트럼프 정부의 백인우월주의적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는 인종 간 위계를 더욱 공고히 했고, 세계 곳곳에는 여전히 ‘누가 우월한가?’라는 질문이 은밀하게 떠도는 중이다. 하지만 위험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자각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그 틀 안에 갇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얗지 않은데 왜 백인인가?〉는 바로 이와 같은 지점에서 출발한다.
고정관념의 덫,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편견의 실체
인간은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고정관념’이라는 도구를 활용한다. 이는 세상을 단순화하고 빠르게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때때로 우리가 가진 사고의 폭을 지나치게 제한하기도 한다. 이 책은 이러한 고정관념이 인종적 편견과 결합해 어떻게 차별을 재생산하는지를 선제적으로 살핀다. 더 나아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적 관념들이 우리의 사고를 어떻게 조종하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동양인이 서구 사회에서 겪는 미묘하고도 강력한 편견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날카롭게 파헤친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인종차별의 피해를 나열하는 데에서 그치지는 않는다. 그리고 누군가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상정하며 규정짓지도 않는다. 다만, 차별이 작동하는 구조적인 원리와 개념을 해부하며 스스로 사고방식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 책이 흥미로운 이유는 인종적 고정관념이 단순히 서구권 사회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백인처럼 보이는 것’을 선망하거나, 서구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더 우월하게 여기는 경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단순한 선입견의 문제가 아니라 수 세기 동안 형성된 전 세계적인 식민주의와 문화적 헤게모니의 잔재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미적 기준이나 사회적 규범, 그리고 성공의 가치가 서구를 중심으로 정의되었다는 걸 깨달아야만 그 시각이 얼마나 편향된 것이었는지를 자각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통찰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우리가 어떻게 사고의 틀을 깨고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는지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글로벌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고민 가운데 하나다.
이 책은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들어 고정관념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세상은 계속해서 진보하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만든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차별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인종차별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가 얼마나 제한된 시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일깨워 준다. 이를 통해 무의식적인 편견을 점검하고 더 넓고 깊은 이해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차별의 새로운 얼굴, 교묘하게 진화한 인종차별
차별은 시대에 따라 그 얼굴을 바꾸어왔다. 과거에는 제도화된 노골적인 인종차별이 만연했다면 오늘날의 차별은 더 정교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하얗지 않은데 왜 백인인가?〉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차별’의 정체를 파헤친다. 저자는 차별이 더 이상 노골적인 증오나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무의식적인 편견과 구조적인 배제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서구 사회에서 동양인들이 겪는 차별은 이제 노골적인 멸시의 방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벽’의 형태로 작동하기 때문에 더 인식하기 어렵고 대응하기도 까다롭다. 이 책은 이런 미묘한 차별이 어떻게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지 날카롭게 분석해 새롭게 생각해 볼 법한 여지를 준다.
현대 사회까지 함께 온 인종차별의 핵심적인 부분은 ‘배제’의 형태로 이것이 작동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편견이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과 문화 속에도 치밀하게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동양인에게 덧씌워진 ‘조용하다’거나 ‘갈등을 피한다’는 이미지는 단순한 성격적 특성을 넘어 사회적 기회와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만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등의 ‘동양인의 성취’를 특정한 분야로만 한정 짓는 경향은 이들을 결국 사회의 중심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서 작동한다. 이는 곧 차별이 단순한 증오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집단을 지속적으로 주변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얗지 않은데 왜 백인인가?〉는 이처럼 교묘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든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를 단순히 피해자의 자리에 앉혀 놓고 그곳에 머무르며 한탄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기제를 인식하고 깨부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그러다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차별’이라는 게 단순히 역사적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삶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점을 말이다. 변화는 ‘인식’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차별을 인식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바꿀 힘 역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차별에 맞서는 힘
차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냐고 묻는다면 이 책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차별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해서 개인이 무력한 존재로 남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차별의 본질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이상 억눌리지 않고 온전한 자아를 확립할 수 있는 길이다. 서양권 국가에 나가면 길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니하오’라는 말을 듣거나, 식당에서 나만 주문을 늦게 받는 등의 교묘한 인종차별을 당해본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이때, 그것을 내재화하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이러한 사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다양한 차별의 양상을 분석해야만 한다. 이 책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분석과 그에 따른 전략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거나 피해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차별에 정면으로 맞서며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게 한다.
특히 강조하는 지점은 차별에 대응하는 방식이 단순한 감정적 토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임다. 저자는 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을 당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되받아칠 수 있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소개한다. 예컨대, 미러링을 통해 상대가 던진 편견을 그대로 돌려주어 그들이 얼마나 부당한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식이 그러하다. 또한, 유머와 재치 있는 대응으로 상대의 의도를 무력화하는 방법, 때로는 단호한 태도로 강경하게 대응하는 법까지 다양한 상황별 대응 방식을 알려 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차별적 인식을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차별은 단순히 ‘피해 경험’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가능성이 되어 주어야만 변화도 뒤따라올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역시 차별을 겪은 경험이 결코 수동적인 상처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개인의 경험들은 우리가 더 강해지고 주체적인 목소리를 가질 기회가 되어 줄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며 ‘차별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차별에 맞서는 것은 특정한 이들의 싸움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몫임을 깨닫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하얗지 않음’에 주눅 들 필요가 없다. 차별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나, 그것을 깨닫고 바꾸려는 노력 역시 지금 이 순간까지 지속되고 있다. 〈하얗지 않은데 왜 백인인가?〉는 단순히 차별을 고발하기만 하는 책이 아니다. 우리가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 줄 것이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바라보지 말자. 이제 우리가 스스로 정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