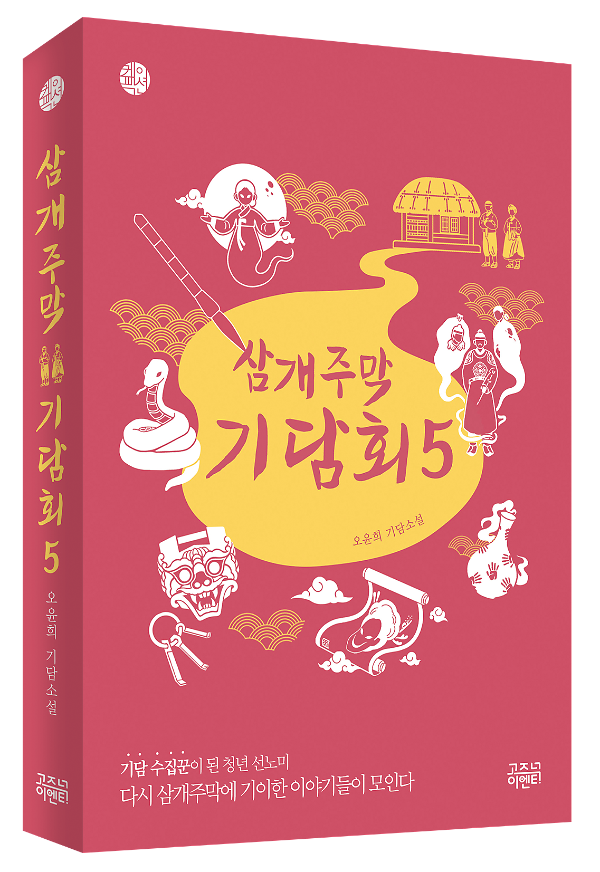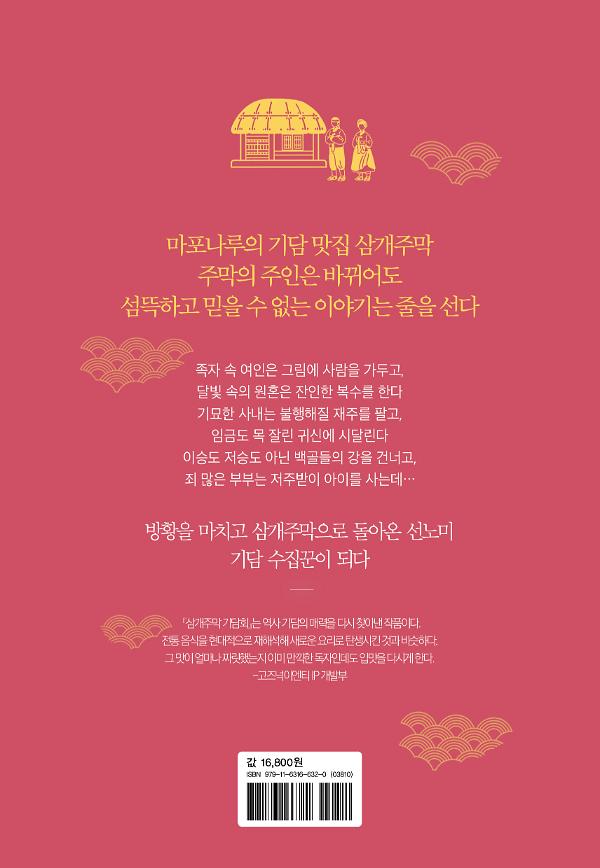“이보게, 정신 차려. 허구한 날 그림만 보고 있으면 어쩌잔 말인가. 현실을 봐야지, 현실을.”
처음엔 지인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다음엔 귀찮게 느껴졌다. 그러다 어느 때부터 어떤 충고도 더는 귀에 들리지 않았다. 현실?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살고 싶은 데가 현실 아닌가? 그렇다면 저 무릉도원이 현실이 안 될 것도 없지.
여기서 계속 살고 싶지 않아?
꿀처럼 달콤하고 끈적거리는 목소리는 언젠가부터 귓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 계속 살고 싶어. 할 수만 있다면 이 객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곳에 머무르고 싶다고.
순연이 그림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지자 걱정하던 사람들도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다. 귀신 들린 그림에 정신이 나갔다며 혀를 차는 사람들도 있었다. 객주 주인이 미쳤다고 소문이 나자 손님들은 발길을 끊었고, 결국 순연은 외톨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자신에겐 무릉도원이 있으니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무릉도원이.
(족자 속 미인 中)
혼자 남은 순이는 어쩐지 으스스했다. 고양이는 영물이라던데 어쩌면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걸 보거나, 들은 게 아닐까. 어둠을 어슴푸레하게 밝히는 차가운 달빛도 기분 탓인지 불길하게 느껴졌다.
쿵쿵.
문득 어디선가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기둥을 무언가로 툭툭 칠 때 들릴 법한 소리였다.
순이는 소리 나는 곳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가슴이 공연히 두근거렸다. 무서운 걸 보게 될 것 같았지만, 뭔지 모를 묘한 힘에 이끌려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쿵쿵.
다가갈수록 소리는 점차 뚜렷하게 들렸다. 순이의 눈앞에 하얀 버선코가 보였다. 버선을 신은 발은 공중에서 몇 뼘 정도 떠올라 있었다. 그 발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다 기둥을 차는 바람에 쿵쿵대는 소리가 들린 모양이었다.
순이가 제 눈높이쯤에 와닿은 버선발 위로 시선을 옮겼다. 새하얀 소복 치마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눈처럼 하얀 치마에 어울리는 하얀 저고리가. 옷고름이 사라지고 없는 저고리 위쪽을 지나자 순이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고 말았다.
(달빛 아래 정인 中)
유생은 어수선한 틈에 표식을 떨어트렸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주막 주인으로 보이는 자가 봉두의 칼을 맞고 난리가 난 와중이라 그럴 만도 했다. 돌쇠는 잽싸게 바닥에 떨어진 표식을 제 품에 넣었다. 그걸로 딱히 뭘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저 몸이 자동으로 반응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쩌면 이 물건이 자신을 구해줄 생명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이걸 관리들에게 보여주고 역모를 낱낱이 고하면 어쩌면 풀려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감형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라를 훔치려는 죄에 비하면 주막을 터는 것 따위는 죄로도 칠 수 없는 가벼운 죄니까.
끼이익.
별안간 감옥 문이 열리며 옥리가 옥졸을 데리고 안으로 저벅저벅 들어왔다.
“네 죄를 이실직고할 준비가 됐느냐.”
돌쇠는 고개를 들어 옥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전에 나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돌쇠는 손에 움켜쥔 물건을 천천히 내밀었다.
(과거와의 재회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