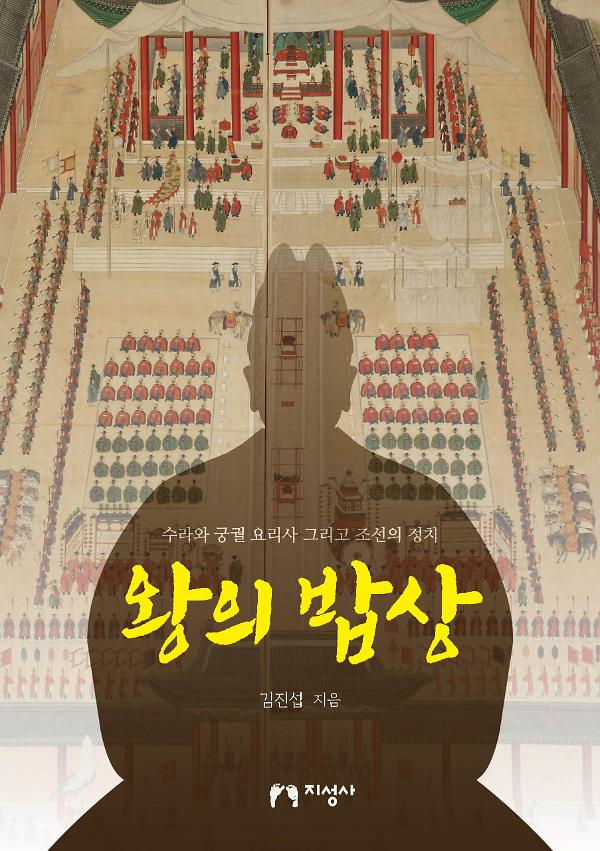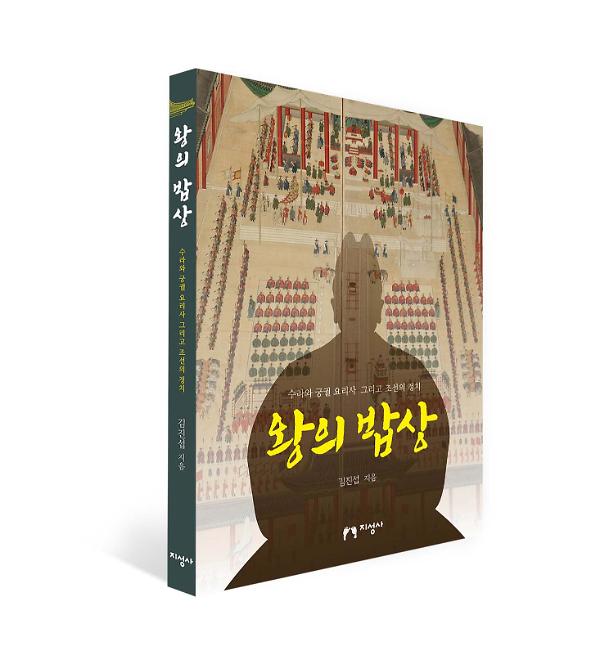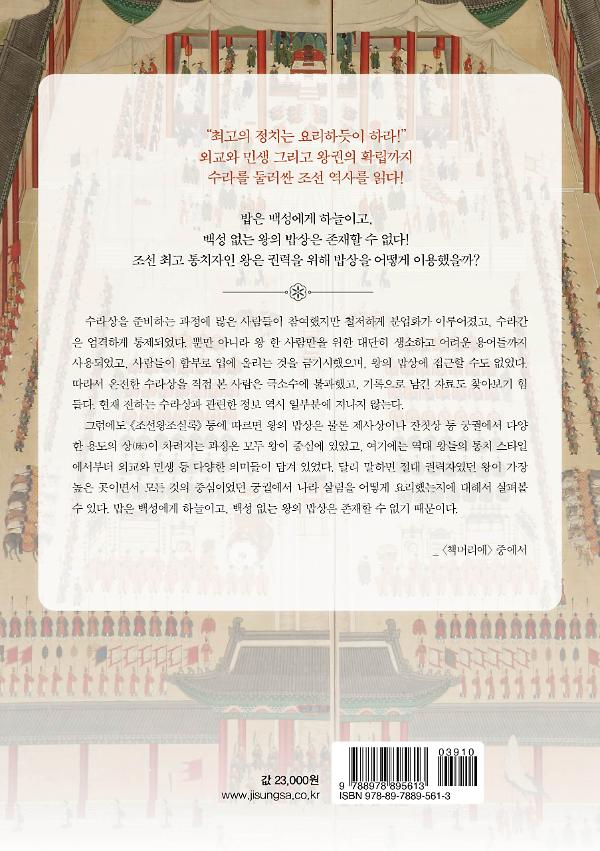19쪽) 그러나 평상시 왕의 밥상은 반찬이 넘쳐날 정도로 가짓수가 많지도 않았지만, 화려하고 사치스럽기보다는 영양을 골고루 담은 균형 잡힌 밥상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건강을 고려하여 보양식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지만, 특이하거나 구하기 힘든 귀한 재료들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붕어찜이나 붕어구이 또는 소의 위(양)를 삶거나 찐 것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 음식도 많았다. 여기에는 음식에 대한 왕의 절제된 태도가 담겨 있다. 왕의 밥상은 기본적으로 자기 관리이면서 도덕적인 문제이기도 했고, 왕의 밥상을 직접 본 사람은 드물었지만, 왕이 무엇을 먹는지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즉 왕의 식사는 절대 권력자가 누리는 특권의 상징이 아니라 밥상에 앉는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밥상을 통해 왕이 먼저 근검절약하는 검소한 생활을 보여줌으로써 대신들을 통솔하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행위와도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27쪽) 당시 궁궐을 중심으로 왕의 지휘를 직접 받는 병력은 도성 수비대인 의흥친군위와 세자가 거느린 사병 등 1천 명 정도였다. 따라서 궁궐과 개경의 경계는 물론 군대의 규율을 유지하며 통솔하기 위해 먹는 문제의 해결과 같은 기본적인 지원이 더욱 중요한 게 현실이었다. 그럼에도 개국 초기에는 왕과 왕실을 비롯해 왕을 지원하는 관리들 그리고 병사 등,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된 조직이나 요리사를 두는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이들이 모두 개별적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태조가 이인수를 왕의 식사를 전담하는 전속 요리사가 아니라 중추원에 임명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인수는 조선이 개국한 후 궁궐에서 요리를 책임졌던 최초의 공식 궁궐 요리사라 하겠다.
38쪽) 요리사들은 사신들에게 요리를 통한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여 조선에 대해 좋은 인상을 남기는 등 양국 사이의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궁궐 요리사들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 사신들이 조선에 도착하기 전부터 바쁜 일정을 보냈다. 예를 들면 문종이 즉위한 해(1450) 7월 18일 “내옹인(內饔人)을 여러 도에 보내 사신이 구하는 물품을 준비하게 했다”고 하는데 내옹인에서 내(內)는 궐내(闕內)를 지칭하고, 옹인(饔人)은 음식 만드는 사람으로 사옹원에 소속되어 궐내의 음식을 담당한 요리사를 말한다. 문종 2년(1452) 3월 26일에도 문종이 환관을 통해 태평관에 음식물을 보내면서 요리사도 함께 파견했는데, 〈문종실록〉에는 “중국의 사신을 중하게 여기어 무릇 먹이는 음식물을 극진히 생각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라며 왕이 요리에 각별하게 신경 썼다는 기록으로 보아 요리사들의 노고 또한 컸음을 알 수 있다.
46쪽) 한편 “10명의 집찬비가 이들과 함께 떠났다”는 점도 주목된다. 집찬비는 궁궐에서 음식과 반찬을 만드는 일을 돕는 나인을 말한다. 이들은 양반가 여인들을 수종하는 여종들과 함께 경회루 아래에서 식사할 정도로 미천한 신분이었다. 그러나 집찬비는 공녀로 가는 여인들과 여종들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니라 명나라의 요구로 떠나게 된 또 다른 성격의 공녀였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명나라에서는 사신을 통해 몇 차례 요리하는 궁녀를 요구했고, 〈세종실록〉에 “임금과 대신들이 명나라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논의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55쪽) 모두 ‘나라에 큰 재앙이 발생했을 때 왕이 하늘의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두려워하고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고 반성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철선은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고 감선은 왕의 밥상에서 반찬의 가짓수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소선은 고기 먹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철선은 왕이 선택하는 방법 중 초강수에 해당했고, 상황이 더 심각하면 철선과 함께 사형수나 강상죄인(綱常罪人), 즉 자기 부모 또는 남편을 죽인 자 · 노비가 주인을 죽인 자 · 관노가 관장(官長)을 죽인 자 등을 제외한 경죄인(輕罪人)의 사면과 함께 왕이 대신이나 백성들을 상대로 바른말을 널리 구하는 구언(求言)을 명하는 등 왕이 취할 수 있는 각종 조치들도 함께 이루어졌다.
67쪽~68쪽) 상황이 심각할 경우 감선이 더 강화되기도 했다. 감선에 피전(避殿)이 더해진 것이 그 예였다. 피전은 나라에 재앙이나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왕이 근신한다는 뜻으로 평소 머물며 정사(政事)를 보던 대전(大殿)에서 허름한 장소로 거처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감선이 더해진 피전 감선(避殿減膳)은 누추한 곳으로 거처를 옮기고 먹는 음식의 가짓수를 줄이는 것으로 왕의 밥상은 더 단출해졌다. 하지만 왕이 항상 의도한 바를 얻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감선이 왕에게 언제나 유리한 선택지는 아니었다. 왕이 섣불리 감선을 선언했다가 가시적인 성과 없이 명분도 찾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왕이 스스로 무능을 증명하는 꼴이 되었고, 때로는 대신들이나 특정 정파에서 감선 카드를 들고나와 국가적 재앙에 대한 왕의 책임과 반성을 요구하며 왕권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108쪽) 한편 성종의 즉위 기간 동안 대비와 왕비도 성종의 명에만 의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선에 동참하며 성종을 지원했다. 성종 22년(1491) 5월 5일 성종이 “지난번에 가뭄으로 인하여 양전(兩殿, 인수 왕대비전과 인혜 왕대비전)에서 감선하였는데, 지금 비가 이미 흡족히 내린 까닭으로 내가 수라상의 음식 가짓수를 그전대로 회복하기를 청한다”라며 양전에 감선을 끝낼 것을 청했다. 그러나 양전에서는 교지(敎旨)를 통해 “주상이 수라상의 음식 가짓수를 그전대로 회복한 후에 마땅히 수라상의 음식 가짓수를 그전대로 회복할 것이다”라며 성종이 감선을 끝내지 않는데 먼저 감선을 멈출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22쪽) 대표적인 예로 영조 13년(1737) 8월 14일 영의정 이광좌(李光佐, 1674~1740)와 우의정 송인명(宋寅明, 1689~1746) 등이 입시하자 영조가 이들에게 수라상을 밀어준 일도 있었다. 당시 이광좌가 신료(臣僚)들과 나누어 먹기를 청하자 영조는 “경이 먼저 먹고 다음에 우상(右相)에게 주고, 또 그 나머지를 싸서 좌상(左相)에게 전해주라. 경들이 이 밥을 먹으면 어찌 차마 잊겠는가? 그릇을 가지고 자손들에게 나누어주어 오늘 음식을 하사하고 그릇을 나눈 일을 알아서 대대로 내 자손을 보필하게 하도록 하라”며 왕이 재상들과 함께 밥상을 나눔으로써 화합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대를 이어 왕과 왕실을 충심으로 보필하라고 명했다.
163쪽) 명종 즉위년(1545) 9월 5일 홍언필(洪彦弼, 1476~1549) 등이 명종에게 역모 사건의 연루자들을 보고했는데, 여기에는 “반감 오순복(吳順福)과 각색장 오연개(吳連介)가 역모를 모의한 이유(李瑠, 1502~1545)의 집을 왕래했다”며 수라간에서 일하는 요리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순복은 “신은 숙수(熟手)가 직업이기 때문에 이유가 과자를 만들거나 음식을 만드는 일로 사람을 시켜 부르면 가끔 그의 집에 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용렬한 천인이라서 그가 말한 것과 윤임(尹任, 1487~1545)과 동모(同謀)한 일은 전혀 모릅니다”라며 단지 요리를 하기 위해 이유의 집을 왕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오순복과 오연개는 혐의가 없어 석방되었지만, 이 사건은 궁궐 요리사들이 때로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적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예였다.
200쪽) 중종 31년(1536) 10월 18일 중종이 늦은 밤중에 당직하는 관리를 불러서 “도설리 서후갑(徐後甲)과 박간(朴幹) 등을 의금부에 가두라”고 명하고, 다시 조금 있다가 “한 · 당 시대에 환관들의 해(害)가 심했다고 흔히들 말한다. 무릇 환관들은 외간(外間)의 말을 가지고 임금을 놀라게 하고 내간(內間)의 위세를 빙자하여 외간 사람들을 협박하므로 현명한 임금이 아니면 참으로 분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지금 조정에서 늘 환관을 가지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며 환관들이 왕과 대신들 사이에 말을 전달하면서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부정 비리까지 저지르는 등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물건을 몰래 훔쳐 쓰려는 생각을 품고 ‘물품이 떨어졌다’고 하니, 그 정상이 매우 간사하고 악독하다. 봉진(封進)하는 물선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지금에만 어째서 떨어졌다는 말인가? 이러한 환관들의 소행을 대신들이 알면 반드시 경악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밤이 깊었지만 가두게 하는 것이다”라며 도설리 서후갑과 박간 등이 왕의 물건을 빼돌리고 거짓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237쪽) 김홍륙은 자신이 유배형에 처하자 고종에게 앙심을 품었고, 유배지로 떠나기 직전에 심복 공홍식(孔洪植)에게 고종을 독살하라고 지시했다. 공홍식은 김홍륙의 추천을 받아 궁궐 주방에서 외국 요리를 전담하던 요리사로 전한다. 당시 김홍륙은 공홍식에게 아편 한 냥을 주면서 어선에 섞어 올릴 것을 은밀하게 사주했고, 공홍식은 다시 김종화(金鍾和)를 만나 김홍륙에게 사주받은 내용을 자세히 말하면서 “이 약물을 고종이 마실 차에 섞어서 올리면 마땅히 1천 원(元)의 은(銀)으로 수고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화는 일찍이 궁궐 내 보현당(寶賢堂)의 창고지기로 일했고, 고종에게 식사를 올리는 서양 요리사를 보조한 것으로 전한다.
243쪽~244쪽) 예종 즉위년(1468) 10월 25일 “궐문은 모두 표신(標信)을 상고하여 출입하게 하고, 위졸(衛卒)은 사옹원으로 하여금 밥을 먹이게 하였다”고 하며, 예종 1년(1469) 10월 14일에도 “사옹원에 명하여 네 곳의 군사와 대궐 안의 각 사에서 관리가 1명씩 서로 바꾸어 낮 동안 서던 당직자에게도 식사를 제공했다”며 궁궐 출입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계를 서던 말단 병사들과 당직자에게 사옹원에서 식사를 제공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그리고 성종 1년(1470) 2월 6일 대전을 비롯해서 중궁전과 대비전 등의 시녀, 청소나 세숫물 등의 심부름을 하던 여종 무수리, 청소를 맡은 사내종 파지, 궁중 연회나 의식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여령(女伶)과 방자 등 왕실에서 일하는 말단 관원과 노비 등 정해진 인원들에게 지급되는 봄과 가을 의복, 봉급 등을 규정으로 정하면서 식사도 제공하라고 명했다.
261쪽) 궁궐 요리사들은 격무에 시달렸고, 자연재해 등으로 지출을 줄여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우선적인 감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났고, 심지어 중종 20년(1525) 10월 23일 “사옹원의 각 색장들이 고역(苦役)을 싫어하여 피하기 때문에 자주 변방의 관노(官奴)를 삼는데, 곧 도망하여 더러는 도둑이 되어버리므로 공천(公賤)이 날로 줄어들기에 감히 품합니다”라고 보고한 일도 있었다.
270쪽) 궁궐에서 잔치를 준비할 때는 여전히 대령숙수인 남성 조리사들이 동원되었지만, 수라간에서 여성들이 요리에 직접 참여하게 된 이유는 궁궐 남성 요리사들의 감소와도 연관이 있었다. 광해군 2년(1610) 1월 3일〈광해군일기〉에는 “난을 겪은 후로는 [요리사의] 대다수가 사망하였으며, 한때의 포상(褒賞)으로 인하여 면천 · 면역한 자도 30여 명에 이르니, 지금 부릴 수 있는 자는 단지 50여 명뿐입니다”라며 요리사들의 인원 충원이 힘들어 요리에 필요한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한 내용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