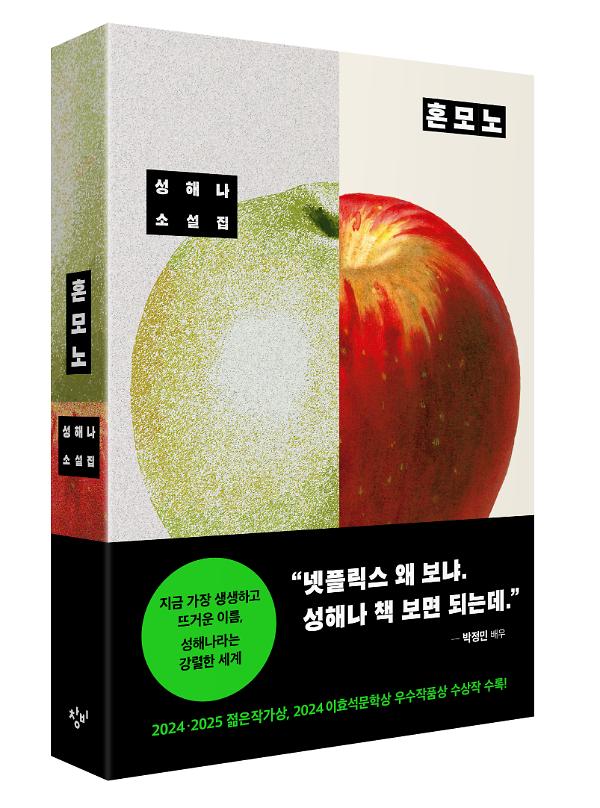야생의 본능을 상실한 호랑이는 무기력하게 몸을 내어주고 있었다. 미약하게 그르릉거리는 순간도 있었으나 사육사가 고무망치로 앞발을 내리치자 금세 잠잠해졌다. (…)
어쩐지 죄를 저지르는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흥분되었다.
그건 언젠가 느껴본 적 있는 감각이었다. 죄의식을 동반한 저릿한 쾌감. 그 기시감의 정체를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지독하고 뜨겁고 불온하며 그래서 더더욱 허무한, 어떤 모럴.
떨쳐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제는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누군가의 말처럼, 이미 일어난 일은 없던 일이 될 수 없으니까.
―「길티 클럽: 호랑이 만지기」(64~65면)
수많은 배지에 그 남성의 초상이 담겨 있었다. 군복을 입고 엄숙한 표정을 지은 채 허공을 가리키고 있는 남성. 미스터 김에게 이 남자는 누구냐고 묻자 그가 화색을 띤 채 외쳤다.
나의 대통령입니다!
그의 표정은 단연 오늘 하루 중 가장 밝았다. 말보다 마음이 더 앞서는지 흥분된 어조로 존경, 친애 같은 단어를 쏟아내기도 했다.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배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초상 뒤편에 넘실대는 ‘타이극’ 문양이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설명해주는 것 같았다.
한국의 링컨 같은 존재인가.
―「스무드」(105면)
동자님, 입이 쓰면 사탕이라도 드릴까요?
동자들이란 달콤한 것이라면 사족을 쓰지 못하는 법. 사탕이라도 물릴 요량으로 찬장을 여는데 등 뒤에서 웅얼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장수할멈이 점지해줬어. 네놈 앞집에 들어가라고.
그것이 시작이었다. 얄궂은 악연의 시작. 혹 잘못 들은 건가 싶어 신애기 쪽을 돌아보며 되물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애기가 조소했다.
신빨이 다했다더니 진짠가보네. 할멈이 나한테 온 줄도 모르고.
그애는 살기 어린 눈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기야 존나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냐만.
―「혼모노」(120면)
이것은 나와 저애의 판이다. 누구의 방해도 공작도 허용될 수 없는 무당들의 판이다.
(…) 이제는 내 차례다. 수박도 쩍 갈라놓을 만큼 밤새 매섭게 벼려놓은 칼날이 살갗에 닿고 신경을 지난다. 나를 보는 신애기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피가 흐르고 있겠지. 이미 입안에서도 비릿한 피비린내가 진동하니까. 하지만 중요치 않다. 아픔도 고통도 느껴지지 않는다.
―「혼모노」(150면)
삼십년 박수 인생에 이런 순간이 있었던가. 누구를 위해 살을 풀고 명을 비는 것은 이제 중요치 않다. 명예도, 젊음도, 시기도, 반목도, 진짜와 가짜까지도.
가벼워진다. 모든 것에서 놓여나듯. 이제야 진짜 가짜가 된 듯.
―「혼모노」(153면)
제가 선생님의 뜻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빛이 인간에게 희망뿐 아니라 두려움과 무력감을 안길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창이 필요했던 건데……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했으니까요.
여재화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구보승은 화색을 띤 채 말을 이었다. 빛이 공간의 형태를 드러내 조사자에게 두려움을 심고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해 무력감을 안길 거라고.
희망이 인간을 잠식시키는 가장 위험한 고문이라는 걸 선생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구의 집: 갈월동 98번지」(191~92면)
사람들과 섞여 시시한 이야기를 나누다 딤섬을 입에 넣었다. 입안에서 얇은 피가 터지며 뜨거운 육즙이 흘러나왔다. 화들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들 서로의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고 술잔을 채워주며 소리 내어 웃고 있었다.
정이 흘러넘치고 우호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그 안에서, 나는 뜨거운 딤섬을 차마 삼키지도 뱉지도 못한 채, 그대로 머금고 있었다.
―「우호적 감정」(240면)
시부의 말처럼 나 정말 미친 게 아닐까. 미쳐서 손윗사람에게 부려서는 안 될 표독을 부린 게 아닐까. 도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게 아닐까. 그의 말처럼 나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내 아이에게 지게 한 건 아닐까. 그런데…… 내가 미쳤다면, 정말 미쳤다면 무엇이 나를 미치게 한 걸까.
―「잉태기」(286면)
람슈타인, 모터헤드, 주다스 프리스트…… 잊고 싶었지만 깊숙이 잔존해 있던 여러겹의 기억. 귓가로 흘러들어와 온몸을 한바퀴 훑고서도 빠져나가지 않던 격렬한 열기.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두려워하지 않고 한길을 내달리고 같은 꿈을 꾸던 소년들……
―「메탈」(3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