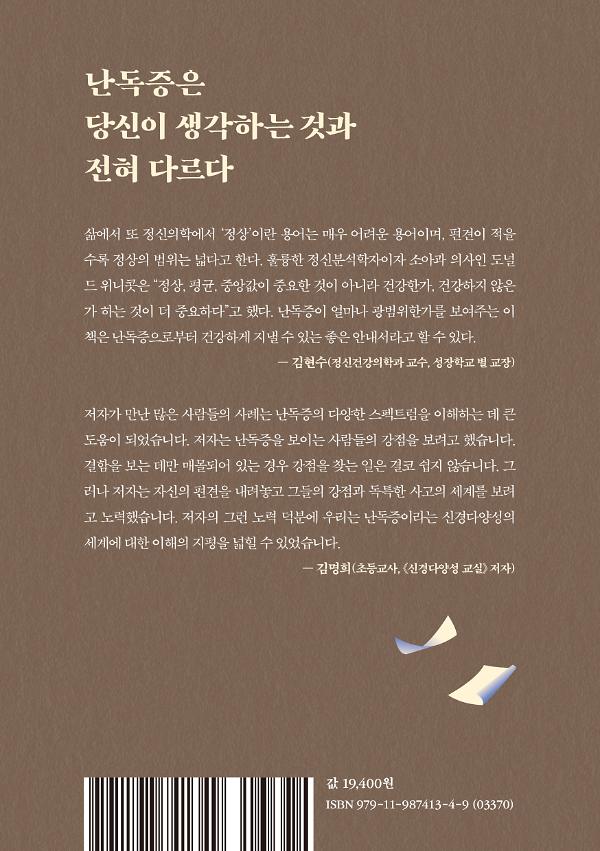이처럼 글자를 못 읽는 것만이 난독증의 주된 특징이 아니다. 다만 가장 눈에 쉽게 보이고, 학습에 제일 큰 어려움을 초래한 특징일 뿐이다. 난독증은 생각보다 넓은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 (12p)
‘난독증’이란 말을 ‘평면적’ 혹은 ‘2차원적 사고’와는 다르게 ‘3차원적 사고를 하는 뇌’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13p)
교사든 부모든 사람(아이)에 대해 신경다양성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그래야 사고의 유형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에 맞게 교육하거나 지원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사고의 유형이 다를 수 있다는 것과 그 사람의 (단점(결핍, 부족)이 아니라) 강점을 먼저 인식할 수 있다면 교육과 학습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을 뛰어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14p)
난독증이 있는 청소년과 성인 가운데 여전히 글을 읽지 못하는 비율은 1~2퍼센트 정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99퍼센트의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치료(?)’가 된 것일까? (29p)
서양의 많은 사람들은 난독증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고, 자신에게 난독증이 (심하게든 가볍게든) 있음을 알게 된 후, 비로소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다고 한다. (33p)
난독증은 우리 삶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때로는 아주 선명하게, 때로는 희미하게 형체를 드러내는데 그 모양과 정도의 경우의 수는 셀 수 없이 많다. 그래서 ‘난독증이 있는 사람 중엔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이 거의 한 명도 없다’라고 한다. (51p)
난독증은 대부분 단독으로 있기보다는 ADHD, 자폐스펙트럼(아스퍼거), 운동 협응의 어려움, 난산증(산술장애, 수에 대한 어려움), 난서증(쓰는 것에 어려움) 등과 둘 혹은 셋 이상 손잡고 다닌다. (51p)
어른들이 아이들의 다양한 두뇌적 특성에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그(녀)는 범죄자가 되거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도 하고, 영재나 성공한 사업가나 지도자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삶을 다채롭게 하는 이들에게, 또 그들이 속한 그룹에 어떤 이름을 붙여줄 것인가? (75p)
난독증의 두뇌는 문자에 익숙한 두뇌보다 시각적, 입체적, 패턴적이어서 훨씬 더 창의적인 경향이 있다. (113p)
난독증이 있는 많은 학생들은 차라리 ‘문제아’나 ‘공부를 안 한다’라는 소리를 듣는 편이 난독증이 있어서 글을 ‘못’ 읽는다는 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130p)
‘난독증’과 ‘문해력’리터러시’는 비례 관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난독증이 있는 사람이 문해력/리터러시가 아주 낮은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아주 뛰어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난독증이 있는 사람 중에 글로 읽는 문해력은 부족하지만 디지털 리터러시느 매우 뛰어난 사람도 있다. (234p)
난독증의 어려움은 충분하 이해와 지원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독증은 약점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배움과 사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6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