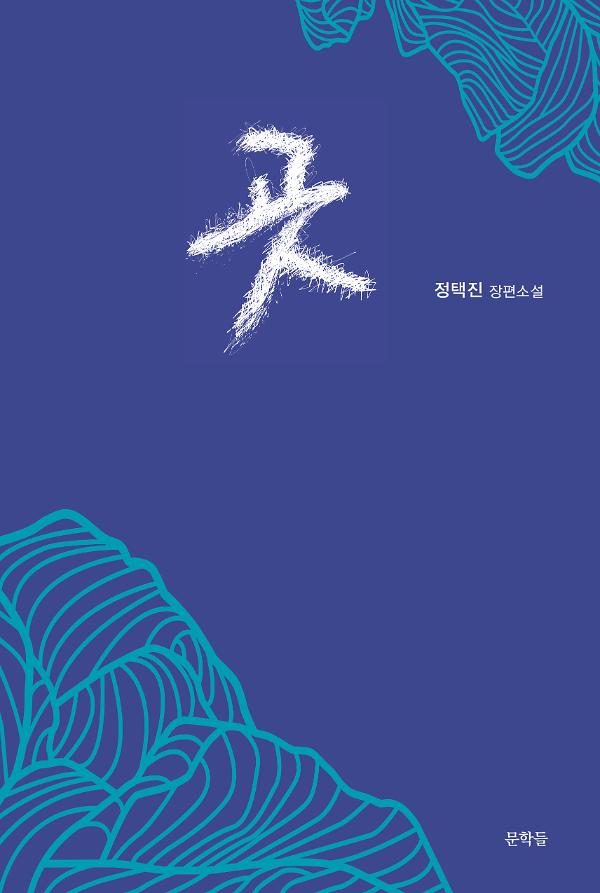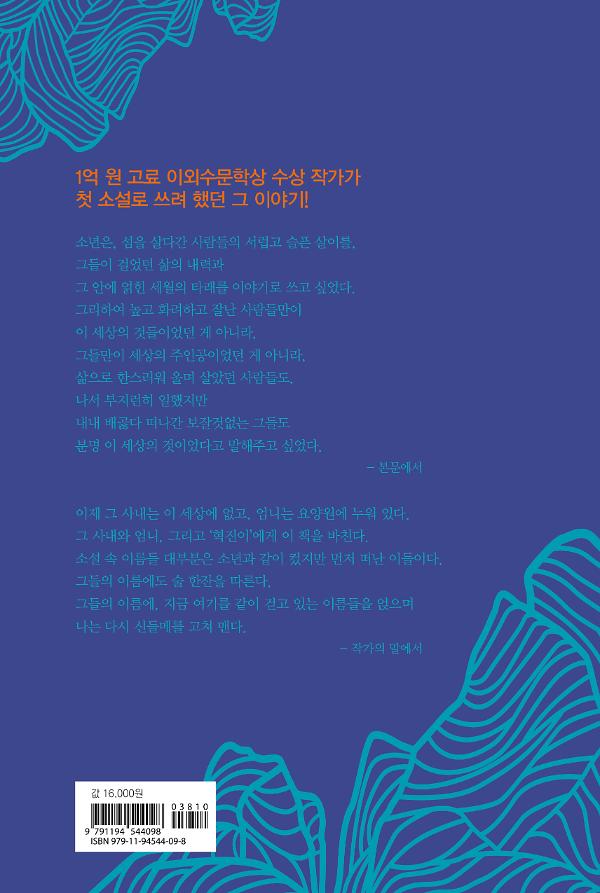1억 원 고료 ‘이외수문학상’ 수상 작가
정택진이 첫 소설로 쓰려 했던 그 이야기
2013년 소설 『결』로 제1회 이외수문학상(1억원 고료)을 수상한 정택진 소설가가 장편소설 『곳』(문학들 刊)을 펴냈다. 2019년에 발표한 『품』에 이어 세 번째 장편이다.
그간 발간한 그의 소설을 시간적 순서로 놓는다면 이번 소설이 그 첫 번째가 된다. 소설 『결』이 의형제를 맺었던 세 친구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풀어내는 한국 현대사의 이야기라면, 작가의 자전소설 성격이 짙은 『품』은 섬 소년과 도시에서 이사 온 소녀의 사랑과 꿈이 1980년 광주를 거치면서 상처 입고 뒤틀려가는 이야기이다. 장편소설 『곳』은 제7대 대통령 선거(1971년)가 있었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섬에 살고 있는 한 소년이 맨 몸으로 겪어내야 했던 세상의 풍파를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은 어른이 되어가는 어린 주인공의 심리적, 도덕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춘 성장소설의 성격을 띤다. 1970년대 남도의 어느 섬마을. 배가 아니면 드나들지 못했던 고립된 장소. 정치 성향에 따라 육체적·정신적 폭력을 감당해야 했던 야만의 시대. 소설의 화자이자 주인공인 염진혁은 중학교 입학 전에 집안의 대들보였던 아버지가 병환으로 사망하는 경험을 한다. 그리고 천금보다도 귀한 아들을 잃었다는 충격으로 몸져누운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난다. 동무들과 산과 들과 바다를 쏘다니며 놀아야 하는 어린 시절, 육지에 가 본 적도 없는 소년은 아버지와 할머니를 거의 동시에 잃고 가장이 된다.
소년의 아버지는 “앎의 허기를 채우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다. 집에 수십 권의 책이 있었으며, 가난했지만 오롯이 “신념을 지키자”라는 인생관을 굽히지 않고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려 했으나 그로 인해 병을 얻어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삶은 그대로 끝이 아니다. 그가 절치부심하며 살았던 모습은 향내처럼 아들의 삶에도 스며들어 그 흔적을 남긴다.
‘와신상담!’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어려운 한자어 같은데 그렇다고 무슨 뜻이냐고 물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 어감이나 어투로 보아 뭔가 참고 견딘다는, 그리고 뭔가를 되갚아준다는 ‘복수’와도 통하는 말인 듯싶다. 뜻은 모르지만 여하튼 말의 생김새가 그렇다. 말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뜻은 몰라도 그 본새로 말무늬를 짐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와신상담! 와신상담!’
‘당신과 함께, 와신상담!’
‘복수보다 강한 집념으로, 남이 훔칠 수 없는 정신적 유산을 상속하자!’
말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신념을 향한 복수보다 강한 집념’으로 ‘남이 훔칠 수 없는 정신적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 ‘와신상담’하라는 말일 터이다. 신념과 정신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일 것이다. 나는 몇 번이나 마음속에서 그 말들을 도슬렀고, 그 말들은 철식이형 팔죽지의 문신처럼 내 마음 어딘가에 깊이깊이 새겨지고 있었다.
-본문 중에서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나는 먼 하늘을 치어다보며 그 말을 중얼거렸”으나 “이상하게 어금니가 맞물려”졌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간 말들은 “멀리의 별들에” 가 닿는다. 소년은 평생 아버지의 유언을 품에 안고 살아갈 것이다. 정말 그랬을까.
이번 소설의 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작가는 이 소설을 가리켜 ‘첫 소설로 쓰려 했던 이야기였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출간된 정택진의 다른 소설들을 알고 있다. 과연 이 소년은 어떻게 성장했을까.
그게 돌섬의 이야기였고 그게 내 마음속 돌섬의 의미였다. 그런데 점점 그게 아닌 듯 해지는 것이다. 태풍 뒤에 훨씬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듯 과연 시련과 역경을 이겨냈을 때 더 밝고 환한 날이 기다리고 있을까. 지금 내 앞에 닥쳐 있고 앞으로 닥쳐올 역경을 헤쳐 나갈 발판도 하나 없는 허당의 현실에서 무슨 용빼는 재주로 그것들을 극복한단 말인가. 고등학교도 못 갈 이 초라한 형편에서 무슨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땀을 흘릴 수 있단 말인가.
- 본문 중에서
과거사를 바탕으로 쓰인 성장소설의 매력은 주인공의 앞길에 놓인 역사적 사실들을 독자들이 익히 알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소년은, 그리고 우리는, 엄혹한 한국 근현대사를 헤치고 살아남은 이들은 거울을 보고 묻을 수 있다. “와신상담”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와신상담”했는가.
구수한 전라도 입말로, 섬에서 살다간 사람들의 서럽고 슬픈 살이들을 기록한 이 소설을 통해 우리는 평범하나 결코 순탄치 않은 그들의 삶의 내력과 세월의 타래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염연히 세상의 주인공이었으며, 내내 부지런히 일했으나 한스럽고 배고파서 울다가 떠나간 보잘것없는 이들의 이야기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