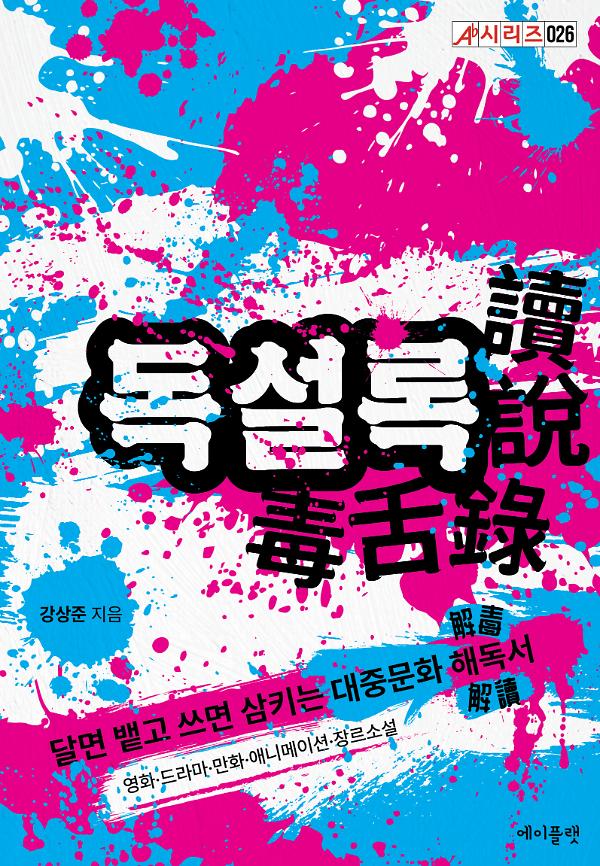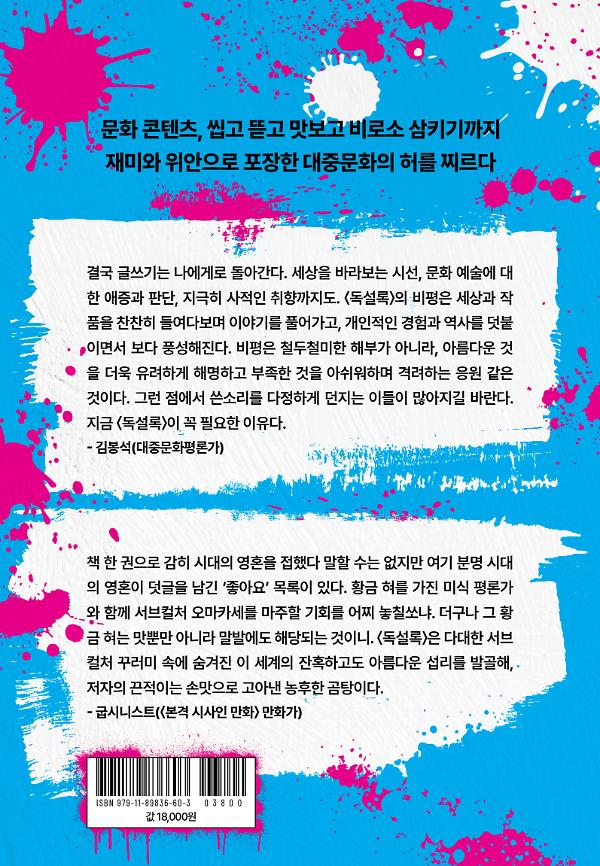먼 이야기만은 아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이를 위해 누군가는 평생을 바쳐 싸운다. 노동자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 싸우고, “태어나면서부터 흑돌을 양보받은 사람”에게 더욱 관대한 사회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생을 내던진다. 상처를 이겨내는 많은 방법 중 하나는 결국 싸워나가는 것, 즉 투쟁이다. 그게 복수로 치닫든 그렇지 않든 싸우는 인간의 모습은 그래서 처연하지만 아름답다. 그래서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엉뚱한 곳에서 좌초하지 않기를 바란다. 영원한 고통과 함께 살아가더라도 삶에는 충분히 살아갈 가치가 서려 있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다. 더불어 모든 복수자, 투쟁가의 삶 역시 폐허를 향하지 않길 바란다. 모두의 삶이 어느 순간 폐허를 밟고 일어섰으면 한다. 수많은 작품들이 지금도 응원하며 잊지 말라 일깨우고 있지 않은가.
-- 46p / 폐허로 남지 않는 삶을 위해, 〈더 글로리〉 中
단지 보통이 되고자,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자,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생을 꾸리고자 발버둥 치는 덴지는 꿈을 꿀 용기조차 없다며 손가락질받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마음속 항변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보통의 인간으로 살아남는 것조차 버겁다며 절규하는 젊은 세대의 절망, 그로 말미암은 타협과 안주의 의미까지 그대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의 꿈을 짓밟아 자신의 부를 이룬 기성세대를 향한 날선 오기는 그래서 더더욱 크게 호응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 227p / ‘꿈 배틀’ 권하는 사회, 〈체인소 맨〉 中
하지만 가장 어른인 척하던 겐도가 실은 가장 나약한 인간이었다는 것, 그것도 자신이 나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치졸한 욕망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신극장판의 결론일지는 몰라도 수년간 품어온 의문의 답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신지가 조용히 아버지를 깨우쳐주는 그대로 “그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인 일이었다고 하니 조금은 납득할 수 있었다. 또다시 밖으로 나오라고, 타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상이 그렇게나 강대한 아버지로 군림하던 겐도였다니. 이때만큼 안노 감독이 얄궂게 느껴진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에바에 매달리며 아직도 방구석에, 자기 세계에 틀어박혀 있는 너희들, 이제는 신지조차 아니야, 어느덧 겐도가 되었어, 라며 냉소하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 72p / 약한 인간을 위한 피날레,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 中
독재자란 별다른 게 아니다. 자신의 반대편에 선 이들의 입을 틀어막으며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야말로 독재자다. 예컨대 이태원 참사가 정부의 책임, 정부의 잘못이라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정부를 대표해 우선 앞장서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언행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아이러니하게도 관료들에게 호통을 치는 장면이었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봤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라며 윽박지르는 장면을 왜 언론에 공개했는지 그 속내까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전형적인 독재자의 수법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사카 고타로의 소설 〈거꾸로 소크라테스〉에서도 이를 아이들의 세계에 대비해 정확히 적시한다. “추상적인 말을 고래고래 외치며 화내는 건 독재자의 수법이야. (…)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공포를 안기면,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안색을 살필 수밖에 없게 되니까."
-- 251p / 각오한 자가 쏘아올린 작은 공, 〈더 포스트〉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