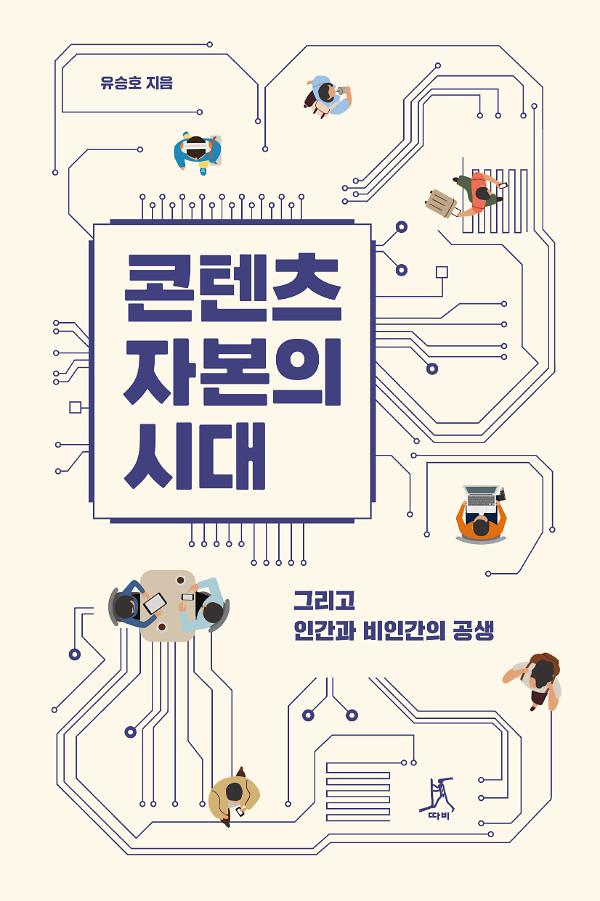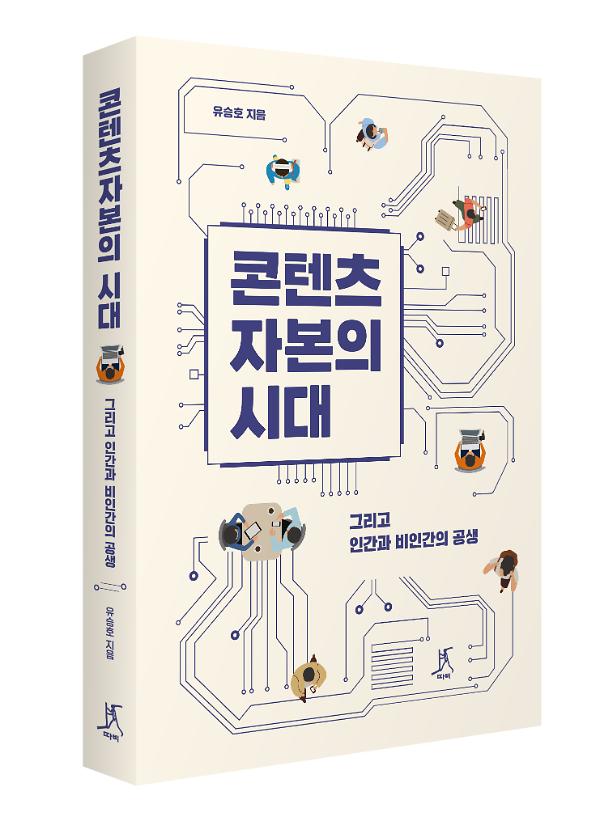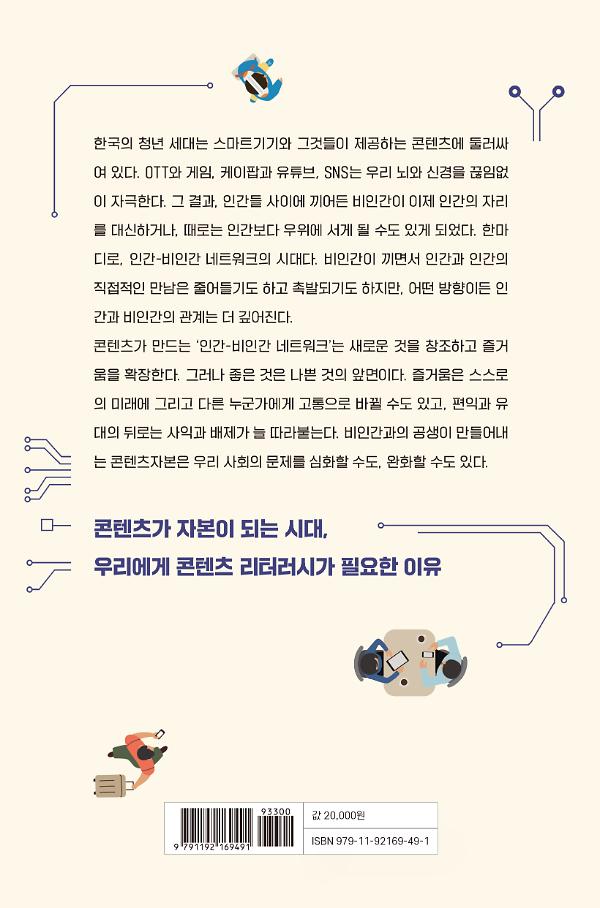콘텐츠가 자본이 되는 시대,
우리에게 콘텐츠 리터러시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매일 보는 영화나 드라마 속 스타는 인간일까, 비인간일까? 멋진 해외의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올린 SNS 속 저 사람은 인간일까, 비인간일까? 물론 그 영화배우와 그 SNS를 운영하는 사람은 분명 살아 숨 쉬는 인간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만나는 것은 현실에서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스마트기기와 그것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통해서 만난다.
요즘 청년들이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다고 걱정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방구석에서 손가락을 움직여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유사 이래 가장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만남과 소통은 ‘인간-비인간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진다. 도서출판 따비의 신간 《콘텐츠자본의 시대―그리고 인간과 비인간의 공생》은 ‘비인간의 부상’이라는 측면에서 콘텐츠가 바꾸고 있는 세상을 살펴본다.
콘텐츠가 만들어낸 인간-비인간 네트워크
20세기에 미국의 철학자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은 사람들은 ‘쾌락을 주는 가짜’보다 ‘고통도 있는 진짜’를 추구하기 때문에 ‘경험기계’에 들어가 현실을 잊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의 대학생들은 그런 가상 세계에 “안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고 되묻는다. 당연하다. 그들은 이미 가상과 실제가 섞여 있는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과 실제가 섞여 있는 현실, 즉 일상을 거대한 경험기계로 만든 것이 바로 콘텐츠다. 우리는 매일 OTT와 게임, 유튜브와 SNS를 통해 가상과 현실을 넘나든다.
SNS, 유튜브, 게임 같은 콘텐츠를 기반으로 우리는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무수한 만남을 경험한다. 콘텐츠를 매개로 한 새로운 만남은 기존의 만남과는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 직접 개입하는 비인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새로운 행동과 관습, 윤리들이 생성되고 있다.
비인간의 개입이 바꾼 콘텐츠 세상
콘텐츠가 제공하는 가상 세계는 굳이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이들의 삶을 ‘화려하게 치장해서’ 보여줌으로써 상향비교의 기계가 되고,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불편하지만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을 원천차단하고, 콘텐츠의 ‘가짜 감언’에 빠져들도록 ‘길들이기’한다. 그래서 혹자는 청년들이 타인을 만나고 세계를 경험할 기회를 스마트폰 때문에 잃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콘텐츠라는 경험기계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버튜버(버추얼 유튜버)는 사생활의 노출이라는 위험을 피해 콘텐츠 생산자에게 안전을 제공한다. 팀 기반 게임을 하면서는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 ‘지원형 영웅’을 맡는 유저가 되거나, 그 역할을 맡아 희생한 유저를 ‘최고의 플레이어’로 선정함으로써 협력과 호혜적 감수성을 배운다. 알고리즘이 연결해준 취향의 공동체는 온라인을 벗어나 오프라인에서의 관계를 촉진하기도 한다. 실제로 11년 동안이나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온 ‘하나 씨’는 위험한 현실로부터의 도피처를 콘텐츠의 세계에서 찾았을 뿐 아니라 게임을 통해 사람과 관계 맺는 법을 배움으로써 세상으로 나올 용기도 얻었다.
콘텐츠 리터러시가 필요한 까닭
비인간이 끼면서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인 만남은 줄어들기도 하고 촉발되기도 한다. 어떤 방향이든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는 더 깊어질 것이다. 콘텐츠가 만드는 ‘인간-비인간 네트워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즐거움을 확장한다. 그런 즐거움을 배경으로, 콘텐츠자본의 시대가 열렸다. 또한 콘텐츠자본은 기존의 경제자본과 학력자본과 무관하게 모든 개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회가 콘텐츠에서 돌파구를 찾는 이들에게 실제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또한 그렇게 만들어낸 콘텐츠가 오히려 기존의 편견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시 공간이 되어 누군가를 소외시키지 않는지에 관해서는 더욱 세심한 관찰과 고민이 따라야 한다.
좋은 것은 나쁜 것의 앞면이다. 즐거움은 스스로의 미래에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고통으로 바뀔 수도 있고, 편익과 유대의 뒤로는 사익과 배제가 늘 따라붙는다. 비인간과의 공생이 만들어내는 콘텐츠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심화할 수도, 완화할 수도 있다. 게임의 몰입성이 게임 폐인을 양산할 것인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될 것인지는 우리의 콘텐츠 리터러시에 달린 것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