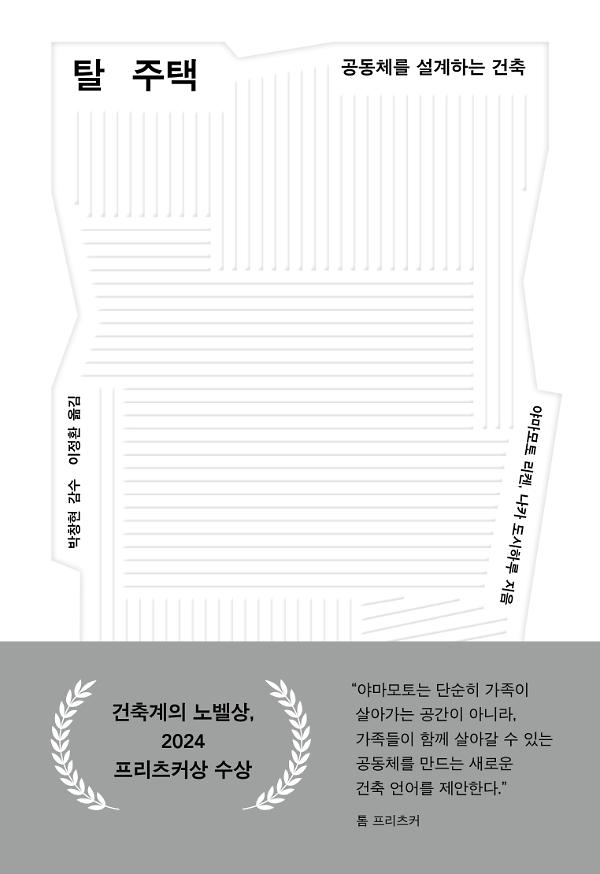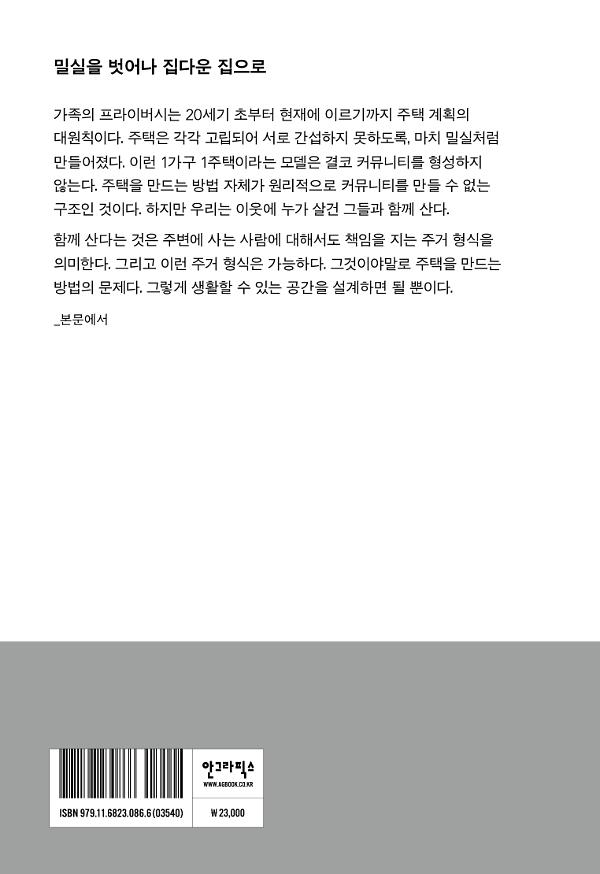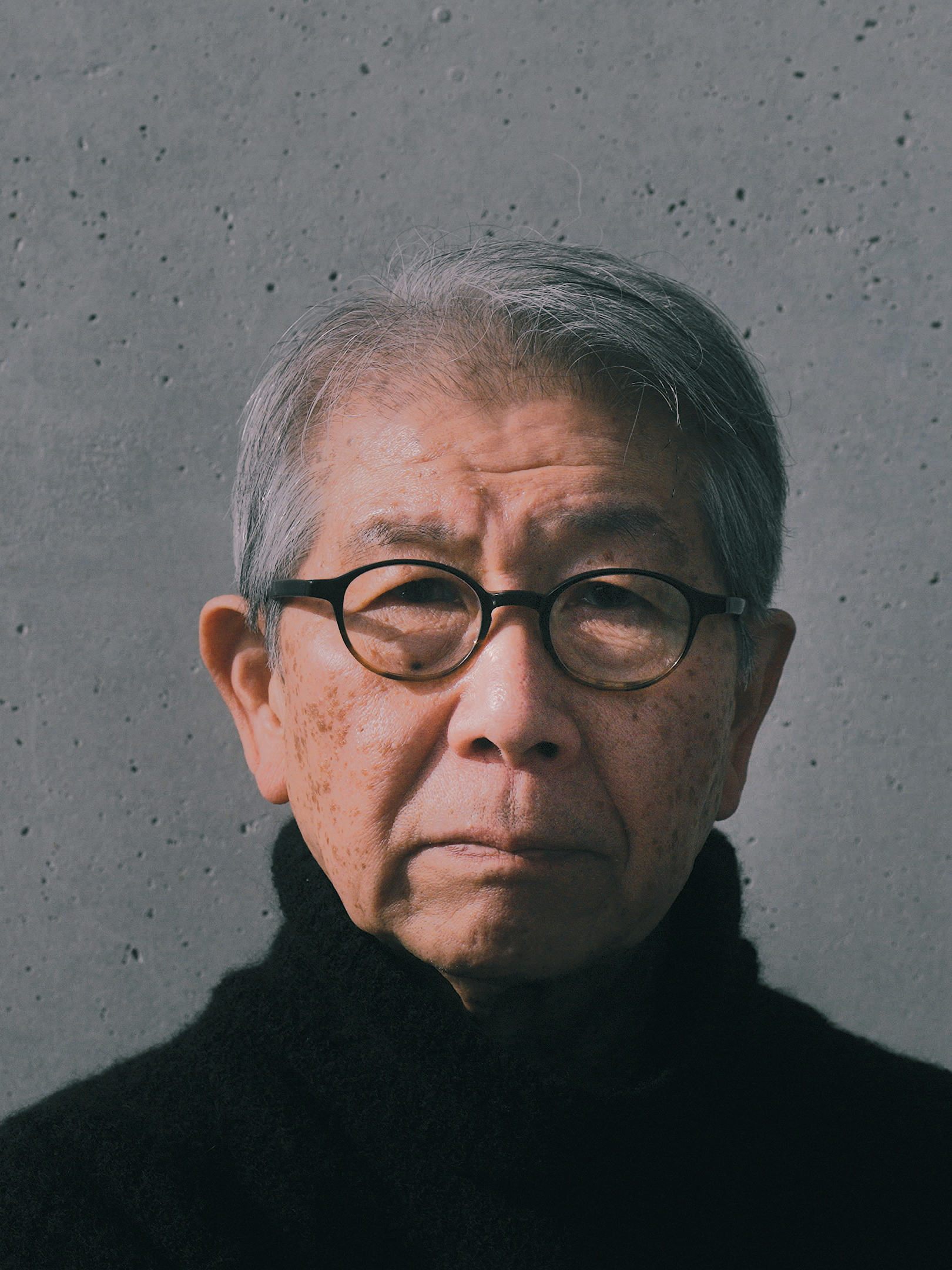“탈주택”이란 프라이버시에 지나치게 편중된 거주전용주택에서 벗어나자는 건축적 대책이다. ⋯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의문이자 새로운 거주 시스템에 대한 제안이다.
—「한국어판 출간에 부쳐」 9쪽/「들어가며」 16쪽
우리는 1가구 1주택의 내부에 갇혀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은 조금도
없이 ‘행복한 주거 양식’을 받아들였다. ⋯ 사실은 그 안에 완벽하게 수용되고 갇혀버린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된 것이다.
—「서문」 30쪽
건축가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현재의 핵가족이 진화의 최종 형식이라는
착각이다. 1가구 1주택은 핵가족을 위한 거주 형식이다. ⋯ 질 좋은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즉 최종 형태도 그 무엇도 아니다.
—「서문」 32-33쪽
건강한 자녀의 출생과 양육을 가족의 첫 번째 역할로 여겼다. 주택은 이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존재해야
했다. 그 결과 “1가구 1주택”이라는 주택 형식이 발명된 것이다. 그리고 이 1가구 1주택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정착했다.
—「모든 것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65쪽
한편 주택을 관리하는 행정에서 커뮤니티 문제는, 주민들의 자유의지를 어디까지 허락할 것인가 하는
주민 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다. 즉 행정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유의지를 존중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주택의 관리 시스템과 깊은 관계가 있다. ⋯ 주택 설계도는 주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관리
기술을 다룬 것이다.
—「공영주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93쪽
내가 현관을 투명 유리로 만들려 하는 이유는 안과 밖의 관계를 바꾸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리
현관에 저항감을 느끼는 건 1가구 1주택이라는 주택이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만약 작업실이라면
현관문을 투명하게 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작업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 주택」 133쪽
주택과 인프라는 하나가 되어 움직여야 한다. ⋯ 우리는 장소 고유의 지역사회(커뮤니티)를
지역사회권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장소에 어울리는 인프라 시스템이나 장소 고유의 경제를 주택과 함께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다.
—「비즈니스가 가능한 가설주택」 153쪽
커뮤니티라는 인간관계를 파괴해 온 다양한 원인 중에서도 핵심은 1가구 1주택이라는 주거 형식이다.
우리는 그런 주택을 계속 설계해 왔고, 이는 건축가들의 큰 실수였다.
—「커뮤니티를 만드는 방법」 186쪽
사회학자는 과거를 조사하지만 건축가의 일은 사회학자의 일이 끝난 지점에서부터 시작된다. 건축가의
관점에서 미래는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나는 커뮤니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런
공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커뮤니티를 만드는 방법」 20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