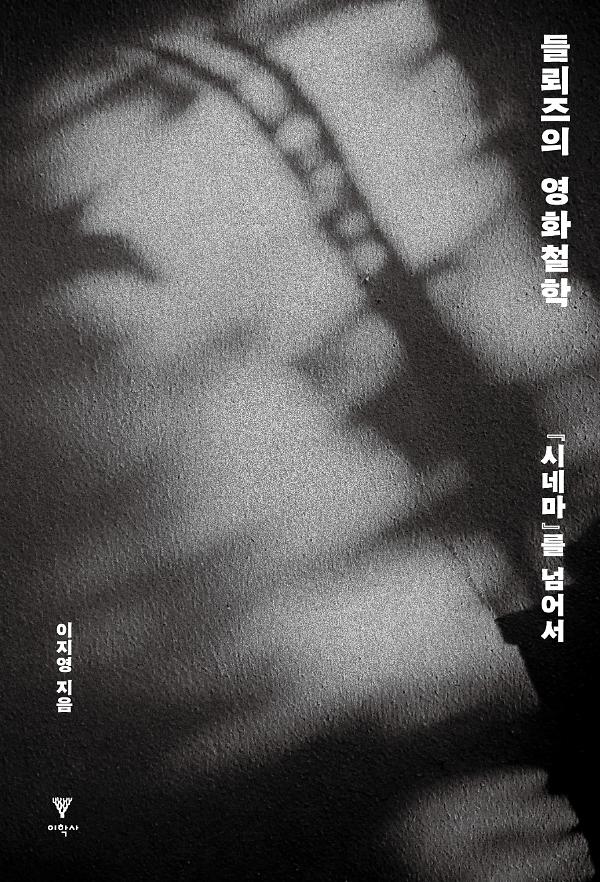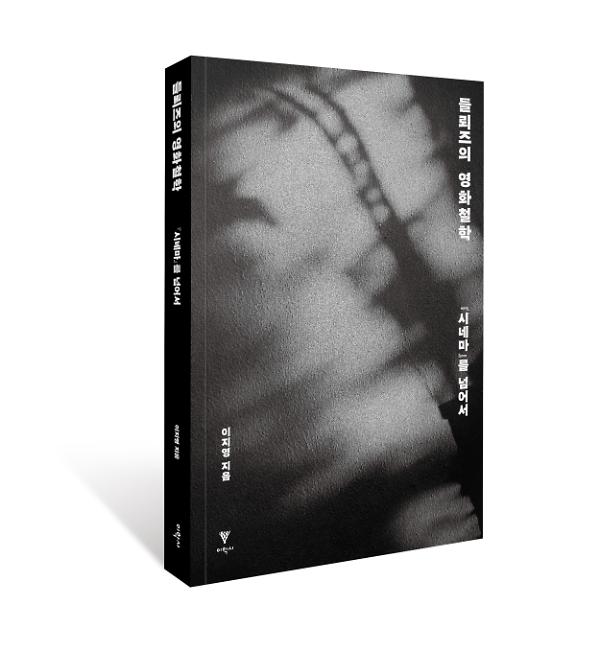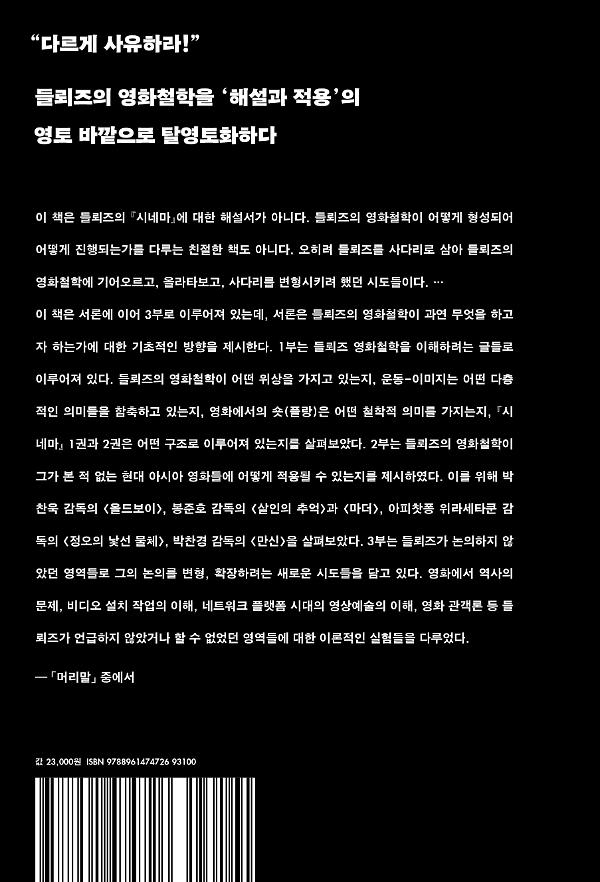p. 30~31
“철학과 영화의 유일한 목적은 다르게 생각하라는 것”이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보는 것의 문제”이다. 이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본다는 것은 기존의 영토화된 사유와 시각으로부터 탈영토화하여 새로운 사유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유의 창조란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좋은 힘이다.
p. 66
물질적 우주와 영화적 사유의 장을 운동-이미지의 내재성의 평면이라고 부르는 것은 들뢰즈가 영화를 단순히 예술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영화적 사유가 예술적 사유인 동시에 새로운 철학적 사유임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들뢰즈의 영화철학에서는 예술과 철학이 공명한다고 할 수 있다.
p. 105
어떠한 기존의 방법으로도 사유될 수 없기에 비사유는 결국 사유의 새로운 창조를 강제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유와 삶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들뢰즈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세계에 대한 믿음을 다시 주는 현대 영화는 인간과 세계 자체에 대한 새로운 사유 방식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들뢰즈가 영화 그 자체의 본질을 사유로 제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p. 151
들뢰즈의 주장처럼 영화가 그 본질에 있어서 사유 작용이라면, 윤리적으로 좋은 영화는 새로운 사유 방식을 제시하고 그럼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사유를 창조하게 하고 그에 따라 삶의 역능을 고양시키는 것이라는 해석 또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리가 만일 영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좁은 한계를 넘어 이전과 다르게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시키면서 삶을 확장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고귀한 일이겠는가.
p. 218~219
평행우주라고 불릴 만큼 거대한 이미지들의 아카이브가 매 순간 확장되고 있고 이미지와 기억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미지들의 거대한 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영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마커의 물음은 근본적으로 영화에 대한 존재론적인 물음이다. 마커는 일상 속의 상당수의 이미지가 우리의 기억을 대체해오고 있으며 그래서 이미지들의 변형과 이미지들의 관계들의 조정을 통해 우리의 기억의 내용들 역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쓰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마커에게 이미지들의 배치물로서의 영화는 우리의 과거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조정하고 변경하여 미래도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p. 290
관객은 영화가 촉발하는 무언가에 의해 감각적으로 사유하게 되는데, 이때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생각을 진정한 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 진정한 사유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관련되며, 그렇기에 영화를 통해 진정한 사유를 한다면 관객은 새로운 삶을 창조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관객의 변화와 생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쉽게 성취할 수도 없는 희망의 다른 이름이었다.
p. 311
고전 영화의 민중은 수없이 다양한 개인과 계급들에게 통일성 내지 정체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초월적인 주권 아래로 복속시키는 원리로서 역할을 했다면, 현대 영화에서 도래할 민중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복수적이고 다양한 상태로 남아” 있는 “독특성들의 집합”으로서의 다중multitude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다중 미디어 이용자-관객이 형성할 집단적 사유 능력을 가진 새로운 방식의 집단, 즉 ‘다중-관객’으로서의 관객-이미지들의 확장된 계열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관객이 오늘날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관람 방식의 변화, 영화의 정체성의 변화 등의 핵심이자 정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