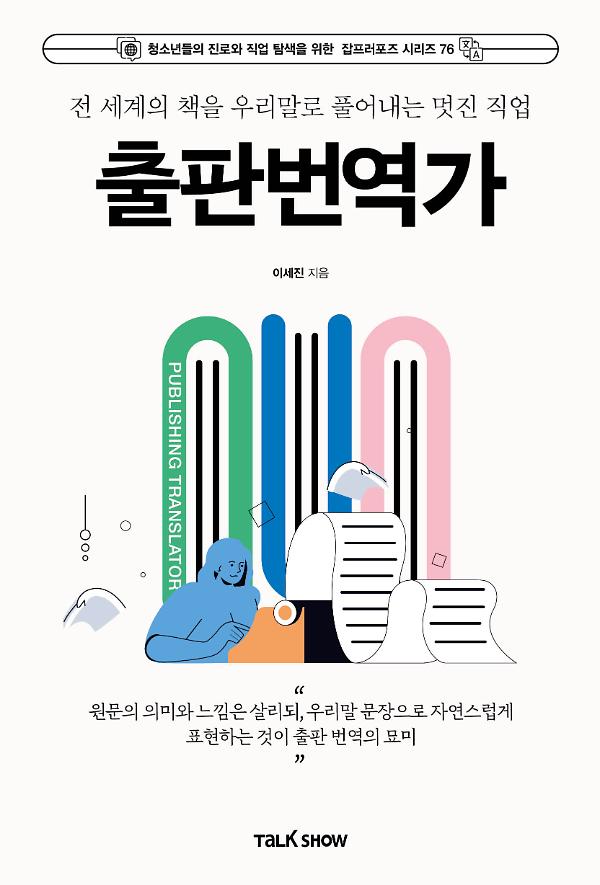출판 번역은 외국어(출발어)로 쓰여있는 책을 우리나라 사람이 읽고, 이해하고, 지식을 얻거나 감동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말(도착어) 책으로 옮기는 일이에요. 여기서는 ‘출판’이라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그 이유는 책으로 출판되는 문장은 일상에서 주고받는 입말은 물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문장이나 상품 설명서의 문장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출판 번역은 어느 정도 표준화된 틀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정제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문의 의미와 느낌은 살리되 우리말 문장으로 자연스러워야 하고, 외래어 표현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국어 순화를 염두에 두어야 하지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문체와 어휘의 미묘한 차이를 고려하여 원문의 분위기를 전달해야 해요. 문장을 구사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문법적 지식, 외래어 표기나 출판물 양식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번역 작업을 하는 스타일은 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읽고 난 다음에 한 문장 한 문장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는 빠르게 읽어 내려갈 때만 떠오르는 역어들이 있더라고요? (웃음) 이때 떠오른 역어들을 대충 메모해 놓고 본격적으로 한 문장씩 번역할 때 참고해요. 이렇게 번역을 끝내면 초고가 나와요. 저는 초고가 완성되면 고칠 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성향이라 문제가 있으면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해요.
외국어와 우리말은 일대일 대응 관계가 아니에요. 외국어 한 단어에 우리말은 여러 단어가 있을 수 있고, 우리말에는 없는 표현도 있고, 거꾸로 우리말에는 있는데 대응하는 외국어가 없는 예도 있죠. 예를 들어 에스키모어에는 눈을 가리키는 단어와 눈이 내리는 상황에 관한 표현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우리말에는 그런 표현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또 우리말에는 색깔과 관련한 부사가 많은데 외국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거든요.
번역가는 작가의 독특한 문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절대로 완벽하게 살릴 수 없다는 걸 알지요. 그럴 수 있다는 건 환상이고 번역은 항상 근사치예요. 어떤 번역학자가 쓴 글에서 “사람이 항상 맞춤옷만 입고 살 수 없다”라는 비유를 본 적이 있어요. 내 몸에 꼭 맞는 옷이 나를 가장 아름답게 빛내는 것도 아니고요. 약간 헐렁한 오버핏이나, 재단의 상궤에서 약간 벗어난 옷도 오히려 멋스러울 수 있죠. 번역도 그래요. 원문을 백 퍼센트 완벽하게 번역한다는 건 허상이에요. 가능하면 원문에 가깝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이고, 거기서 가끔 꽤 아름다운 효과가 빚어지기도 한답니다.
-『전 세계의 책을 우리말로 풀어내는 멋진 직업 출판번역가』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