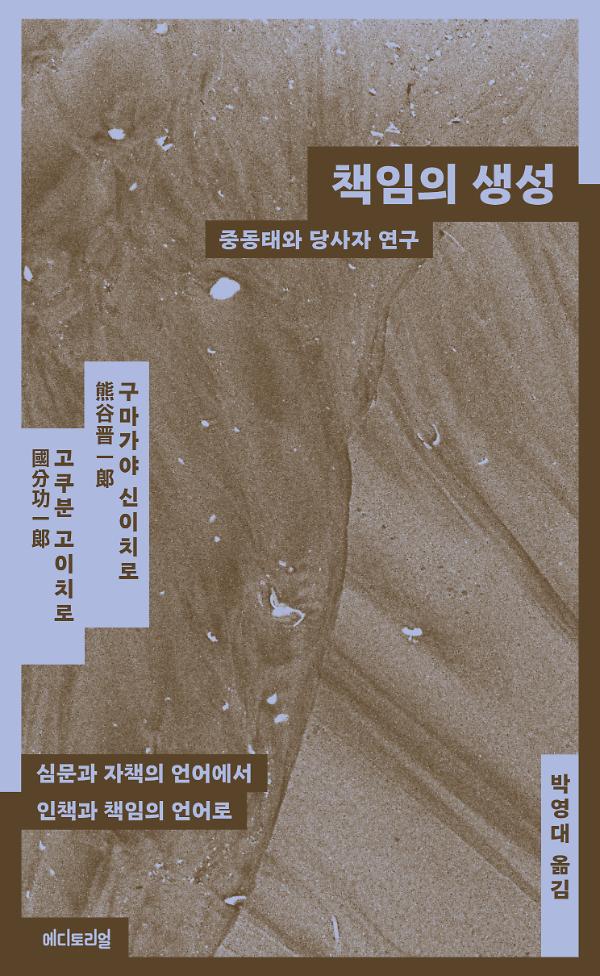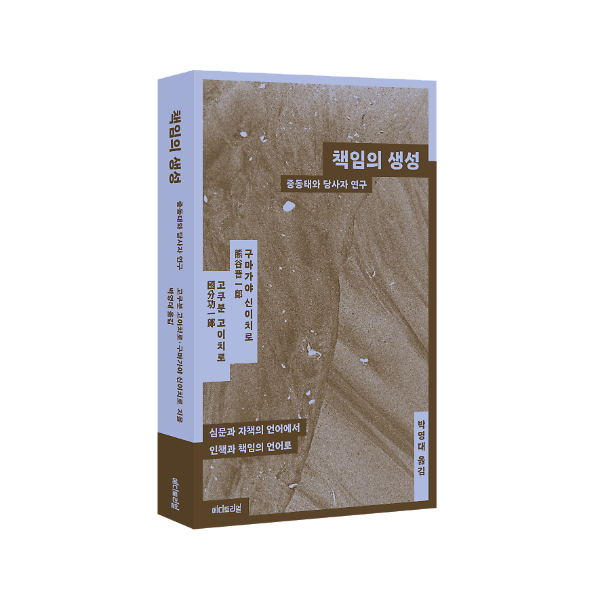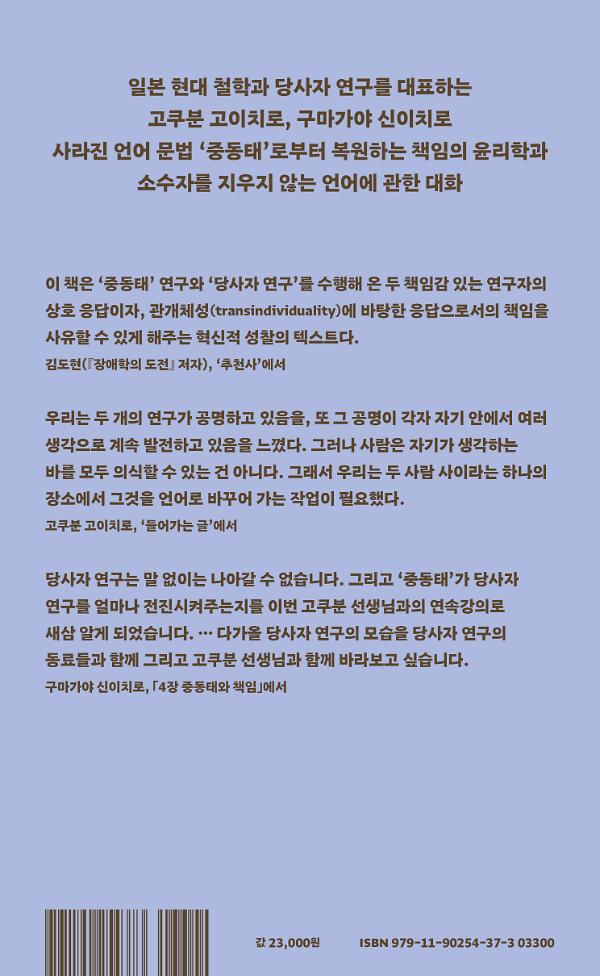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어디까지가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범위이고 어디서부터가 바꿀 수 없는 범위인가, 하는 그와 같은 물음에 대한 대답이 자명하지 않은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동료와 함께(동료라는 건,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지닌 타자’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은 경험을 한 타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떤 의미에서 유사한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연구해 나간다는 것은 혼자서는 꽤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를 ‘바꾼다’에 앞서서, 유사한 경험을 지닌 동료와 함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에 관해서 우선 그것을 ‘아는’ 일을 목표로 합니다. ‘바꾸다’에 앞서 있는 ‘안다’를 지향한 활동이 당사자 연구입니다. _32쪽
‘행위의 원천으로서의 의지’라는 생각은 한층 더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신의 의지로 행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 꼬드겨지거나 누군가에 의해 강제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행위한다는 것은, 그 행위의 출발점이 자신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지를 행위의 출발점으로 간주한다는 건, 그 의지가 순수한 원천으로 여겨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_90쪽
조금 전 고쿠분 선생님의 말씀에 겹쳐보자면 자폐성장애를 가진 이들 중에는 신체 안팎에서 들어오는 대량의 분자적인 어포던스가 의식으로 올라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절이 일어나지 않고, 의지가 일어나지 않는, ‘중동태’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미 소개한 대로 이러한 어포던스의 조정 과정이 모두 의식에 떠오르는 일은 매우 성가시며 방대한 정보의 조율과 ‘묶어내기’ 작업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요지부동의 일상을 보내는 것이라고 아야야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_165쪽
저는 내과 의사로 주로 생활습관병과 당뇨병을 진찰하고 있습니다. […] 우리 대부분이 치료로서 행하는 것은 ‘일단하기’로 이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심야에 라면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규칙을 의료진이 부여하거나 또는 환자 스스로 규칙을 만들도록 하는 게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처럼 잘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싶음’으로 이행한다는 것, 즉 무심코 중동태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이 실제로 치료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_199쪽
사회의 변화라는 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기 조절로 어떻게든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이지요. 히라이 씨는 ‘향상된 자유주의(advanced liberalism)’라고 표현합니다만, 국가의 지출을 가능한 한 억제해 ‘역시 자기 결정이 중요하지’라고 개인의 주체성을 칭송하면서도 ‘하지만 자기 책임이야’라며 사회의 모순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런 문제점에 관한 지적입니다. _247쪽
제가 뇌성마비인 신체를 사용하는 일은 저 자신의 신체를 ‘맛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움직여, 이놈아” 하고 주인공 쇼타로 군이 리모컨으로 ‘철인 28호’를 조종하듯 몸을 움직이려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배하려고 하거나 컨트롤하려고 하면 잘 안되는 거죠. 오히려 몸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말하자면 솟아오르는 움직임을 건져 올리는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_28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