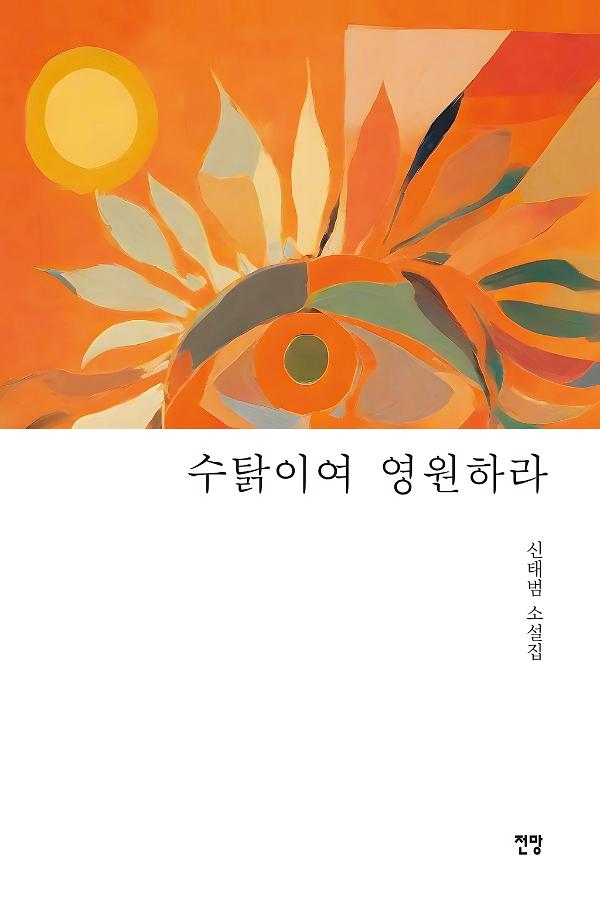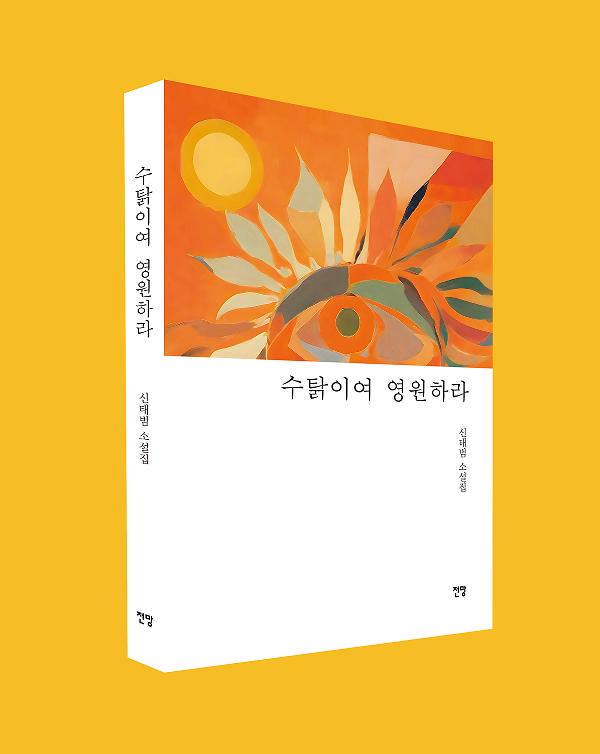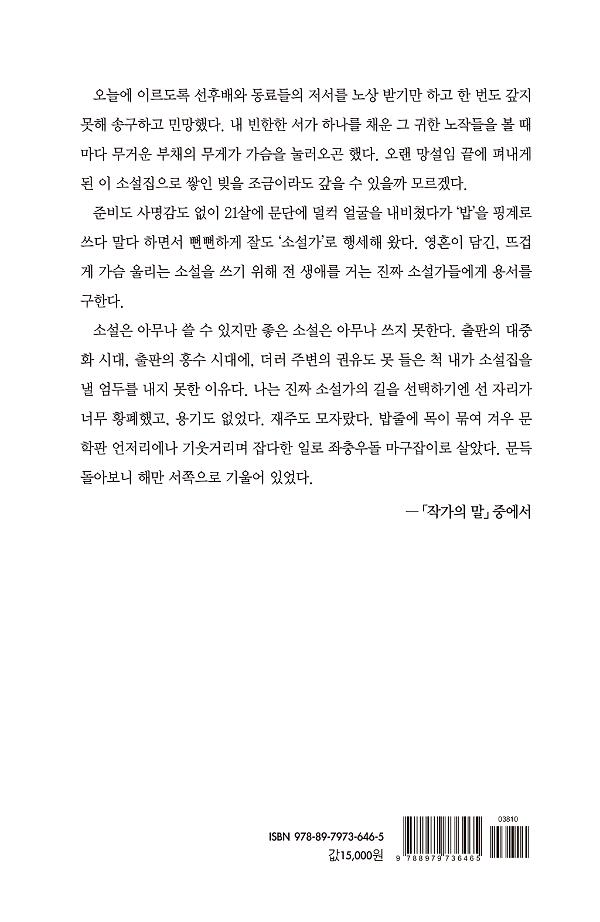현준은 술집 문을 여닫고 바깥으로 나섰다. 싸늘한 바람이 사정없이 뺨을 후려쳤다. 한기가 훅 끼쳐왔다. 걸음이 약간 휘청거렸다. 과음한 탓인가. 그는 가벼운 술기운을 느끼며 잡동사니를 넣는 작은 손가방을 겨드랑이에 바싹 꼈다. 몸을 움츠렸다.
보도로 나선 현준이 두어 발걸이나 옮겼을 때였다. 누군가 뒤에서 사정없이 그의 다리를 걸며 등을 떠밀었다. 그는 짧은 비명을 물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겨드랑이를 벗어난 손가방이 저만큼 길바닥으로 튕겨 나갔다. 웬 놈이 나타나 손가방을 재빨리 낚아채 도망치고 있었다. 퍽치기였다!
현준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오늘 받은 봉급이 봉투째로 담긴 가방이었다. 이런 개새끼! 그는 튕기듯 일어났다. 술기운이 확 달아났다. 눈에 불을 켰다. 그는 입을 사려물며 놈의 뒤를 맹렬하게 추격하기 시작했다. 달리기라면 자신이 있었다.
도망치던 놈도 현준의 추격을 눈치챘다. 놈은 일순 고개를 돌렸다가 더욱 사생결단 내달렸다. 좌우로 상가가 늘어선 2차선 이면도로는 놈이 섣불리 피해 도망갈 골목을 찾기가 어려운 길이었다.
두 사람의 간격이 급격히 좁혀지기 시작했다. 놈은 다시 흘낏 뒤돌아보았다. 놈은 위기감을 느낀 모양이었다. 얼마 못 가서 놈은 현준의 손가방을 길바닥으로 내동댕이치며 두 손을 번쩍 쳐들어 보였다. 항보옥-! 포기도 빠른 놈이었다.
현준은 가방부터 챙겨 들었다. 오히려 오기가 치솟았다. 그는 계속 도망치고 있는 놈의 뒤를 끈질기게 뒤따랐다. 사이는 금세 좁혀졌다. 어지간히 지치는지 놈의 헐떡거리는 숨소리가 현준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놈이 달리던 걸음을 세우며 갑자기 홱 돌아섰다. 현준도 반사적으로 걸음을 멈추었다. 불시에 일격을 당할 수도 있었다. 놈은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가파르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찬 공기에 허연 입김을 독기처럼 뿜어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잠시 호흡을 가누었다. 놈이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며 울부짖듯 소리쳤다.
“아이 씨팔! 가방 돌려줬으면 됐잖아, 왜 자꾸 따라오고 지랄이야!”
“…….”
앳된 목소리였다. 변성기도 거치지 않은 어린놈인 듯했다. 현준은 바짝 긴장했다. 물불 가리지 않는 어린놈이 더 위험할 수도 있었다. 현준은 놈을 붙잡아 어떻게 하겠다는 계산은 없었지만 내친걸음이었다. 그는 놈의 앞으로 조심스럽게 한 발 더 다가섰다. 흉기만 휘두르지 않는 한, 그는 일대일의 싸움이라면 어지간한 상대에도 자신이 있었다.
“이 씨방새야, 더 달려 보지 그래, 날씨도 추운데.”
“아아, 존나 재수 없네…”
놈은 기가 찬 모양이었다. 머리를 좌우로 절레절레 흔들며 아예 두 팔을 맥없이 내려뜨렸다.
“그래애 씨팔, 나 여기 꼼짝 않고 서 있을 테니까 잡아서 씹어 먹든지 고아 먹든지 꼴리는 대로 하세요.”
놈은 정말 제자리에서 몸을 축 늘어뜨리고 말았다. 자포자기였다. 현준은 놈의 앞으로 바싹 다가섰다. 놈은 그보다 키가 3~4센티는 작아 보였다. 짧게 깎은 스포츠형 머리였다. 얼굴의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현준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높아졌다.
“이 짜식 너, 중딩이지?”
“그게 어때서요?”
고개를 숙였던 놈이 고개를 번쩍 추켜들었다. 어린 티가 줄줄 흘렀다. 전혀 저항하려는 기색은 없어 보였다. 흉기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문득 동생 기준이 생각이 났다. 딱 그 또래일 때 죽었다.
“이 자씩이 큰 소리는? 대가리 피도 안 마른 놈이 어디서 퍽치기야.”
현준은 놈의 머리통에 꿀밤을 서너 대 먹였다. 기준의 얼굴이 다시 눈앞에 맴돌았다. 깊숙이 새겨진 가슴의 칼자국 하나가 따갑게 쓰라려 왔다. 꿀밤에도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던 놈이 문득 그를 올려보았다.
“날 이제 어쩔 건데요?”
현준은 풀썩 웃고 말았다. 이상하게 그렇게 맥없는 웃음이 비어져 나왔다.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꼴리는 대로 하시라니까요.”
“이 싸끄가 정말…”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요? 치안센터에 넘기시든지. 그런데 그 전에 저녁밥 한 그릇 사주시면 안 돼요? 오늘 종일 굶었거든요. 힘이 빠져 더 토낄 수도 없었다구요.”
현준은 다시 풀썩 웃고 말았다.
“말까는 주둥이는 싱싱해가지고, 굶지 않았으면 그냥 토낄 수 있었다 이거야?”
놈이 뒤통수를 한 손으로 긁적거리며 우물거렸다.
“그럼 퍽치기 할 생각을 안했겠네요.”
“이거, 견적이 안 나오는 놈이네.”
현준은 다시 놈의 머리통에 꿀밤을 서너 대 먹였다. 거친 바람이 한 떼 그들의 등을 후려쳤다. 도망치고 뒤쫓느라 한동안 잊고 있었던 추위가 온몸으로 바늘처럼 쑤시며 들어왔다.
―「꿈꾸는 겨울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