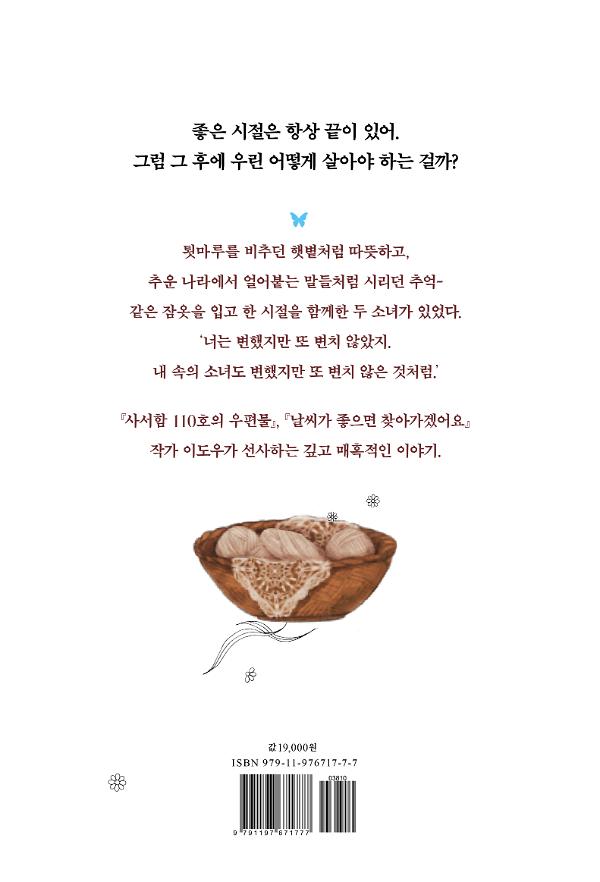책 속에서
41p
마당에 누워 올려다보는 밤하늘엔 뭇별이 반짝였다. 외가엔 많은 식구가 살았지만 내가 모암마을에서 지내기 시작한 처음 두 해를 돌이켜볼 때, 손을 내밀면 질감이 느껴질 것 같은 식구는 수안과 외할머니뿐이었다. 다른 이들은 그림자처럼 멀게만 느껴졌고 그들의 적절한 무심함과 거리감이 나를 외롭게도 편안하게도 만들었다.
51p
“왜, 잘 산다는데도 싫으냐?”
노파가 속을 떠보듯 물었지만 나는 시선을 더러운 방바닥에 고정한 채 입을 열지 않았다. 수안이 행복하지 않은데 나 혼자 행복해진다면 안 될 것 같았다. 아니, 수안뿐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얻는 행복의 평균이 있다면 나도 그 정도이길 바랐다. 혼자서 더 행복한 건 어쩐지 불안하고, 남의 행복에서 덜어온 듯해 편치 않을 것 같았다. 돌이켜보면 세상의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의 양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고 느꼈던 날들이 있었다. 누구 하나가 많이 행복하면 다른 하나가 그만큼 불행할지도 모른다고. 타인의 행복이 커진다고 해서 내 행복이 줄어들진 않는다는 진실을 깨닫기까지는 세월이 많이 걸렸다.
68-69p
그때 나는 마당의 아가위나무가 내 편이었어요. 가을 무렵 아가위 열매가 붉게 익으면 팔뚝에 오소소 소름이 돋을 만큼 예뻐서, 몇 알 따다 호주머니에 넣고 학교에 가곤 했습니다. (…) 나는 언짢은 일 서러운 일이 생기면 아가위나무에다 버렸습니다. 마당의 그 나무는 내가 버린 마음들을 다 받아내고 자랐습니다. 그래도 아가위나무는 아프거나 시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잠들고 나면 낮에 내가 버렸던 그 마음을 나무 또한 밤바람에 실어서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아가위나무도 나도 함께 숨 쉬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99-100p
우리는 상대방이 자기 낱말을 쉽게 맞히면 속을 빤히 들킨 듯해 샐쭉해지곤 했지만, 도무지 못 맞혀도 텔레파시가 통하지 않은 것 같아 서운해했다. 변덕스런 사춘기가 찾아온 탓인지도 몰랐다.
“난 말이야. 나와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좋아하는 낱말 열 개를 적어보라고 하고 싶어. 거기서 내 맘에 드는 낱말이 적어도 다섯 개는 보여야 사귈 수 있을 것 같아.”
수안이 심각하게 말했을 때, 그래서 모암분교 여자아이들이 수안과 놀지 않는 게 아닐까 나는 생각했지만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109-110p
그 시절 그 아이는, 어쩌면 세상에 없는 언어로 얘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서 잊혀져가는 꼭꼭 숨어 있는 말들을 찾아 배우고 싶었나 봅니다. 늘 쓰던 흔한 언어로는 말이 되어 나오지 않을 때. 이미 죽은 언어라는 사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일 때. 살다 보면 나도 그런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언어도 내 마음을 표현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말입니다. 하지만 말도 글도 쉽게 만들거나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럴 때면 나는 그냥 침묵합니다.
159p
나는 어딘가 조용한 기쁨에 젖어 말했다.
“나는 이다음에 나무가 있는 집의 주인이 될 거야.”
미주는 커다랗게 끄덕였다.
“그거 좋지. 나무가 있으려면 마당이 넓어야 할 테고. 마당이 넓으면 아무래도 부잣집이지.”
“부잣집이 아니라도 나무가 있으면 돼. 탱자나무 울타리도 좋고.”
미주는 그럼 그럼 하며 동의해주었다. 그건 왠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그 순간 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언젠가 큰 나무가 자라고 향기로운 울타리를 두른 집의 주인이 될 것만 같았다. 그 집에서 매일 저녁 무렵 현관에 앉아 내 마당을 내다보면서 이날을 생각해야지.
210-211p
“그 한자 뭐야?”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퉁명스러워졌다. 충하는 책 표지를 흘끔 보고 대답할까 말까 망설이는 기색이더니, 체념한 듯 입을 열었다. 입술을 모았지만 쉽사리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우 우
“…우수.”
『필립 마로우의 우수』. 끝까지 말 안 할 줄 알았는데 뜻밖이었고, 게다가 하도 힘겹게 대답을 하니 미안한 말이지만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형사구나. 범인 이름치곤 낭만적이니까.”
충하는 국민체조 목운동처럼 고개를 한 바퀴 돌리고는 다시 애썼다. 타 타
“탐정.”
“그러니까.”
“혀, 혀, 형사랑 타타탐정은… 다… 다… 다, 달라!”
힘들여 말을 끝낸 충하는 미간을 확 찌푸리며 외면해버렸다.
304-305p
“귀에서 기차 소리가 들려.”
우리는 책가방을 들고 정류장에 서 있었다. 수안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비로소 알겠다는 듯이 말했다.
“전부터 이 소리가 뭔가 했는데 방금 깨달았어. 기차가 멀리서 다가오는 소리야. 철길을 따라서 바퀴를 굴리며 희미하게.”
이명이 들리는 걸까. 가끔은 나도 귀에서 윙윙 바람소리가 들릴 때가 있지만 금세 사라지곤 했다. 외할머니도 절에서 치는 종소리 같은 게 날 때가 있다고 했었다.
“소리가 종일 들려?”
“아니야. 들렸다 안 들렸다 해. 아마 기차를 타라는 계시가 아닐까?”
농담인지 진담인지 수안은 웃지도 않고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386p
충하는 편물부만 둘러보고는 오래 머무르지 않고 강당을 나섰다. 방명록 작성도 하지 않았다. 벽돌이 깔린 담장 길을 따라 교문까지 바래다주면서 내가 물었다.
“다른 전시는 안 봐?”
“별 관심 없어.”
“그럼 내 것만 보러 온 거야?”
충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천천히 힘주어 말했다.
“가끔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난, 이 읍에서 만난 여자아이들 가운데… 비교적 널, 편애하는 것 같아.”
나는 풋 웃으면서도 코끝이 찡해왔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함께 걷는 동안 바닥에 깔린 벽돌을 밟는 데만 신경 쓰는 척했다. 강당에서 교문까지 길은 너무 짧았다.
398p
“주말에 방 보러 가는데… 같이 가자.”
수안은 돌아보지 않았다.
“방앗간 옥탑방이래. 알아두면 놀러올 수 있잖아.”
“…됐어. 놀러 안 갈 거야.”
마음을 닫아버린 듯 조용한 목소리가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언제나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사촌은 그랬다. 그런 점이 함께했던 시절 동안 나를 힘들게도 했지만, 그 순간은 다 고마운 기억뿐인 것 같았다. 습한 바람이 불어와 오동나무 옷장 문이 삐걱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