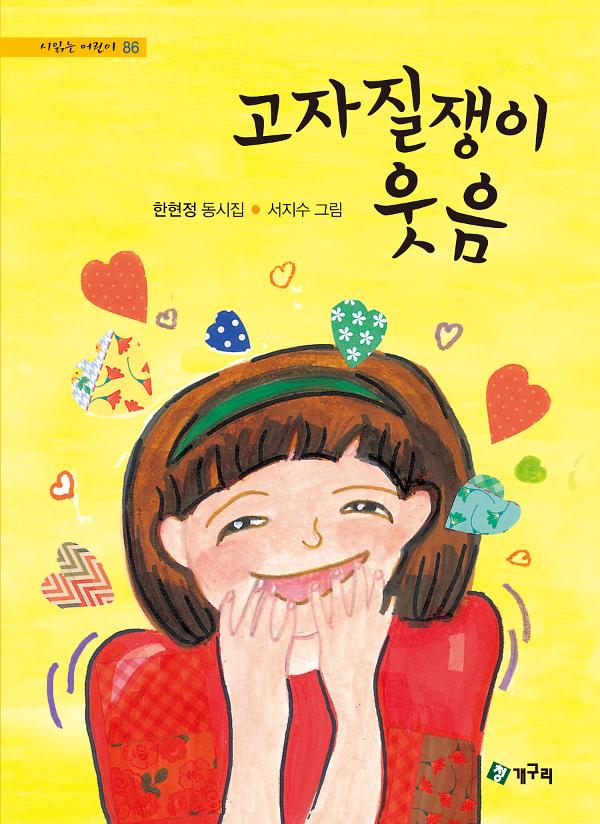차가운 현실을 녹이는 따뜻한 동시
동심이 가득한 세계로 어린이들을 초대해 온 청개구리 출판사의 동시집 시리즈 〈시 읽는 어린이〉 86번째 도서 『고자질쟁이 웃음』이 출간되었다. 이 시집은 한현정 시인의 첫 동시집이다. 그는 2002년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동시 「야단맞은 날」로 등단하였다. 이후 동시를 넘어 소설까지도 창작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켜켜이 쌓인 창작열과 문학에 대한 갈망이 이 동시집에 가득 담겨 있다.
이 동시집에서 시인은 기존의 동시에서 주로 보였던 자연에 대한 예찬을 최대한 피하고, 대상에 대한 새로운 시적 해석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삶을 주로 담았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이고 생동하는 장면이 많다.
엄마에게 야단맞은 날/투덜투덜 훌쩍훌쩍/자전거를 탄다//
시장길 지나면 논둑길/울퉁불퉁 털털털/마른 길 골라 달리면//
동생은 왜 안 때려?/눈물 한 방물 더 나고//
강둑 끝 자갈길/자그락 자그락 덜그럭 덜그럭//
길이 왜 이래!/내려서 돌멩이 한 번 걷어차고//
강바람이 휘이익/주먹손으로 콧물 한 번 훌쩍//
어라!/살얼음에 햇빛이 내리네?/버들강아지 벌써 꽃눈을 틔웠네!//
씽씽 쌩쌩/신나게 돌아오는 길//
멍멍 컹컹/자전거 꽁무니에 와라락/따라붙는 강아지들.
―「야단맞은 날」 전문
이 작품은 한현정 시인의 등단작이다. 엄마에게 꾸중 들은 뒤 집을 뛰쳐나온 아이는 자전거를 탄다. “동생은 왜 안 때려?/눈물 한 방울 더 나고//(중략)//길이 왜 이래!/내려서 돌멩이 한 번 걷어차”는 화자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하다. 당시 대구매일신문에서 심사를 맡은 권영세 동시인은 “시가 살아 움직인다는 것과 덩달아 시 속 화자의 동일한 행동에 빠져들게 되”고, “시의 장면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시어 선택이 작가가 설정한 대상 독자의 수준에 매우 적절하며, 생략과 압축이 조화를 이룬 시적 함축미, 군더더기가 없는 간결한 표현과 의성어와 의태어의 적절한 사용은 시의 생동감을 더했”다는 심사평을 쓴 바 있다.
화자는 집을 나온 초반에는 보이는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차츰 격한 감정이 가라앉자 살얼음에 햇빛이 내리는 것과 버들강아지가 벌써 꽃눈을 틔운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울퉁불퉁 털털털” “덜그럭 덜그럭” 거칠고 투박하게 달리던 자전거도 어느새 “쌩쌩” 시원하게 달린다. 자전거 꽁무니에 어린 강아지들이 와라락 따라붙는다고 표현한 것 또한 화자가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있음을 드러낸다. 화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억지로, 성급하게 끝맺는 우를 범하지 않았기에 더욱 아이의 마음이 살아 있는 작품이다.
나무오리 한 마리/긴 장대 끝에 앉았습니다//
파란 호수/멀리멀리 헤엄치고 싶어//
떠가는 흰 구름만/콕콕,/쪼아 봅니다.
―「솟대」 전문
시인은 「솟대」에서 긴 장대 끝에 묵묵히 앉아 있는 나무로 된 오리의 욕망을 독자에게 보여주고 있다. 푸르른 하늘이 꼭 ‘파란 호수’처럼 느껴졌는지 나무오리는 멀리멀리 헤엄치고 싶어 한다. 아마도 나무오리는 자신이 진짜 오리가 아니라 ‘솟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하다. 솟대의 욕망이 좌절되지 않고 “떠가는 흰 구름만 콕콕” 쪼는 행위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는 나무오리를 바라보는 시인의 안쓰러움이 주된 정서이다. 그러나 나무오리의 주체적인 행동(흰 구름을 쪼는 행위)으로 시가 끝남으로써 나무오리는 시에서만큼은 단순한 나무토막이 아니라, 구체성과 생명성을 지니게 된다. 「가오리 연」에서도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겨울 하늘에 떠 있는 ‘가오리 연’은 진짜 ‘가오리’가 되어 파란 바다 흰 파도 속으로 헤엄쳐 달아나고만 싶다. 이러한 욕망은 아이가 쥐고 있는 연줄에 의해 좌절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연줄이 낚싯줄이 되고 아이는 노련한 어린 어부가 되는 과정이 생생하게 펼쳐지면서 잠시나마 ‘가오리 연’이 ‘가오리’가 되고 이 과정에서 묘한 해방감이 드는 것은 왜일까.
한현정 시인은 현실 속 아이들의 삶을 다룬 작품을 다수 창작했다. 엄마에게 동생을 빼앗겨 서운하다거나(「질투」), “선생님은 왜 자꾸 손 아프게 일기를 쓰라고 할까?”(「억지로 쓰는 일기」)라며 툴툴거리고 불평하는 아이들의 귀여운 고민도 있지만, 개선되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는 시인의 불편한 속내가 담긴 작품도 많다. 비가 쏟아져 내리는 날 고단한 밤을 보내야 하는 사정을 그린 「반지하 단칸방」, 구제역에 걸린 소들을 땅에 묻으며 마음 아파하는 가족의 모습을 담은 「죽은 소들에게」, 엄마를 기다리는 외로운 아이읨 마음을 그린 「볓빛」과 「쇠도 운다」, 집에서 학교로, 학원에서 다시 집으로 뛰어놀 시간도 없이 돌고 도는 힘겨운 아이들의 모습을 다룬 「시간표에 갇힌 아이들」, 지역아동센터에서 삼시 세끼를 때우느라 신나기는커녕 배고프고 외롭기만 한 아이를 그린 「방학」 등의 동시가 그러하다. 현실에 등 돌리지 않으려는 작가가 미덥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딛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더욱 빛이 나는 작품들이다. 해결해주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될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