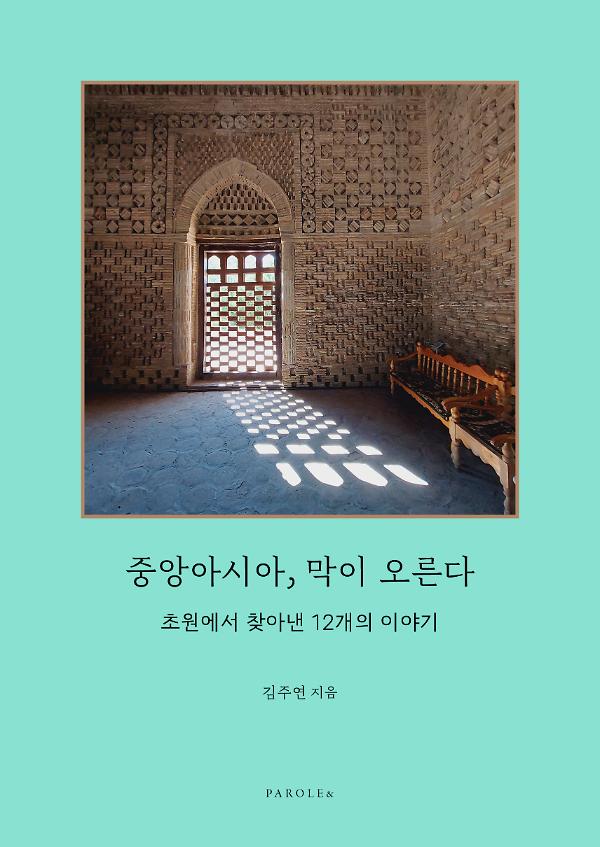예로부터 중앙아시아는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다. 사막을 따라 길게 이어진 상인들의 낙타 행렬에는 진귀하고 값진 물건들뿐만 아니라 머나먼 땅에서 전해지는 기이한 이야기들과 새로운 소식들이 함께 실려서 동서로 흘러갔다. 먼 길을 떠난 상인들이 하룻밤 쉬어 가던 카라반사라이는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소소한 정보가 오가는 이야기의 장(場)이기도 했다. 자연스레 이곳에는 온갖 지역에서 전해진 이야기들이 쌓였고, 입담 좋은 이야기꾼들이 끊임없이 배출되었다.(8~9쪽)
알마티의 아바이 동상부터 타슈켄트의 나보이 문학박물관에 이르기까지, 중앙아시아의 위대한 작가와 관련된 곳을 지날 때마다 생면부지의 이름들을 마주하면서 새삼 나의 무지를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돌이켜 보니 이것이야말로 이번 방문에서 중요한 성과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는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48~49쪽)
장엄한 산맥과 끝없는 초원, 새파란 호수에 이르기까지 키르기스스탄의 자연은 확실히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색채와 신비한 분위기로 가득하고, 어딜 가나 절로 이야기가 생겨날 듯한 풍경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 아이트마토프라는 걸출한 작가를 빚어낸 것 또한 바로 이 나라의 신비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아닌가 싶다.(70쪽)
어떤 책이나 문서에도 의존하지 않은 채, 오로지 기억과 노래에 기대어 초원의 바람과 하늘과 별에 스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마나스치와 박시들은 오늘도 중앙아시아 곳곳을 돌아다니는 살아 있는 역사책이자 이야기로서 그 자체로 하나의 전설이 되고 있다.(87쪽)
이처럼 『탬벌레인 대왕』은 아미르 티무르를 모델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티무르에 대한 역사적 전기라기보다는 그에 대한 당대 유럽인들의 이중적인 시선과 모순된 욕망을 읽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작품이다. 문학으로 새로 쓰인 역사 속 인물들은 늘 그들이 살아간 시대가 아니라, 그들을 소환한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새삼, 문학을 쓰고 읽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비추는 작업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다.(109쪽)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하얀 황금’이라 불리며 전 세계 자본가들의 열망을 부추겼던 중앙아시아의 목화는 당대 내로라하는 강대국들이 모두 탐내던 보물이었고, 그로 인해 이 지역은 거대한 제국들이 경합하는 무대가 되었다. 당시 이 지역을 가장 절실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탐냈던 나라는 대영 제국과 러시아 제국이었는데, 두 나라 사이의 오래고도 치열했던 중앙아시아 쟁탈전을 후세는 ‘그레이트 게임’이라 불렀다.(111~112쪽)
에릭 오르세나는 “참을성 있게 기다릴 자신이 없는 사람은 여행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무릇 여행이란 공간 속에서의 모험인 동시에 시간 속으로의 모험이기 때문이다. 타지키스탄 국경에서 보낸 그 10시간은 아마도 내가 겪은 가장 길고 호된, 낯선 시간 속으로의 모험이었던 것 같다.(165쪽)
하지만 정치적인 측면을 떠나 이 지역 근대화와 문예부흥을 꿈꾸었던 자디드 운동가로서 그의 업적은 분명 의미가 있으며, 그를 비롯한 자디드 운동가들의 흔적은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의 여러 학교와 박물관, 극장과 도서관 같은 문화 시설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중 타슈켄트의 한 박물관에서 보았던 자디드 운동가들의 연극 공연 사진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한데, 무대 앞에 나란히 서 있는 그들의 고요하고 신중한 눈빛은 차갑게 얼어 있기보다는 반짝이는 생기를 머금고 있었다. ‘생기’란 꿈을 가진 사람을 드러내는 조용한 웅변이라고 했던가. 비록 실패에 그쳤다 할지라도 한때 누구보다 뜨겁고 치열한 꿈을 품었던 그들의 젊음과 열정은 그 눈빛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었다.(184~185쪽)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학자가 태어나 활약했던 중앙아시아는 진정 지혜의 땅이자 학문의 땅이라 할 수 있다. 동서양의 교차로로서 이슬람 문명권과 유럽 문화권의 학문을 잇고 고대 그리스의 지적 유산을 근대로 계승함으로써,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두 세계를 연결하는 위대한 고리가 되었다. 한편, 중앙아시아의 위대한 학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수학, 철학, 천문, 지리, 역사, 언어 등 다양한 영역을 폭넓게 공부하고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업적을 남긴 ‘전방위적 지식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223쪽)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이런 박물관이 존재하는 것도 놀라운데, 컬렉션의 방대한 규모와 탁월한 안목은 더욱 놀랍다. 대체 소련 시대 최고의 아방가르드 미술품들이 왜 이 머나먼 누쿠스 땅에 소장되어 있는 걸까. 여기엔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연이 숨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미술관과 소장품 전체는 이고르 사비츠키라는 한 개인의 열정과 의지의 산물이다.(230쪽)
전혀 모르는 낯선 이를 경계하기보다는 일단 손을 내밀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면 뭐든 나눠 먹으려 하고, 도움을 청하는 손길에는 두 배, 세 배의 호의를 베풀어 주는 그들의 이 따스한 마음이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는 이슬람 문화권의 영향일 수도 있고, 거칠고 황량한 자연환경 덕에 오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 절로 사람을 반가이 맞이하는 풍습이 생겼을 수도 있고, 실크로드 교역으로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각자 필요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곳이다 보니 언젠가 보답받으리라는 믿음으로 미리 베푸는 선의가 전통으로 내려온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한 번이라도 이들의 진심 어린 친절과 호의를 경험하고 나면, 누가 뭐래도 이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275~27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