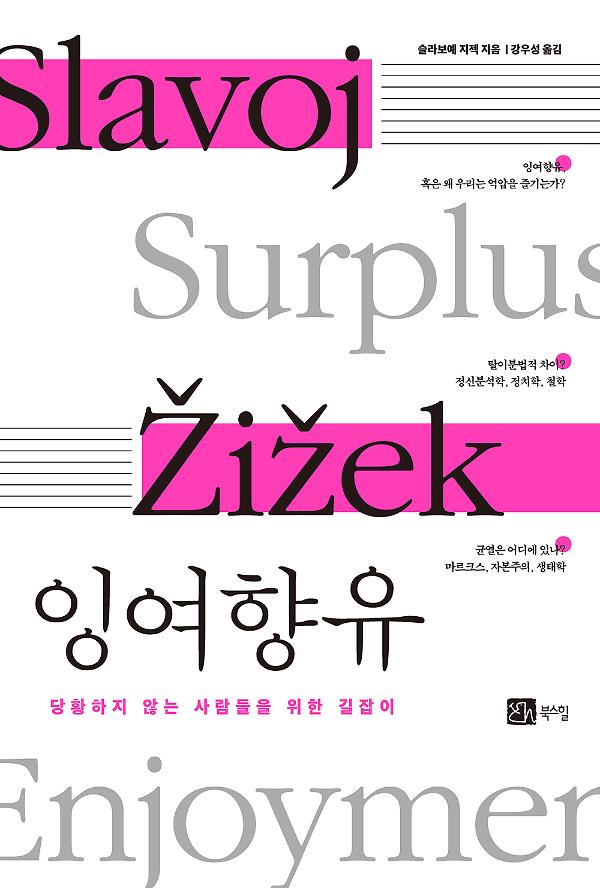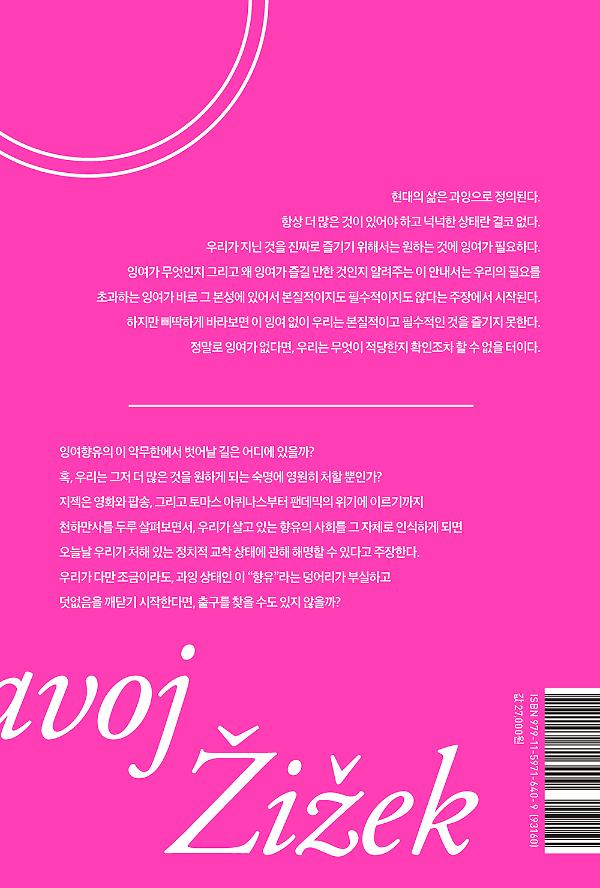우리는 왜 억압 자체를 즐기는가?
잉여향유의 메커니즘과 자본주의 체제의 상관성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긴급한 정치적 의제를 놓고 잠시 실천적 사안들과 씨름했던 저자가 이론적 대결의 장으로 돌아와『잉여향유』에서 펼쳐 놓는 새로움은 크게 두 차원이다.
하나는 이론적 문제의식의 변화이다. 지젝은 라캉의 오래된‘잉여향유’개념을 통해 현대 정치학의 새로운 지형을 모색하는데, 이때 던지는 핵심 물음은 낯익으면서도 낯설다. 우리는 왜 억압 자체를 즐기는가?”여기서 지젝은 독창적이게도 잉여향유를 폭압과 수탈과 감시가 아니라 주체의 자발적 포기와 단념과 고통의 수용에 의해 유지되는 권력의 작동과 연결 짓고, 나아가 이 과잉 향유의 메커니즘을 핵심 작동 기제로 삼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분석으로 고양시킨다. 또한 글로벌자본주의에서 시작하여 마르크스주의의 정치경제학 비판과 생태학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주시한다.
쾌락과 고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주체적 궁핍의 정치성에 대한 사유
잉여향유가 섹슈얼리티의 예외적 발현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본질적 계기이며 자본주의는 바로 이 잉여향유의 논리를 극단적으로 활용하여 작동하는 체제라면, 저자가 ‘잉여향유’를 통해 펼쳐 내려는 정치성의 면모는 과연 무엇일까? 지젝의 『잉여향유』가 지닌 두 번째 새로움은 잉여향유를 ‘주체적 궁핍’과 연결 짓는 작업에서 나온다. 주체적 궁핍은 우리의 ‘내면의 자기’라는 자산을 형성하는 모든 것,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모든 추함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동시에 주체, 즉 ‘순수한’ 텅 빈 주체로 남아 있는 신비로운 움직임이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책의 피날레는 이러한 방향으로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주체적 궁핍의 정치성에 대해 사유한다.
위기와 위기가 경쟁하는 시대,
새로운 연결점으로 나아가는 폭력적 읽기 제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구 온난화, 사회적 긴장, 디지털의 완전한 통제 가능성 등 여러 재앙이 순위를 다투면서, 동시에 어떤 것이 다른 모든 것을 총체화하기 위해 경쟁하는 기이한 시기이다. 이런 다층적 위기 속에서 추상적 해결책은 없으며, 전 세계적 관점에서 타협점을 찾아야만 한다. 이런 맥락에서 책의 초점은 서로 다른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위기와 싸우거나 재생산하는 방식, 때로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을 살피는 데 있다.
지젝은 이를 위해 동시대 사상가들과의 대결 및 협업의 과정을 자세하게 그려 낸다. 사이토 코헤이, 가브리엘 투피남바, 야니스 바루파키스, 프랭크 루다, 사로지 기리 등의 텍스트를 통해 진지하게 고찰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폭력적 읽기’를 제안한다. 즉 유기적 통일성(처럼 드러나는 것)을 찢어 버리는 읽기, 그리고 그 문맥에서 인용된 구절들을 찢어 버리고 파편들 사이에 예상치 못한 새로운 연결을 설정하는 읽기를 (그리고 실천하기를) 독자에게 간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