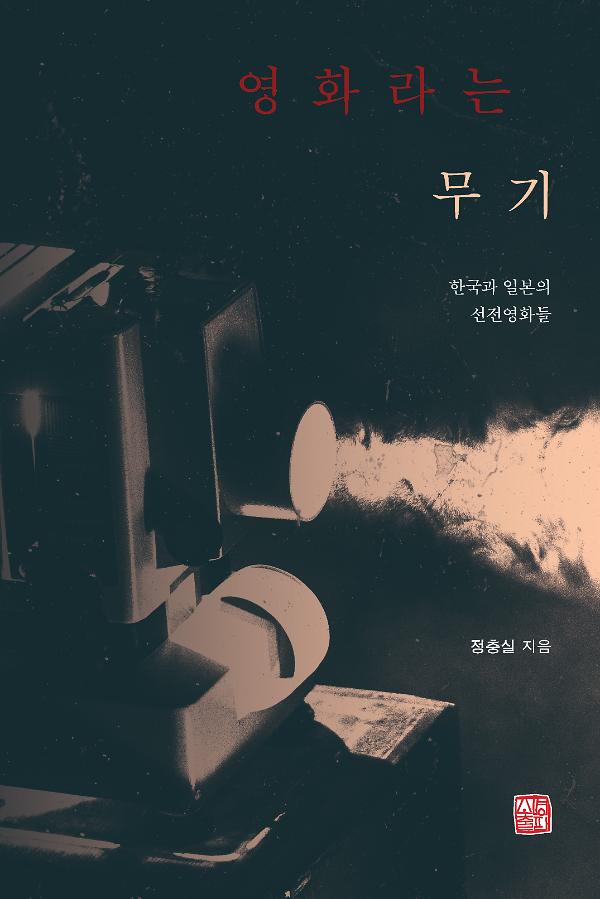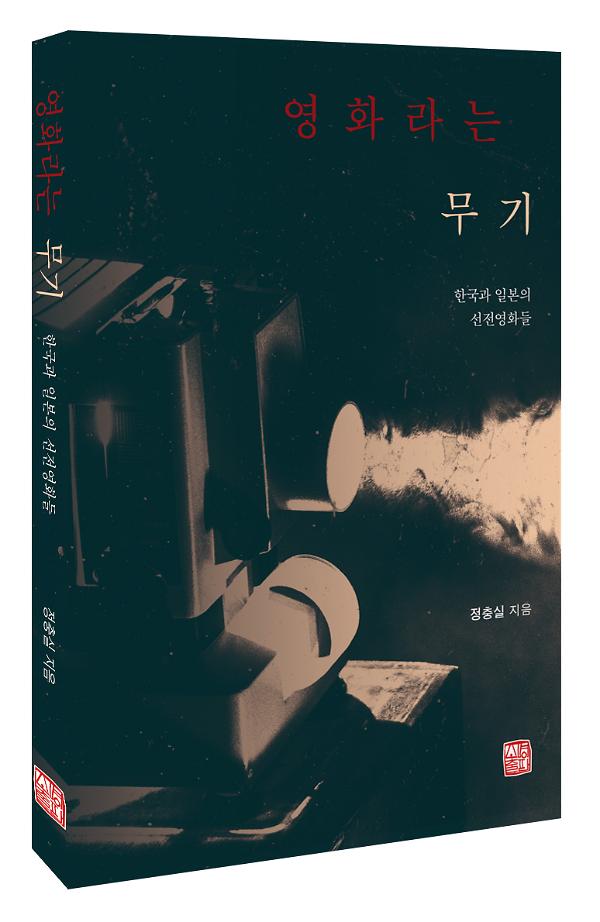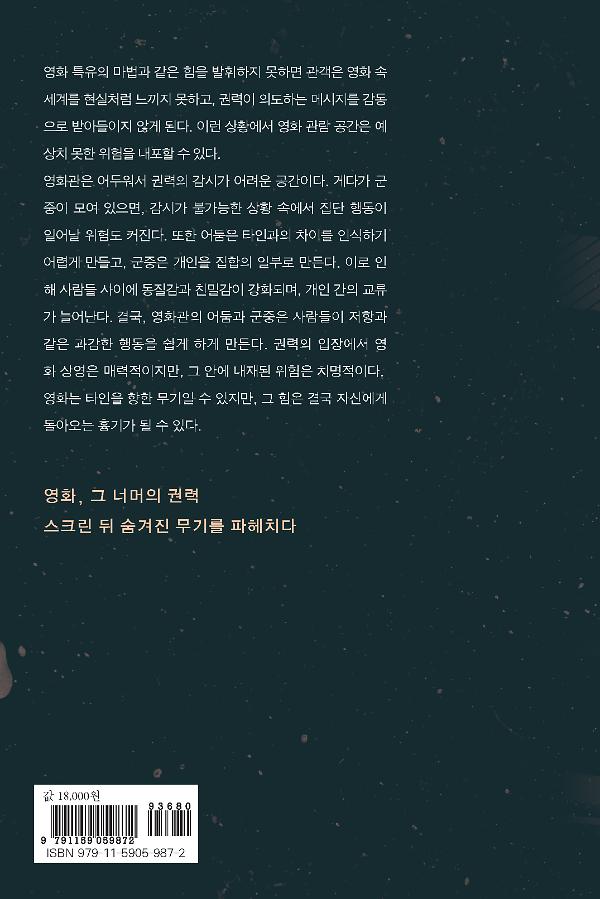영화, 무기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이 책은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한국과 일본의 선전영화를 주목하고 있다. 선전영화의 텍스트만이 아니라 관람환경, 관객까지 세밀하게 살펴보며 깊이있게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선전영화가 애초의 목적대로 관객을 교화하고 무언가에 동원할 수 있었는지, 즉 ‘무기’로서 기능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선전영화가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관객이 영화적 환영에 통합되어야 하며, 따라서 영화를 실제인 것처럼 믿게 하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일부의 선전영화, 대표적으로 일본의 선전영화는 관객을 영화적 환영에 통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반면 식민지 조선의 선전영화, 프로키노와 통영청년단의 선전영화, 일부 한국의 선전영화 상영공간은 관객을 영화적 환영에 통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선전영화는 무기가 되지 못했다. 무기가 되지 못한 선전영화의 상영공간은 축제의 공간, 자유를 감각하는 공간, 능동적 저항의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일부 선전영화는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 교화하고자 하는 바가 관객에게 투명하고 완벽하게 전달되지 않기에 영화 연구에서는 텍스트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연구 범위를 관람환경, 관람양상까지 확장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선전영화 상영장 속의 관객
상영주체와 제작자인 국가권력, 민간 엘리트들은 지배자적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관객을 교화하는 존재로, 관객인 학생, 노동자, 식민지인, 기지촌 주민은 피지배자적 위치에서 국가권력과 엘리트에 순종하는 존재로 고정되지는 않았다. 관객은 특정 조건 속에서 영화에 집중하지 않은 채 국가권력, 민간엘리트의 뜻과는 상관없이 관객 간의 연대와 교류를 통해 저항을 행하기도 하고 영화 내용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사 기술에 매료되기도 했다. 선전영화 상영장에서의 교화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는 여러 성격의 관객에 주목함으로써, 국가권력을 완벽한 것으로 보고 유순한 신체를 가진 대중과 그들의 국가권력에 대한 협력과 소극적 저항에 주목하는 연구, 민간엘리트와 대중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대중의 존재, 능동성에 주목하지 않는 연구는 역사에서 노동자, 여성, 디아스포라의 존재를 삭제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