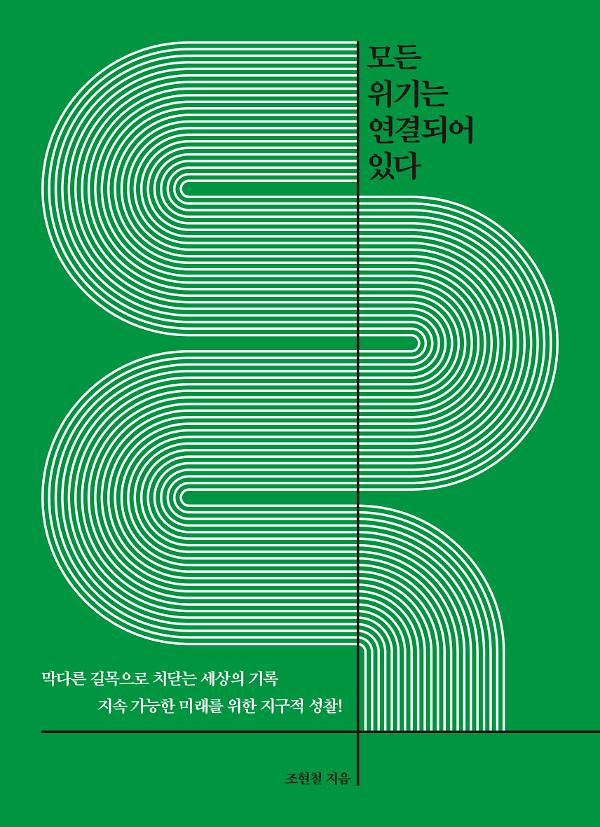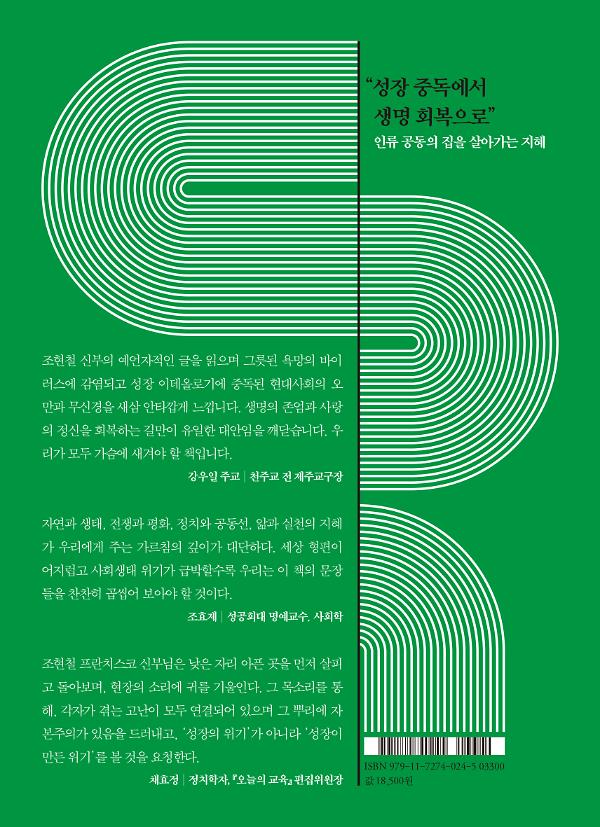위기에 내몰린 기후, 생태, 핵, 노동, 안보, 민주주의…
휘청거리는 지구 위에서 시대정신을 묻는다
생태적 삶은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불편하고, 엄두가 나지 않고, 관성적 삶과는 다른 것이기에 어색하다. 그래서 흔히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하지만 합리적인 관료, 기업, 상품 소비자들은 진짜 현실을 대면하고 있는가? 『모든 위기는 연결되어 있다』는 바로 이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현실적인 진단과 대안은 정직하게 문제의 근원을 대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저자의 말이다. 문제의 뿌리는 자본주의 체제다. 한국은 ‘저출산, 자살, 불평등, 기후위기, 그리고 전쟁’이라는 다양한 위기를 경험한다. 하지만 대책은 겉돌고 있다. “우리는 덫에 걸렸”다. “현실 세계에서 자본주의는 건드릴 수 없는 전제”이기에 그렇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결과인) 여러 현안들에 대한 대책도 겉돌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 저자의 견해다.
따라서 “그들(뭇 사람들)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진단과 대책이야말로 비현실적”이다. 현실적인 것은 오로지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와 성장의 주술에서 벗어나는 말과 행동뿐이다. 기계론적 세계관으로부터 탈피하여 생태론적 세계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것이다. 기후위기의 동의어로 판명된 경제성장과 산업적 농업 대신, 탈성장과 유기 농업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우리를 포로로 만드는 상품 소비의 족쇄를 끊어내는 것이 그것이다. 그것만이 상징적인 의미에서건 현실적인 의미에서건 인류 공통의 집인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인류 공동의 집을 살아가는 지혜
레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이라는 책에서 해충구제용으로 흔히 쓰이던 약제인 DDT(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가 먹이사슬을 통해 치명적으로 농축되며, 독수리 등 조류를 멸절에 가깝게 살상했음을 고발했다. 이제 사용이 금지된 DDT는 종의 차원을 초월해 생물들이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이제 학교 교과서에도 등장할 정도로 대중적으로도 익숙한 소재다.
“근대 이전, 동양과 서양 모두 자연을 생명의 원천, 일종의 ‘어머니’ 같은 존재로 여기는 유기체적 관점이 우세했다. 자연에 생명이 깃들어 있다고 보는 유기체적 세계관은 인간이 자연을 존중하고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제어하는 기능을 했다.” -본문 220쪽
전근대의 유기체적 세계관이 자연을 존중했던 반면, 16세기의 기계론적 세계관은 무생물은 물론 생명마저도 ‘대상’으로 보았다. 그때부터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경영해야 한다는 생각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현대 기술만능주의의 시작인 것이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에 기대를 거는, 아니 이것을 전제로 기후위기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기술만능주의의 소산이다.
생태학은(ecology)는 ‘집’이라는 뜻인 그리스어 ‘오이코스(oikos)’에서 파생되었다. 즉 생태학은 기계론적 세계관, 세계가 즉 물질이고 나와는 분리된 대상인 무엇으로 여기는 사상으로부터의 회심이다. 저자에 따르면, “현대 과학의 세계상은 기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긴밀히 연결된 공동체, 곧 ‘집’에 더 가깝다”고 하니, 이것이 오히려 진정한 합리성의 귀결이라고도 하겠다.
“성장 중독에서 생명 회복으로”
자본주의와 기계론적 세계관이 이끌어낸 성장의 과실은 소수의 부유층에게 집중되었다. ‘슈퍼 리치’가 소유하는 부의 비중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그것의 필연적 결과인 기후변화와 환경파괴의 피해는 못사는 나라, 못사는 사람들이 주로 본다. 기후변화의 해결책으로 이야기되는 탄소저감기술이나 CCUS의 득을 보는 것은 기업들이니, 결국 기후변화마저 이윤추구의 기회로 둔갑한 셈이다.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언급되는 핵발전은 원전 카르텔이 둘러친 베일 속에서 여전히 그 얼룩을 숨기고 있다. 케인스는 “생산성 향상으로 100년 후인 2030년 주당 노동시간은 15시간이면 충분하리라고 예상”했지만, 현실에서는 기업만이 그사이 늘어난 생산성으로 이득을 보았을 뿐이고 노동시간은 전혀 단축되지 않았다.
저자는 말한다. 결론은 담론적 혁신이다. 즉 탈성장이다.
“탈성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뜻하지 않는다. 탈성장은 지금과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와 생활방식, 다른 사회적 관계에 기초한 삶의 방식을 말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탈성장은 지금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 본문 123쪽
불의한 사회에서 성장 악화의 피해는 또 저소득층에 전가된다. 유럽에서 기후변화 대책이 표류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도 그 짐이 일부 집단에게만 전가되어서가 아닌가. 우리 모두의 삶과 사유를 통째로 뒤바꾸는, 생태론적인 회심이 지금의 위기 극복에 있어 필수적인 또 다른 이유다.
저자는 자기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낸다고 세상이 얼마나 바뀔지 회의에 빠지기도 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성경의 선지자들 역시 힘없고 무명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힘을 냈다고 한다. 직접 좁은 텃밭에 농사를 짓고 일상에서 불편한 삶을 실천하는 신부님의 소소하게 생활적인 이야기 역시 독자에게 작은 회심의 용기를 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