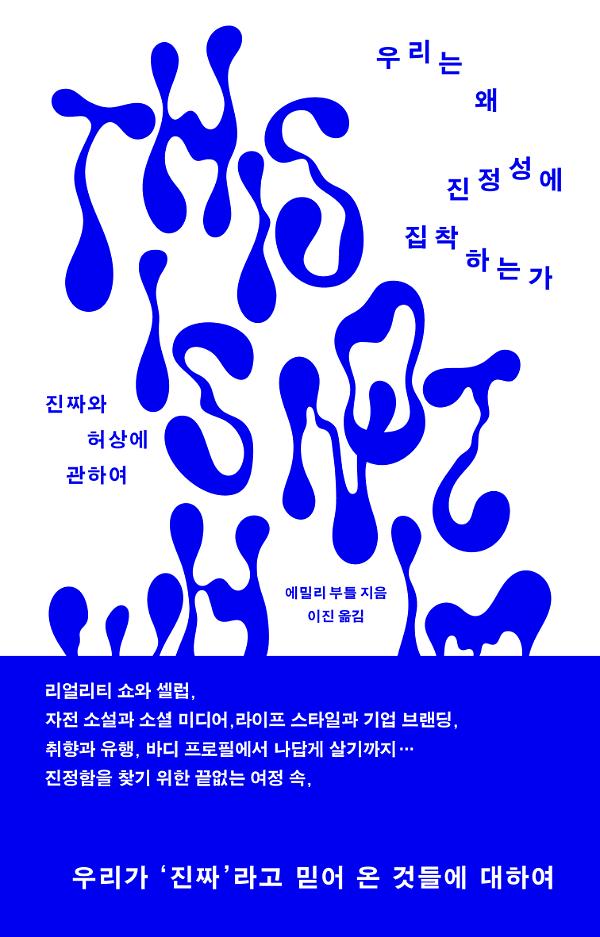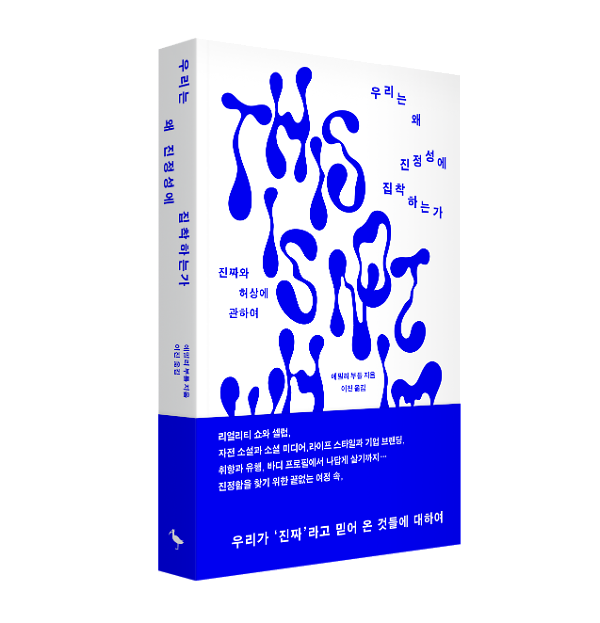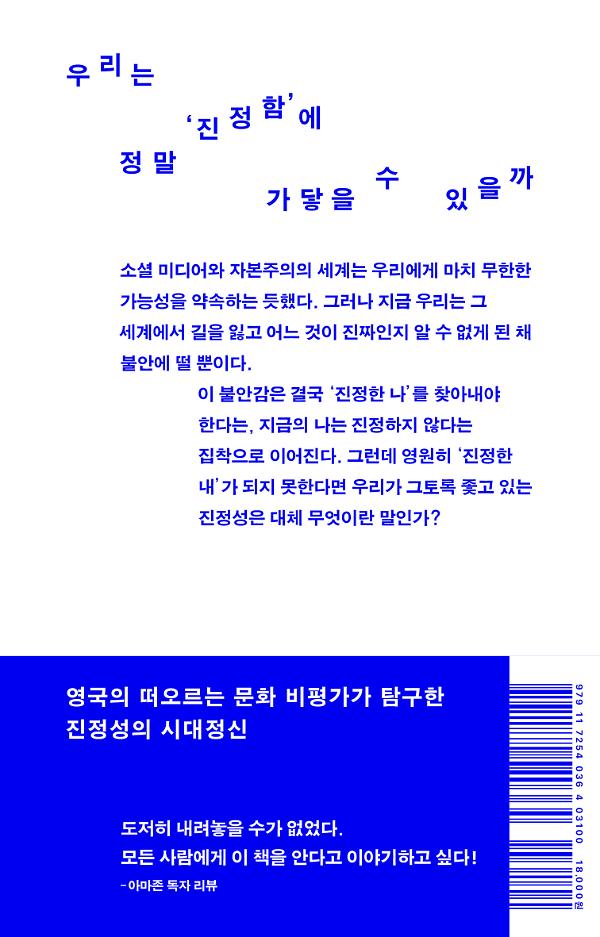진정성은 본래 자유를 추구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교리가 될 때 오히려 자유를 빼앗는다는 것이 바로 진정성의 역설이다. 우리가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좋은 일이겠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개념에 나는 이의를 제기한다.
_ 15쪽, 〈서문〉
소셜 미디어가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초유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온라인 이미지 뒤에 본모습을 숨기는 것 또한 가능해졌다. 그 결과, 타인의 진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은 더욱 커졌다. 이처럼 진정성 의미와 중요성이 혼돈에 빠질수록 우리는 구명줄처럼 그것에 매달렸다
_ 24쪽, 1장 〈셀럽〉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팔리고 있는 진정성이라는 개념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거짓이고 가짜이기 때문이다. 진정성은 고백의 개념으로 팔리고 있고, 자신의 가식을 인정하는 개념으로 팔리고 있다.
_ 38-39쪽, 1장 〈셀럽〉
모두에게 진정성이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에 갈수록 집착함에 따라, 우리는 예술 전반에 걸쳐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번역될 수 있는 자아의 흔적을 찾는다. … 우리는 예술가들의 작품에 불필요한 추궁을 하게 되었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논쟁하게 되었으며…
_ 64쪽, 2장 〈예술〉
대중의 시선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그렇듯이,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 자신과 교감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당신은 ‘공감 가는 ’사람이 된다. 독자들은 당신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체험할 수 있다.
_ 69쪽, 2장 〈예술〉
〈사워〉의 처음 몇 초 동안 무심코 내뱉는 것 같은 대사가 있는데, 그 순간 청취자는 로드리고의 작업 과정에 들어서게 된다. … 왜 굳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까? … 창작자의 자아를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약 대중음악이 소설이라면, 로드리고가 쓰고 있는 것은 단지 자전적 소설이 아니다. 로드리고는 메타 픽션을 쓰고 있다.
_ 86쪽, 2장 〈예술〉
…유행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지만, 그렇게 보이기 위한 주요 수단은 결국 더 많은 물건을 사는 것이다. 개인의 진정성은 진정성 있는 제품들이 받쳐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_ 93쪽, 3장 〈제품〉
진정성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의 욕망은 완벽하게 해소될 수 없어서 오히려 지속된다. 결국 브랜드들은 진정성 있는 제품 이상의 무언가를 팔아야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진정성 있는 자아를 팔아야 했다.
_ 96-97쪽, 3장 〈제품〉
진정성 있는 집단적 자아의 완전무결성을 중시하다 보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집단에 들어오려 하면, 다른 누군가의 근본적인 진실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호된 비난을 받는다
_ 131쪽, 4장 〈정체성〉
그럼에도 전통적인 정체성의 틀이 흔들리고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피할 수 없을 때, 그런 것들은 우리 자신을 옭아맬 수 있는 안정적이고 확실한 무언가를 제공한다. 우리는 모든 것에 경계를 긋고 싶어 하고 모든 주장에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싶어 한다.
_ 151쪽, 4장 〈정체성〉
‘당신에게 더 이상 쓸모없는 ’물건들, 사람들, 행동들을 삶에서 몰아내는 일은 매혹적이다. 그렇게 하면 본질적 자아의 핵심에 조금 더 다가서는 것 같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우리는 어질러진 삶이 우리를 질식시킨다고 느낀다. … ‘진정한’ 자아는 의심할 나위 없이 최고의 자아와 동의어이다.
_ 169-170쪽, 5장 〈순수성〉
포용적 접근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충동에 굴복한다. 그 충동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시작된 것일 수도 있고, 얼마 전 당신이 온라인에서 보았던 광고성 콘텐츠에서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 그걸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아무려면 어떤가? 외부 영향의 전 범위를 포용함으로써, 당신은 현실 속에서 입지를 굳히는 것이다.
_ 178-179쪽, 5장 〈순수성〉
현대 사회에서 고백은 우리를 하느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의 내적 자아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_ 200쪽, 6장 〈고백〉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피드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지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된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평가한다. 우리가 세상에 알리기 위해 완벽하게 구축한 자아의 ‘하이라이트 릴’을 보는 것이다. …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생성된 개체에 대한 피드백을 내적 자아에게 요청한다. 이게 나 맞아?
_ 221-222쪽, 6장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