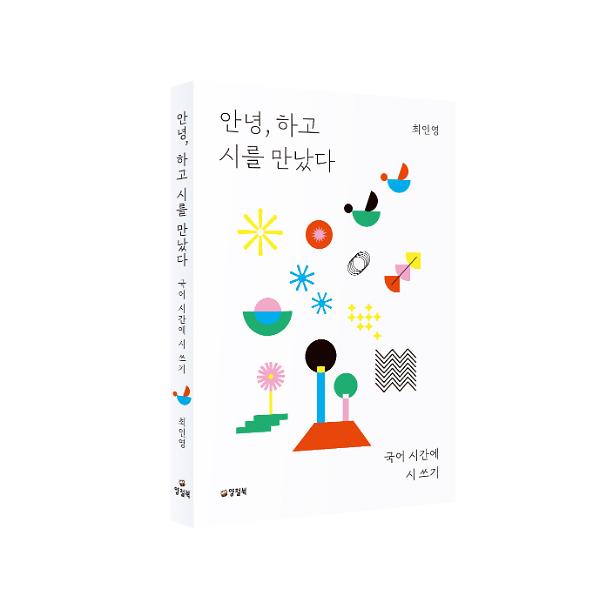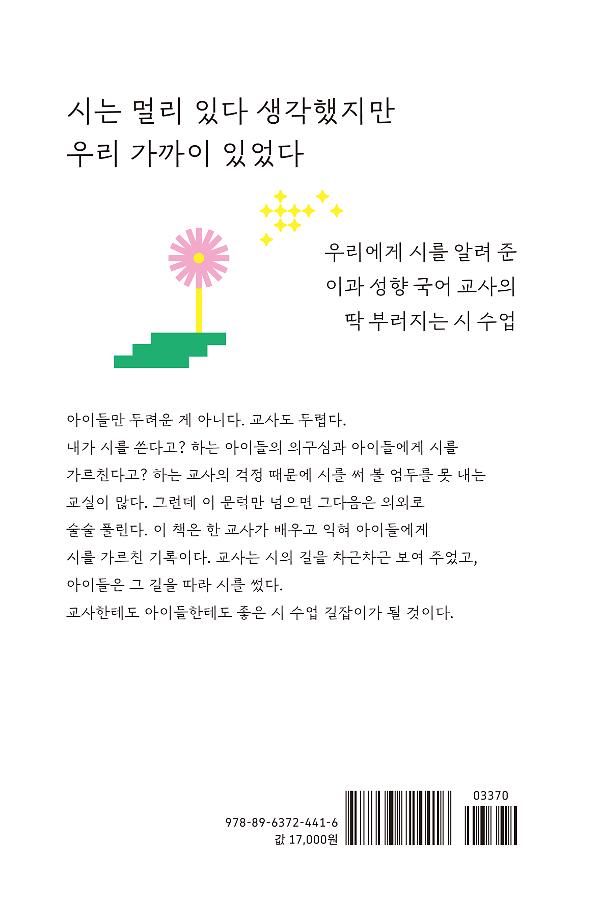시 쓰는 국어 시간, 어떻게 시작할까?
이 책을 쓴 국어 선생은 생물을 좋아하고 도표 그리는 걸 좋아하는 이과 성향이다. 문학과 ‘시’가 두려웠던 저자는 두려움으로 피하기보다는 용기를 내 보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아 교과서를 재구성하고 수업 설계를 치밀하게 세우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실패하면서 쌓아 온 그만의 방법으로 2023년도에는 국어 시간에 만난 아이들 100명이 모두 시를 쓰게 되었고, 이 책은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주제를 정하고, 글감을 고르는 일부터 시를 다듬는 일까지 시를 쓰는 차례에 따라 일곱 부로 구성하고 부마다 아이들 시를 일곱 편 싣고 그 시마다 설명을 덧붙여 놓아서 시가 나오게 된 과정과 수업 안내의 핵심을 만날 수 있다.
교사도 학생들도 ‘무엇을’ 쓸까 하는 첫 문턱부터 막막해하다 걸려 넘어진다. 저자는 뜻밖에 교과서에서 힌트를 얻는다. 2018년 문학 수업 시간에 “문학의 목적은 아름다움이다”는 문장을 만난다. ‘아름다움’이란 뭘까, 하는 질문을 품고 아이들을 만난다. 저마다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다를 테니, 그것과 만나 보자고 제안한다. 부모님의 사랑, 친구의 우정 같은 거창한 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파란 우산이나 단팥빵 같은 작은 것을 찾아보자고 말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경험에서 찾아내라는 교사의 제안으로 시의 씨앗을 품게 된다.
해가 쨍쨍한 날이었다/ 점심부터 연습했는데 도통 들어가질 않았다/ 튕겨 나가면 다시 주워 오고/ 튕겨 나가면 다시 주워 오고// 농구공에게 막 욕을 했다/ 멀리 날아간 공을/ 외롭기라도 하라는 듯/ 느릿하게 주우러 갔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던졌을 때/ 농구공이/ 촥―/ 하고 들어갔다// 그 순간 먼지 묻고 더러운 농구공이/ 반짝반짝 빛나 보였다// ‘농구 잘되는 날’에서
저자는 “시는 하늘에서 우연히 툭 떨어지는 게 아니다. 수하가 농구공을 던지면서도 ‘뭘 쓸까?’라며 시에 마음을 쏟았기에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다.”고 말한다. 농구를 잘하기 위해 공 던지는 연습을 하듯, 시를 쓰기 위해 마음을 기울이는 일, 시작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교사가 건넨 씨앗이 학생들에게 전해지고, 마음에 품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싹이 트고 시로 피어났다. 하나둘 학생들이 시를 쓰기 시작했고, 친구의 시가 마중물이 되어 1년 내내 아이들은 시를 썼다.
시가 주는 선물, 위로와 연결
어떻게 100명 아이들이 모두 시를 쓰게 되었을까? 교사가 매 순간 학생 모두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다. 아이 곁에는 아이들이, 친구가 있다. 모둠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친구와 하하 호호 수다 떠는 시간을 알맞게 버무려야 한다고 말한다.
“시를 쓸 때 글감을 정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친구들과 부담 없이 편하게 얘기하면서 소재를 많이 떠올려 볼 수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 시로 쓰게 되었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번뇌하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과 함께 생각나는 것을 막 뱉어 보고 주위에 있는 걸 떠올려 보고 적어 보면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학생의 이야기다. 그리고 모둠의 친구들은 독자가 되어 시를 쓰고 다듬는 순간까지도 훌륭한 역할을 해낸다. 친구들이 없었다면 시를 끝까지 쓰지 못했을 거라고도 고백한다. 친구와 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니! 아이들은 시를 쓰면서 친구와 깊이 연결되는 순간을 맛본다. 그리고 연결은 교실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어린 시절 추억을 쓰면서 엄마와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고, 친구와 싸우고 난 뒤 힘들었던 마음을 솔직하게 쓰면서 스스로 힘을 내 보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시를 쓰면서 애도의 시간을 갖고, 버려진 강아지를 데려온 이야기를 쓰면서 버려졌을 때 개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고… 시가 준 선물이다.
왜 아이들에게 시를 쓰게 했나? 시를 쓰는 시간에 아이들이 저마다의 ‘고요’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위안받고 새로운 힘을 얻으면 좋겠다고 바랐기 때문이다.
문학이, 시가 두려웠던 저자는 교과서와 학생들의 삶에서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아이들이 시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수업 차시를 구성했다. 그 과정에서 저자 자신도 시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다. “이 책은 이과 성향 국어 교사의 발버둥이자, 나처럼 감수성 메마른 교사도 할 수 있으니 한번 덤벼 보시라는 응원”이라고 말한다. ‘시를 가르친다’는 두려움에서 한 발짝 벗어나 보자고 이 책을 건넨다. 이 책을 따라가다 보면 뜻밖에 시가 아주 가까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