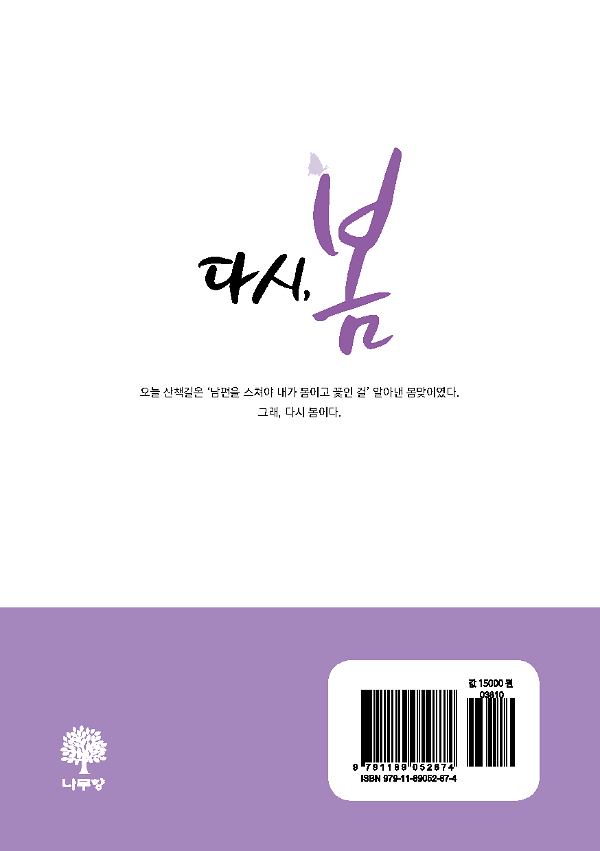겨울 숲에 오면 나만의 생각에 몰입할 수 있어 좋다. 내면 깊숙이 나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좋다. 복잡하고 답답하던 응어리를 쉽게 풀어내기도 해 평온해지니 온몸이 가볍다.
오늘 겨울 숲에서 새롭게 기운을 찾듯, 이 숲도 얼마 지나지 않아 침묵을 딛고 일어설 것이다. 따스한 봄볕으로 연초록의 물감을 뿌릴 것이고, 연분홍 꽃가루가 흐드러지게 날아오를 것이고, 여름날은 다시 뜨거운 뙤약볕으로 지친 인간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것이다. 또 변함없이 가을의 전령들이 알차고 야무진 열매와 고운 단풍을 품고 와 사람들과 산속 식구들을 분주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자연의 질서처럼 인간도 순리대로 정담을 나누며 살다 보면 세월의 흐름 속에 허둥대거나 당황하지 않고 제 발걸음대로 살게 되지 않을까.
산다는 것은 자신을 계속 다듬고 보듬어 창조해 가는 것이라 했다. 겨울 숲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듯 인간도 각자 자리를 지키며 살다 보면 전염병이 창궐하는 어려운 시절이라도 화창한 봄이 오지 않겠는가. -〈겨울 숲〉 중에서
다행히 단풍이 꽤 남아서 동무처럼 훈훈한 미소로 나를 반긴다. 단풍나무 한 그루가 다채로운 빛으로 물들어 가을옷으로 갈아입고 있다. 한쪽엔 진빨강 옷을 걸치고 안개비를 맞은 채 요염하게 웃고 있고, 반대쪽은 평소 정이라는 건 받은 적도 없는 것처럼 생떼를 쓰듯이 아직도 여름의 끝자락을 부여잡고 있다. 그 옆 가지에선 순하디순한 사람처럼 이도 저도 아닌 누런 빛으로 물든 단풍이 어정쩡한 눈웃음을 보낸다.
‘아! 예쁘네, 아직 그대로여서 고마워!’ 혼잣말로 탄식을 한다. 어찌 한 나무에서 저리도 예쁘게 제각각의 색으로 공존하는지, 부조화인 듯한 그런 조화가 신선하다. 혹시 내 마음속에도 저렇게 다양한 색깔이 존재하여 시시때때로 자신도 헷갈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옆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은행나무는 반쯤 옷을 벗어 놓고도 아직은 기품 있게 서 있다가 내 마음을 알아차린 듯 푸근한 미소를 짓는다. -〈옛 동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