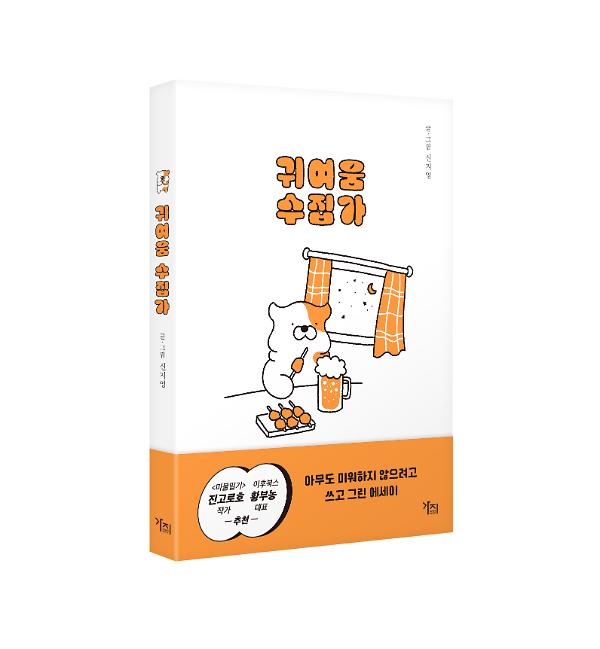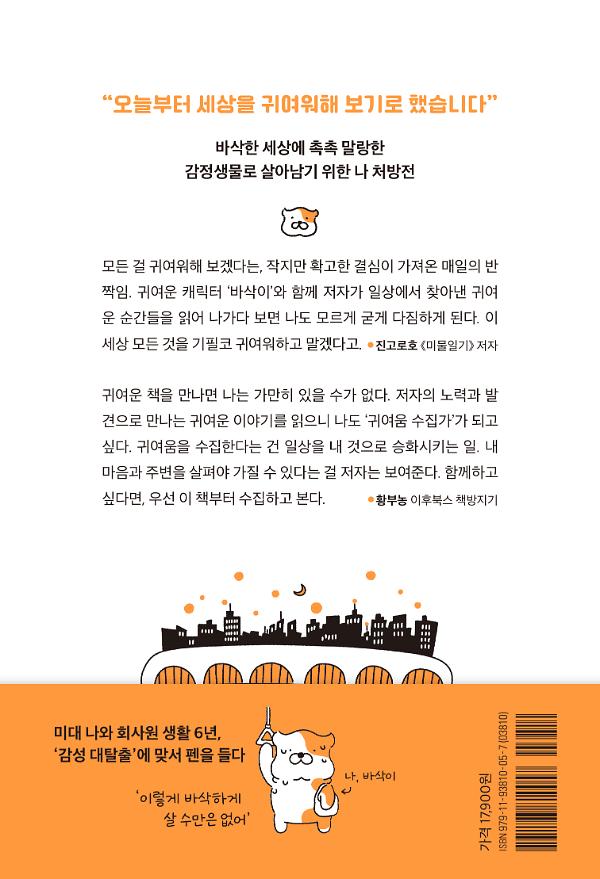너무 심각하게 무게 잡고 살면 사람이 쪼그라든다. 우스워지기도 쉽고. 언젠가 엄마가 해준 얘기다. 맞는 말 같다. 삶은 조금 더 우습고 덜 멋있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몸과 마음이 물렁물렁 여유로울 틈이 생긴다.
-p.15 〈어른의 상상력에는 귀여운 구석이 있다〉
회사와 유치원은 좀 비슷하다. 구성원 중 상당수가 집에 가고 싶어 하거나, 졸음과 싸우거나, 배고파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p.18 〈그럼에도 우리는 왜 퇴근하지 않을까?〉
십여 년 넘게 그림을 그렸으면서 그걸 포기하고 취직한 게 아쉽지 않냐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러면 농담이랍시고 ‘자본주의와 타협했다’고 가벼이 대꾸하곤 했는데, 내 말투가 그리 명랑한 톤이 아니라서인지 다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사실은 애초에 ‘포기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만하면 그림과 나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 중이다.
-p.35 〈0.5의 평화〉
에스컬레이터가 끝을 보이기 시작하자 할아버지는 한 칸을 먼저 내려서더니 뒤쪽을 향해 손을 쑥 내밀었다.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무심히 건넨 손이지만 의도는 명확했다.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그 손을 잡고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섰기 때문이다. 지켜보던 내 심장에 별안간 사랑스러움이 날아와 꽂혔다. -p.49 〈노룩 스윗〉
내가 귀여워해 보려고 노력하는 아저씨 중엔 가끔 우리 아빠도 포함된다. 아빠는 음식 맛을 칭찬하면 안 되는 저주라도 씐 걸까, ‘맛있다’는 금기어를 내뱉었다간 평생 굶어야만 하는 운명이라던가.
-p.71 〈아저씨, 저한테 왜 그랬어요?〉
사람이라서 사람이 싫고 사람이라서 사람을 사랑하고, 이 무슨 어려운 인생이란 말인가. 정성스럽게 답변할 자신이 없는 문자와 전화는 잠시 치워 두고 털동물의 세계로 입장한다. ‘참나, 이 귀여운 고양이는 대체 뭐지…’
-p.114 〈SNS 알고리즘을 따라 헤매는 남의 고양이 애호가〉
언제 생명의 불씨가 꺼질지 모르는 구식 보일러라도 엄밀히 말해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깐깐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해 봤자 묵살당할 게 뻔하니 차라리 빨리 고장이 났으면 싶을 때도 있다. 요즘 나는 샤워 중 갑자기 빙하처럼 차가운 물이 쏟아질 때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의 박해일이 되어 중얼거린다. “고장 났구나, 마침내….”
-p.119 〈여자 둘이 낡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반지하 자취방에서 키우는 바질 화분처럼 시들시들 맥을 못 추는 직장인들의 심장, 헬스장 플레이리스트가 노리는 목표물은 바로 그것이다.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박자를 쪼개 버린 수많은 리믹스 버전의 음원들이 무거운 기구와 땀 냄새로 가득한 지하 공간에 햇빛 같은 활기를 불어넣는다. -p.142 〈헬스장 플레이리스트 고찰〉
진심이란 게 생각보다 별거 없다. 그냥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에 진심이 된다.
-p.152 〈술에 취해 응시한 조주기능사 자격시험〉
잘 못하는데도 자주 하게 되는 것이 있다. 바로 노래. 연습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재능을 타고나야 한다는 특성이 사람을 좀 뻔뻔하게 만든다. 그래서 내가 노래를 못한다는 사실은 중국어를 못한다는 사실보다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다. -p.172 〈코인노래방의 가수들〉
달은 예쁜 바나나색이라기보다는 사냥감을 앞에 둔 육식동물의 눈알같이 노르스름하다. 가끔은 눈 쌓인 언덕처럼 희게 빛나기도 하고, 청명하게 푸른 색감이 돌기도 하고, 불길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랑스러운 붉은빛을 띠기도 한다. 이렇게 평소와는 조금 다른 빛깔의 달을 본 날이면 나는 어김없이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는다.
-p.187 〈일출을 보러 갔는데 맞은편의 달만 눈에 들어왔다〉
세상을 귀여워하며 글을 쓰는 건, 마치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기 위해 몸에 힘을 빼는 일과 같다. 현재까지의 성과 역시 내 수영 실력만큼이나 보잘것없다. 그런데 ‘마리모 수영법’에는 신기한 점이 하나 있는데, 나는 잠수를 한 상태로 둥실 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문득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 보면 원래 위치에서 제법 멀어진 곳까지 떠밀려 와 있다는 거다. -p.196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