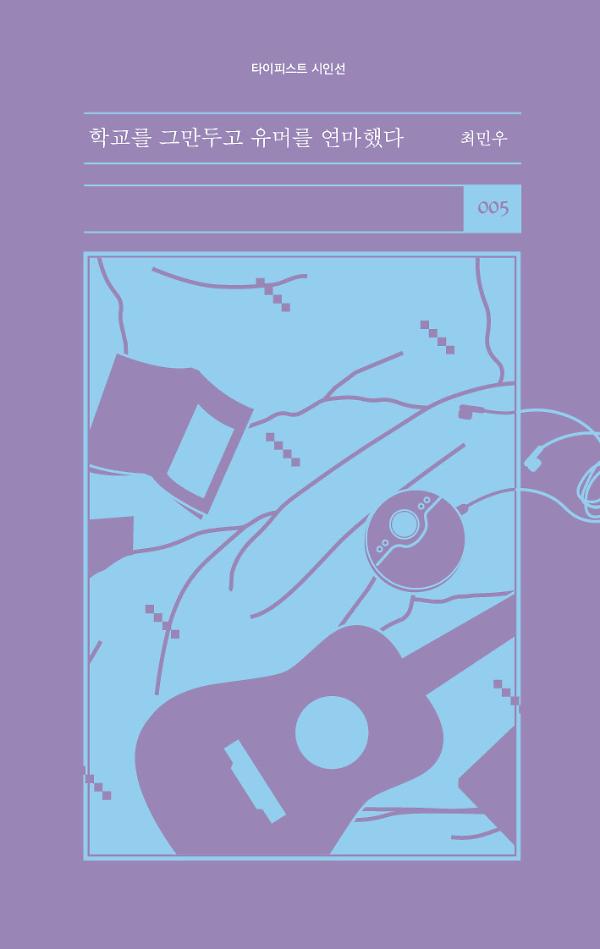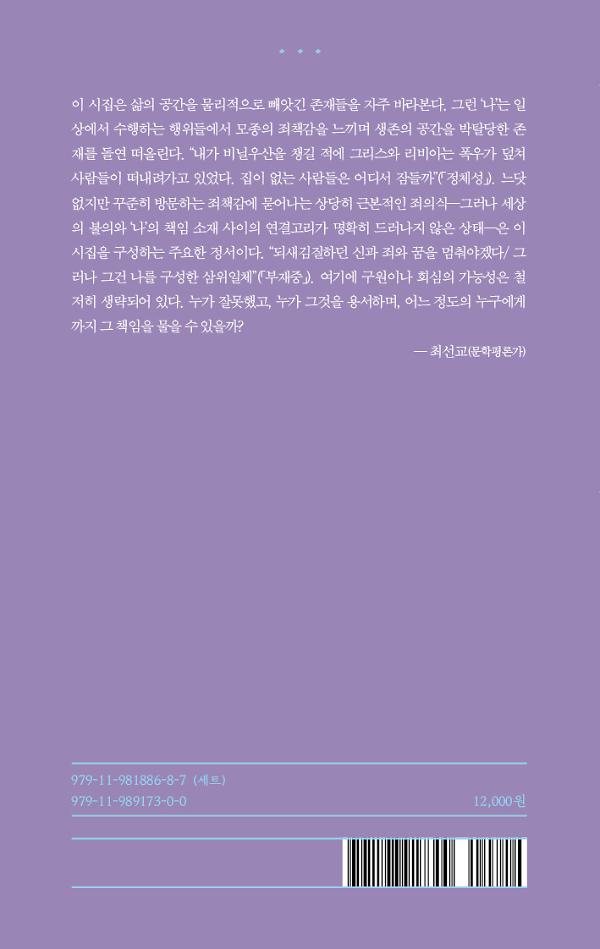모순과 괴리로 가득한 세계 속에서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유머를 연마하는 방법
독립 문예지로 활동을 시작한 최민우의 첫 시집 『학교를 그만두고 유머를 연마했다』가 타이피스트 시인선 005번으로 출간되었다. 최민우 시인은 이번 시집 출간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하는 신인이다. 청년 세대의 현실을 독특한 유머로 비틀면서, 인디 문화와 결합된 시편들이 겹겹의 모순과 괴리로 가득한 세계 속에서 경쾌한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낸다. 최민우의 시는 슬픔에 쉽게 매몰되지 않는다. ‘나’를 타자처럼 바라보며 그 사이를 오가며 하나의 소시민적 믿음으로써 슬픔을 벗어나게 한다. 최민우의 시는 우리를 다음 장면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래 제길 나 이렇게 살았어’
농담과 진담을 구분하지 않아도 웃음을 나누며
동사무소 거울 앞에 항상 행복하세요라고 쓰여 있길래
이 건물이 내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민원 넣었다 ―「소시민」중에서
축제가 열리는 공원이었다. 발아래 일렬로 배치된 튤립들. 온통 복제된 밭이었다. 가장자리에 있는 꽃들은 이미 어떤 사람의 발에 밟혀 축 늘어져 있었다. 죽은 걸까. 나고 자란 것이 아닌 심고 세운 것들. 나는 그것을 예쁘다고 말하고 있다. ―「튤립 축제」중에서
시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십 대를 핍진하게 그려내면서 ‘나’와 세상이 겹겹이 감싸고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해 묻는다. 자연스러운 것보다 인위적이고 즉흥적인 삶의 풍경에서 자신이 느끼는 이 정체 모를 괴리감과 죄의식, 그럼에도 그 삶에 녹아든 자신의 모습에서 시인은 새로운 질문들을 발명하고 있다. “그래 제길 나 이렇게 살았어.” 그럼에도 오래 보아 온 사람의 눈은 더 세밀하고 더 멀리 볼 수 있게 된다. 최민우는 자신이 지금껏 관찰해 온 세상의 풍경들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사이를 횡단하는 사람들을 본다. 그런 세상을 기괴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찰자인 최민우 역시 자신을 기괴하다고 느낀다. 이런 기행들로 가득한 하루의 일상에서 “동사무소 거울 앞에 항상 행복하세요라고 쓰여 있길래/ 이 건물이 내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민원”을 넣기도 한다.
마침내 사랑이 되기 위해
애도와 보은으로 바라보는 세계
돌아오는 길에 문 앞에서 죽은 새를 보았다 가지런히 누워 있길래 무심코 애도했는데 동시에 고양이의 보은일까 생각했다 ―「소시민」중에서
사람들의 통성기도가 하품으로 멈춘다
손은 떠는데 아무도 흐느끼지 않았다
남자는 왠지 그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타로 카드」중에서
이 세계는 행복을 노래하면서 불행을 선사한다. 이런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지 않고 매번 상처받으며, 누군가에게 보금자리를 빼앗기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한다. 이런 사회 속에서 ‘나’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세상의 불의에 대해 알 수 없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내가 누리는 어떤 안전함이 누군가의 것을 빼앗음으로 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이렇듯 행복이면서 불행이기도 한, 애도가 보은이 되기도 하는 세계의 이중성에 대해 최민우는 예민하게 감각하는 시인이다.
시인은 마침내 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자신과 세상을 동일화시키지 않고 몇 걸음 떨어져 관찰한다. 누구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비닐우산을 챙길 적에 그리스와 리비아는 폭우가 덮쳐 사람들이 떠내려”(「정체성」)가고 있었던 것처럼, 일상에서 수행하는 행위들에서 모종의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루하루를 감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한다. 해설을 쓴 최선교 문학평론가의 말처럼, 여기에서 신의 구원이나 회심은 찾기 어렵다. 신 역시 이런 세계에서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행하지 않는 자의 죄를 가진 것이다. 신과 우리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 그렇게 시인은 신의 세계를 비틀어 유머를 연마하며 사랑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