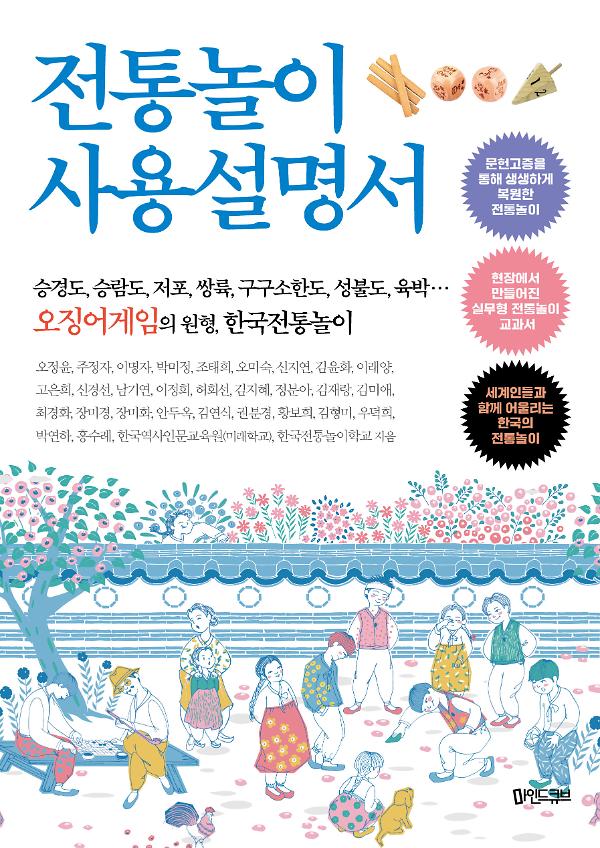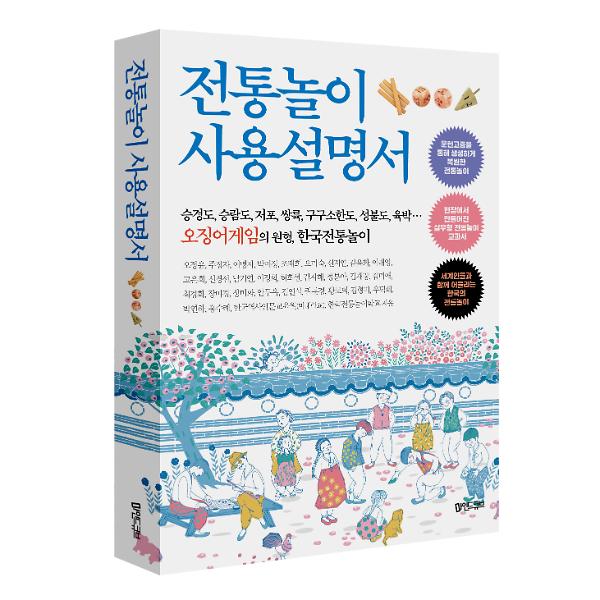▷ 책 속으로
전래놀이는 표준화된 개념정리 이전부터 널리 사용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認知度)가 높은 용어라 하겠다. 전래놀이는 민간에 오랫동안 전승되고 다양한 지역과 계층에서 즐기는 놀이지만, 역사적 계승성과 문헌적 고증이 어렵고, 자생적인지 외래적인지 불명확하다는 특성이 있다. 민속놀이는 국가, 사회, 지역단위의 축제나 여러 행사의 성격이 짙 고, 계절적 변화와 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놀이이다. 또한 시간적으로 세시풍속과 어우러져 전승되는 놀이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개인적 차원보다는 집단적 차원의 놀이이다.
- 〈전통놀이의 개념, 역사적 계승성과 문헌적 근거〉 중에서
전통놀이는 사회적 관습이나 시대적 배경, 조상으로부터 전해지는 성격이 강하고, 역사적 계승성이나 문헌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놀이를 말한다. 전통에 기원한 윷놀이, 고누 등도 있지만, 외래적인 놀이로서 오랜 기간 우리 역사, 문화, 삶에서 융화되어 전통놀이로 굳어진 바둑, 투호, 장기 등도 있다. 전통놀이는 바둑, 장기, 저포, 쌍륙, 승경도 등 지혜를 겨루는 판놀이가 많다는 게 특징이다.
- 〈전통놀이는 어떤 세계인가, 전통놀이, 전래놀이, 민속놀이의 개념〉 중에서
.고조선시대의 전통놀이는 육박 (六博)과 윷놀이가 있다. 육박과 윷놀이는 문헌자료와 유물자료가 현재도 전해지고 있다. 이중에서 육박은 고조선, 윷놀이는 부여의 대표적 전통놀이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육박은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역학(易學)과 상수철학(象數哲學)이 놀이판에 구현되어 있다. 제정일치의 시대인 고조선에서 놀이판에 천문과 역학이 담겨있다는 것은 육박이 종교적 의례와 관련된 놀이이다.
- 〈한국사 시대별로 만나는 전통놀이, 고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역사속 전통놀이〉 중에서
판놀이는 주로 실내의 탁자나 방바닥에서 하는 전통놀이이다. 또는 실내를 벗어나 한여름 무더위에는 서당이나 향교, 사랑방의 너른 마룻바닥이나 동네 어귀의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놀기도 한다.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놀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판놀이는 지혜를 겨루는 놀이이고, 글을 배운 사대부들이나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즐기다보니 문헌의 기록이 대부분 뚜렷하게 전해진다.
- 〈판놀이, 신나는 놀이판을 펼쳐라! 전통보드게임의 세계로 여행을 가다!〉 중에서
태양력에 의해 형성된 세시풍속으로는 양수(陽數)가 겹치는 원단(1월 1일), 삼짇날(3월 3일), 단오(5월 5일), 칠석(7월 7일), 중양절(9월 9 일)이 있다. 이중에서 동지(冬至)는 원단(元旦)과 같은 기원을 갖는 세시풍속으로 본다. 원단(元旦)은 태양이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때(동지:冬至)로 이때부터 태양은 서서히 상승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때는 만물의 시작이란 의미에서 세시풍속의 으뜸을 차지한다. 주요한 풍속은 세장(歲粧;설빔), 세찬(歲饌), 세주(歲酒), 세배(歲拜), 병탕(餠湯;떡국), 증병(甑餠;시루떡), 세화(歲畵;年畵,년화), 세전(歲錢), 화반(花盤;굿놀이). 덕담(德談), 청참(;聽讖,점), 제야(除夜) 등이 있다.
- 〈세시풍속, 그 속에 숨 쉬는 전통놀이 스토리텔링〉 중에서
고구려 고분벽화 가운데 무용총의 수렵도(사냥그림)와 각저총의 씨름그림은 대표적인 전통놀이의 기록화이다. 장천고분군 백희도(百戱圖)는 수많은 놀이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문화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일본 아스카의 고송총(다카 마쓰무덤)에서는 현대의 골프와 비슷한 격방(擊棒)이그려져 있다. 전통놀이는 조선시대 풍속화에 풍부하게 전해진다.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인 김홍도(1745-1806)의 그림 가운데는 단오절로 추정하는 계절에 씨름하는 풍경을 그린 씨름도와 땔감나무를 작업하다 잠시 쉬면서 콩윷(밤윷)을 노는 윷놀이그림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신윤복(1758-?)도 인왕산 자락에서 쌍륙하는 모습을 그린 〈쌍륙삼매도〉와 나무 밑에서 투호를 즐기는 〈임하투호도〉를 남겼다.
- 〈전통놀이와 교육콘텐츠, 놀이와 배움이 만나다〉 중에서
종목별로 본다면 바둑과 장기, 투호, 그네뛰기가 가장 많이 등장하지만, 심심찮게 판놀이의 종류인 투전, 골패, 승경도가 나오고, 짝 맞추기 놀이인 칠교도도 출연하였다. 지금까지 사극과 영화 등에 등장한 전통놀이를 꼽는다면 씨름, 오목, 장기. 바둑, 투호, 쌍륙, 칠교도, 투전, 골패, 저포, 윷놀이, 승경도, 마상격구, 축국, 격방, 장치기, 제기차기 등이다. 이때 전통놀이는 단순한 소품을 벗어나 독자적인 이야기와 행 동을 이끌어내는 장치가 된다.
- 〈전통놀이와 문화콘텐츠, 놀이에 문화가 깃들다〉 중에서
이제 전통놀이의 다양성에 눈을 뜨고, 전통놀이의 복원과 재연, 전승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 첫걸음이 지역축제이다. 역사시대별 전통놀이를 발굴하여 축제와 연동시키는 것이다. 서울 관악구의 낙성대에서 펼쳐지는 강감찬축제의 경우에는 격방, 성불도, 참고누, 저포와 같은 고려시대 전통놀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서울 송파구의 한성백제문화제, 공주와 부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백제문화제에서는 저포, 육박, 쌍륙, 투호, 윷놀이 등 백제 전통놀이를 재연하면 좋을 것이다. 주제별로 특화된 전통놀이는 사찰과 궁궐, 종택 등이 좋다.
- 〈전통놀이와 문화콘텐츠, 놀이에 문화가 깃들다〉 중에서
전통놀이는 초・중・고 학교의 교육주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늘봄학교, 전통시장 행사, 지자체 축제, 마을단위의 공원시설, 아파트 농산물장터 등에서 놀이판을 펼쳐 흥겹고 즐겁게 놀 수 있으며, 놀이를 지 도하고 함께 어울리며 배우고 나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 기술이 된다. 그래서 전통놀이는 현재의 놀이시장에서 블루오션(Blue Ocean)이라고 하는 것이다.
- 〈전통놀이의 현대적 가치, 전통놀이는 오래된 미래이다!〉 중에서
윷놀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놀이, 민속놀이이다. 이를 풀이하면 윷놀이는 역사적 계승성과 문헌적 근거가 확실한 전통놀이이며, 시공간과 결합하여 보름이나 추석 등과 같은 세시명절에 가족단위, 동네단위로 행해지는 민속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전통 윷놀이, 모든 판놀이의 기본이 되는 놀이〉 중에서
저포는 오랫동안 동아시아의 여러 판놀이 가운데 한국의 윷놀이와 함께 유행하였다. 윷놀이와 노는 방법이 유사하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는 윷놀이를 표기하는 한자어가 없어서 저포(樗蒲)를 빌어다가 윷놀이라 하였다. 따라서 문헌에 등장하는 저포(樗蒲)는 내용에 따라 저포희인지 윷놀이인지 구분이 가능한데, 간혹 그냥 저포희를 두었다고 하면 저포놀이인지, 윷놀이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 〈저포(樗蒲)놀이, 백제인들이 즐겨 놀았던 판놀이〉 중에서
고누놀이는 백성들이 땅에 놀이판을 그리고 노는 놀이로 천하게 여겨 기록이 부족하다. 학동들은 학습 도중에 성인들은 노동 현장, 전쟁 시 등에서 여가가 생기면 하던 놀이로 한국형 놀이의 원형문화라 할 수 있다. 고누는 특별한 말판이나 말이 필요 없다. 말판은 종이나 땅바닥에 그리고 말은 바둑돌이나 동전, 작은 돌멩이를 사용할 수도 있다.
- 〈참고누, 모든 놀이의 원형인 가장 한국적인 놀이〉 중에서
쌍륙은 저포와 함께 판놀이의 쌍벽을 이룬다. 묘하게도 바둑과 장기가 짝을 이루며 유행하였고 골패와 투전이 도박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쌍륙도 저포와 더불어 역사에 많은 이야기를 남겼다. 특히 쌍륙은 두개의 주사위가 만드는 윷사위의 다변성으로 많은 이들에게 더욱 인기를 끌었다.
- 〈쌍륙놀이, 주사위 두 개가 만드는 변화〉 중에서
조선승람도는 승람도놀이의 표본이다. 놀이방법이 설명되어 있고, 조선팔도가 지역별로 잘 분포되어 있다. 놀이방법은 4칸에 걸쳐 설명되어 있다. 또한 칸의 아래에는 작은 칸수 6개가 숫자별로 표시되고, 던져 나온 윷사위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한다. 조선승람도는 신분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칸이 있고 들어갈 수가 없는 칸이 있다. 신분별 특성과 놀이판에 장치를 두어 놀이의 즐거움과 승패의 변수를 높였다. 또한 특정한 칸에는 전진과 후퇴, 바람, 벌 등의 상벌을 두어 재미를 더하였다.
- 〈승람도(勝覽圖), 조선 8도의 명승고적을 거닐다!〉 중에서
-
전통문화원리의 핵심인 주역의 괘상(卦象) 등을 익히는 팔괘패(八卦 牌)놀이는 주령형(酒令型) 놀이의 일종이다. 또한 탁자나 마당, 마룻바닥 등에 놀이판이나 놀이말을 놓고 놀이하는 판놀이에 속한다. 놀이윷 과 놀이판이 없이 오로지 놀이말로 짝을 맞추어 승부를 짓기 때문에 칠교도형 판놀이로도 분류된다.
- 〈팔괘패(八卦牌)놀이, 태극기의 원리를 배운다!〉 중에서
칠교도(七巧圖)는 일곱 개의 조각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도형을 맞추는 조합형 판놀이다. 조합의 과정을 통해 공간에 대한 이해, 사물의 형태와 구조, 도형의 조합에 대한 판단 등을 기르는 지혜형 놀이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전통 판놀이이기도 하다. 칠교도는 처음부터 오늘날의 모습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도를 만들거나 건축설계, 탁자설계, 창문의 설계 등 기술적 전승과정에서 판놀이 형태의 놀이로 발전한 것으로 본다.
- 〈칠교도(七巧圖), 지혜를 키우는 놀이!〉 중에서
성불도(成佛圖)는 불교사상과 불교이론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만든 도표이다. 수십여 칸에서 백여 칸에 이르는 항목마다 불교역사와 불교문화, 불교장소, 불교종파, 불교인물들을 채워 넣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불교와 그 창시자인 석가모니의 삶 등을 빠르게 알아볼 수 있고, 불교교리의 요체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이 도표를 놀이형태로 만든 게 성불도(成佛圖)라는 판놀이(국희:局 戲)이다.
- 〈성불도(成佛圖)놀이, 붓다의 깨달음을 배운다!〉 중에서
-
판놀이는 한자어로 국희(局戲)라고 하며, 일반적으로는 보드게임(Board Game)이라고 한다. 체스, 바둑, 장기, 마작과 같이 역사적으로 전승되어 현재에도 놀이로 살아있는 판놀이는 전통보드게임이라고 부른다. 판놀이는 지혜를 겨루는 놀이이다. 역사적 계승성과 문헌적 근거가 있는 대표적인 전통놀이이다. 대표적인 판놀이로 바둑, 장기, 마작, 골패, 투전, 윷놀이, 쌍륙, 육박, 참고누, 승람도, 승경도를 들 수 있다. 이중에서 윷놀이, 육박, 저포, 쌍륙, 참고누, 승람도, 승경도는 독립된 항목으로 소개하고 있다.
- 〈여러 판놀이를 만나다, 놀이세계의 다양성을 찾아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