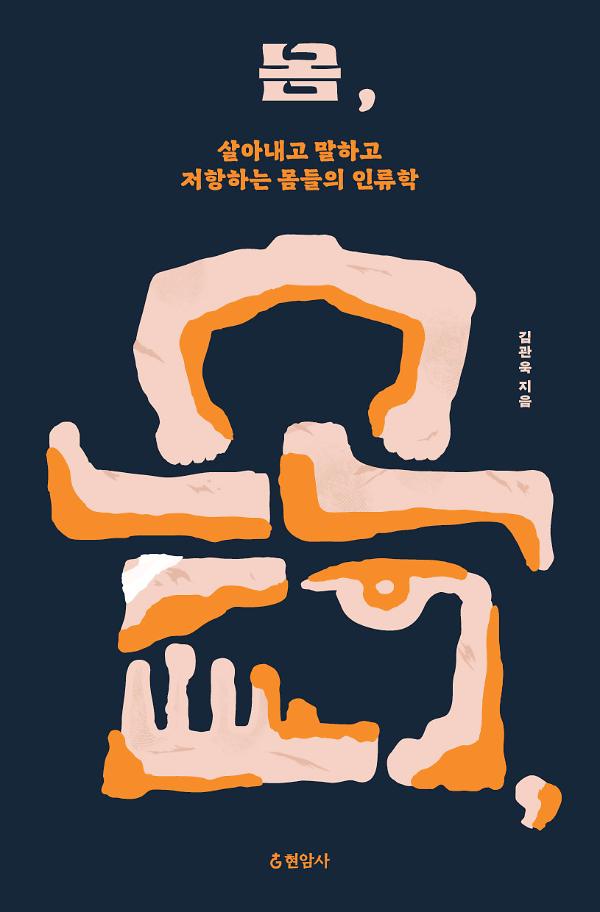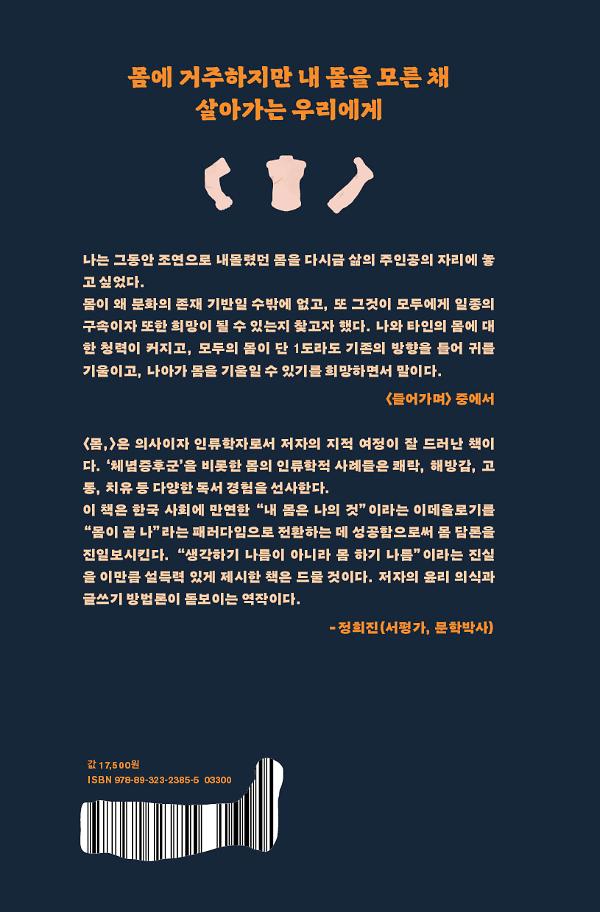이것은 수족처럼 부리던 몸뚱이가 아니라
삶의 근본인 몸에 대한 이야기다
“이 책은 '내 몸은 나의 것'에서 '몸이 곧 나'로 생각을 바꾸어준다.
저자의 윤리의식과 글쓰기 방법론이 돋보이는 역작이다.”
★★정희진 추천★★
중독된 몸, 상처 입은 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한 몸들의 인류학
문화와 사회가 만든 이상한 몸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다
우리는 흔히 몸이 정신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생각한다. 몸은 뇌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이며, 강한 정신력이 몸을 지배한다는 생각으로 몸을 방치하거나 혹사하는 경우마저 있다. 그렇게 의지력과 뇌에 대한 책이 쏟아지는 요즘, 이 책은 반대로 우리의 몸에 새겨진 역사와 신체 그 자체에 주목한다. 이 책은 '삶의 수족처럼 부리던 몸뚱이가 아니라 삶의 근본인 몸에 대한 이야기'다.
카페인과 니코틴에 중독된 몸, 상처 입고 다친 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몸까지… 의사이자 의료인류학자인 김관욱 교수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상한 몸들의 인류학을 다루며, 사회의 아픔이 어떻게 우리 몸에 반영되어 구부러지고 아픈 몸이 되는지를 이야기한다.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몸의 슬픔, 사회와 문화가 만든 몸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몸이 곧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몸,〉은 김관욱 교수가 13년의 현장 경험과 강의를 통해 다듬은 몸에 대한 인류학적 소결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아픈 사람과 그 아픔을 초래하는 모든 것을 탐구하는 의료인류학자로서 우리 사회의 출발이자 바탕인 ‘몸’ 그 자체를 돌아보고자 했다. 그를 위해 몸에 거주하지만 그 몸이 뒤틀리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몸의 목소리들을 담았다. 의학과 문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간의 몸’을 말하는 인류학자의 연구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몸에 무지한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과 착취의 역사가 인간의 몸에 얼마나 깊고 선명하게 새겨지는지 알게 된다.
사회의 아픔은 어떻게 우리 몸에 새겨지는가
김관욱 교수는 전작 『사람입니다, 고객님』에서 콜센터 근무자들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연구하며 사회 문제가 그들의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파헤쳤다면, 이번 책에서는 범위를 넓혀 현대 사회에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과 우리가 겪는 몸의 통증, 아픔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다룬다. 그 몸들은 전쟁 이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걸리는 체념증후군, 커피와 설탕에 쉽게 중독되는 사람들, 폭력과 착취가 몸에 새겨지는 여러 사례들까지 시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다.
전체적으로 총 4부로 이루어진 책의 1부에서는 몸을 ‘모르는’ 사회를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몸을 생리적·생물학적으로 보편적인 존재라고 이해하지만, 그것은 몸을 너무나 모르는 이야기라고 저자는 말한다. 몸은 문화에 따라 언제든 다르게 인식될 수 있고 그 맹점에 대해 의사였던 본인의 경험담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짚어준다. 2부에서는 카페인, 설탕, 니코틴 등 여러 화학물질로 몸을 ‘증강시킨’ 현대 사회에 대해 이야기한다. 슈퍼인간이 되기를 희망하는 인류의 욕망은 온갖 약물과 물질의 발명으로 본래 몸이 지닌 한계를 변화시켜 왔다. 그 과정에서 피로와 배고픔, 그리고 고통을 잊어야만 하는 존재로 변형되어 온 현실을 보여줄 것이다. 3부에서는 반대로 몸이 ‘변혁시킨’ 사회를 다룬다. 인류의 역사가 무지와 욕망 속에 몸에 폭력을 가하는 동안 몸은 그 스스로 생존의 길을 선택한다. 폭력에 짓밟히면서도 몸은 우리의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한다. 끝으로 4부는 몸에 ‘거주하는’ 사회로, 그동안 인류학자로서 목격하며 배운 몸의 근간에 대해 말한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보여지고, 관계 맺고, 살아내고 있는 몸은 항상 자세이자, 공간이며, 시간이다. 결국 우리 몸은 저마다 곧 한편의 드라마이며, 드라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살아내고, 말하고, 저항하는’ 몸들의 인류학
저자인 김관욱 교수는 병원 밖으로 나와 인류학자로서 현장 연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아픈 몸을 만났다. 그 과정에서 “내 몸은 나의 것인가? 나는 내 몸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부딪혔다고 말한다. 이 책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꼭 인류학자가 아니라도 우리는 주변에서 다양한 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아파도 애써 담담한 척하는 몸, 숨이 차올라도 별일 아닌 듯 다음 배송지로 이동하는 몸, 온갖 가시 돋친 답변들에도 웃으면서 전화를 끊지 않는 몸. 그 몸들은 미세한 눈가의 떨림으로, 숨도 쉬기 버거운 몸놀림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이 책은 수없이 많은 몸들이 ‘살아내고, 말하고, 저항하는’ 울림들을 기록한 것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조금만 몸을 기울여 다가가면 일상은 온통 아픈 몸들의 소리 없는 반향으로 가득 차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우리는 어쩌면 타인의 몸에 대해서도, 자신의 몸도 너무나 모르고 있지 않을까. 이 책을 통해 한 명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몸들에게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저자는 말한다.